 이창희
이창희
[한국심리학신문=이창희 ]
 photo 뉴시스
photo 뉴시스
어릴 적 가장 많은 추억이 있었고 재미있었던 기념일은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봐서 다소 어색하지만 친해지면 땀이 온몸에 젖을 때까지 노는 친척들과 항상 손주를 반겨주시는 조부모님의 품은 아무 생각 없이 좋았던 추억 중 하나이다.
한없이 재미있고 철없이 놀아도 한순간에는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변한다. 바로 절하는 시간이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라고 한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며 드리는 절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의 문화에서 나온 유래 깊은 인사이자 덕담이다. 이를 들은 어른들은 사랑과 감사의 의미로 세뱃돈을 건넨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서로의 덕담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목가적인 관습이지만 이 아름다운 행위가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변해간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자란 아이들은 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절을 드릴 때 전통적인 가치나 우리 고유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돈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결국 세배에 대한 전통적, 가족적인 가치가 "세배 한 번에 만 원"이라는 자본주의적 교환가치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돈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 행동의 진짜 이유가 바뀐다는 것이다. 나는 돈 이외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그림이라고 표현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마이클 샌델이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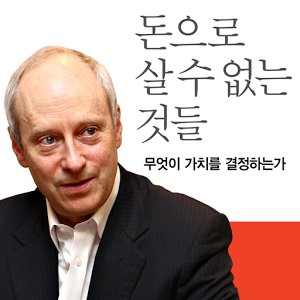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은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과연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옳을까?"
샌델은 현대 사회에서 시장 논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에는 교육, 건강, 환경, 시민적 의무 등 전통적으로 '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영역들이 점차 '가격'을 매기고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 문제로 보지 않고, 시장 논리의 확장이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델의 경고가 단순한 철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통한 그림
 Shutterstock / Nikita Starichenko
Shutterstock / Nikita Starichenko
샌델의 책에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경계를 흐리는 충격적인 사례가 등장한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버라 해리스가 시작한 불임시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해리스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여성이 불임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을 하면 현금 3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목적은 약물 중독자들이 임신하여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해리스는 이것이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중독자들에게 300달러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중독 치료나 사회적 지원 같은 다른 대안은 없고, 오직 '돈을 받고 임신 능력을 포기하는' 선택지만 있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좋은 의도로 설계된 금전적 인센티브라 할지라도, 도덕적 영역에 시장 논리가 침투하면 예상치 못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수단은 강력하지만, 그 강력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 샌델이 경고한 대로, 어떤 것들은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리적학이 그린 그림: 과잉 정당화 효과

1973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마크 레퍼와 동료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유치원생 51명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기' 실험이었다.
연구진은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미리 그림을 그리면 예쁜 상장을 준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깜짝 상장을 선물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상장을 주지 않았다.
일주일 후,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미리 상장을 약속 받은 첫 번째 그룹만 그림 그리기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나머지 두 그룹은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연구진이 발견한 핵심은 첫 번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에서 보상 받기 위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즉 외부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해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명명하며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이유를 찾는데 원래 즐거워서 하던 일에 외부 보상이 주어지면, 뇌는 보상 때문이라고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즐거움은 이미 보상이라는 외적 이유로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해당 심리학 연구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은 때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오히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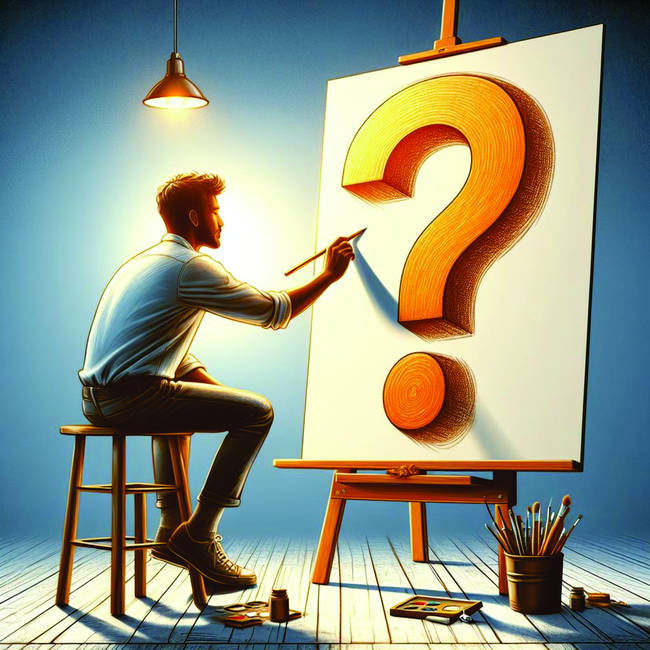
결국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심리학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돈은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분명하다. 아이들이 세배를 드릴 때 돈을 계산하지 않고 예의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불임 시술 같은 중대한 결정이 300달러가 아닌 진정한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세상이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
참고문헌
1) IKS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 연구소. (2024). 보상이 성과를 떨어트린다.
2) 마이클 샌델.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3) Mark R. Lepper, David Greene, Richard E. Nisbett. (1973).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 A Test of the 'Overjustification' Hypothesis. Stanford University.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052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0528

dlckfgml19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