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어떤 이들은 아픔의 흔적들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려고 한다.
그때 이야기는 하지 마, 옛날 일 꺼내어서 뭐하니, 행여나 같은 일이 반복될까 겁에 질려 말꼬리의 흔적까지 싹싹 지워버린다.
그 얼마나 약하디 약한 존재인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제대로 딛고 일어서긴 한 걸까.
그 안에서 충분히 아프고 벗어났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영웅담처럼 내뱉을 필요는 없다. 아팠던 순간들을 말이라는 구름으로 만들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 만큼, 제삼자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덮고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비슷한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예감하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그때만큼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아팠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고 오로지 우리 가족만 남았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정신력도 돈도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의미했고, 끝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다 지치고 지쳐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었다. 사람은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 방어가 두터워진다. 굳게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다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죽어버리라고 했다. 이 짐만 없어도 나는 훨훨 날 수 있을 텐데.
수년을 기다리고 짊어지고 가다 절벽에서 밀어버리듯 내팽개쳐버렸더니 스스로 일어서더라. 죽을 용기도 용감해야 생긴다. 그렇게 일어서 준 것에 나는 보답이라도 해야겠어서 씩씩한 척 밝은 척 지금까지 뛰어왔다.
애초에 내 안에 늘 살고 있던 어둠의 흔적들을 꾸깃꾸깃 파묻어놓고 꺼내지 않았다. 파묻어두면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 병이 될 줄 알면서 꺼내지 않았다. 그래야 다 잘 돌아갈 것 같았다. 내 힘으로 끌고 왔으니 계속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칭찬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내 덕에 삶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멀쩡히 잘 살던 친구가 무너져 내렸다. 타인에 대한 공감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다. 상대를 통해 내 감정을 확인하는 것뿐. 그 아이에게 내가 투영되어 보였다.
나도 저랬을까. 나도 무너져 내렸을까. 그때 문드러진 내 마음은 누구도 돌볼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일상이 남들의 일상처럼 비슷해져 가는 지금에서야 내 마음을 확인한다. 나는 나이를 먹었고 주름살이 늘었다.
다리는 무겁고 예쁜 옷도 화장도 예전 같지 않다. 겉모습이야 어떠랴, 돌보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거늘.
꿈을 꾸었다. 딱 한 번만 안아주면 되는데, 손 한 번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 누구도 손을, 가슴을 내어주지 않았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늘 씩씩한 어른이니까.
오늘은 울어도 되는 날로 정해야겠다. 마음의 말을 내뱉어도 되는 날로 정해야겠다. 나는 내가 돌보아야 한다. 언젠가 크게 무너지기 전에 시커멓게 된 이 감정들을 꺼내놓아야 한다.
내가 언젠가 타인의 감정들을 받아내며 살았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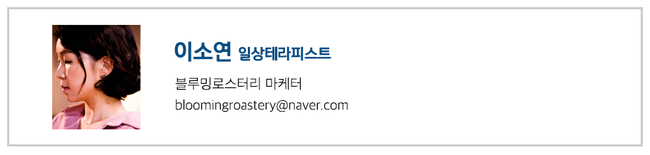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26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