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퉁퉁부은 얼굴이 거울 속에 한가득이다.
사람 하나를 품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이질감을 안고 있어야 하는 일인 줄 몰랐다. 첫째 때도 이랬던가, 나와 똑 닮은 여덟 살 아이를 한없이 쓰다듬으며 기억을 더듬어본다.
세상을 비집고 나오는 아기는 엄마 자궁을 비집고 자기 자리를 늘려본다. 손가락 만한 주먹으로 퉁퉁 치고 발로 꾹꾹 눌러보고, 시간을 찢고 공간을 베어내며 온 몸을 들이밀어본다. 엄마 뼈와 살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이기지 못해 통증에 허덕이고 집이 비좁은 아기는 갑갑함에 잠을 이루지 못해 팔다리를 휘저어본다.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일이야, 사람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지치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특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성애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모성애도 사회적 학습이며 이데올로기라 정의한다. 낳고도 쉽게 버리고 애틋하게 키우지 않던 옛 시절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 생명을 사랑해주어야 해 사랑해주어야 해 되뇐다. 비싸디 비싼 초음파로 손가락 발가락 있는지 들여다보고 또 보고 거기 진짜 있나 확인시켜준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아프고 지치는 임신기간에 모성애의 책임감을 지워주어야 하니까.
태생 전에 시작되어 희생을 강요당한 모성애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 갚길 바라는 마음으로 삐뚤게 자란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무조건 공부를 해서 의사 검사가 되어야 행복하게 잘 산단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그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이를 부모가 희생한 만큼의 가두리 속에 가두어 키운다. 자식에게 바랬던 마음이 기대에 못 미치면 대를 이어 손자 손녀에게까지 뻗친다. 누구의 행복을 위한 욕심일까. 어디서부터 잘 못 끼워진 단추일까.
나의 진짜 모성애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픈 아기를 끌어안고 함께 아프고, 그럼에도 버텨내는 작은 호흡을 기특하게 어루만지면서. 아직 초점도 안 맞는 아가가 사라졌던 엄마를 보고 울컥 화를 내며 울더니 엄마 품에서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잠드는 것을 신기하게 토닥이면서.
사실 첫째가 태어나 (언어가 완성되기 전인) 네 살 이전까지는 뱃속에서의 기억을 얘기하곤 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다고. 빨리 세상으로 나오고 싶었다고. 이론적으로 4세 이전까지의 기억들은 언어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에 자리 잡는다고 했는데, 막상 그 기억이 뱃속의 기억 까지라니 흠칫 놀랐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뱃속에 있을 때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했었다. (대체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막상 둘째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8개월을 버티다 보니 모성애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나친 엄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통로를 열기 위해 아기도 애를 쓰고 있지만 엄마 또한 고통스럽도록 열 달 동안 자신의 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는 시간은 가냘픈 아기와 엄마의 관계보다는 대등한 영혼 대 영혼으로서의 접점의 시기가 아닐까.
첫째에게 다 쏟아붓는 너무도 큰 사랑을 어찌 나누어주어야 하나 싶고, 아직 낳지도 않은 둘째에 대한 모성애를 강요받을 때마다 또 어찌해야 하나 싶다. 이런 건 책에서도 연구실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삶이란 참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어서, 낳고도 키우면서도 수천만 번 미안하다고 밤을 지새워 속삭였었다. 그래도 같이 겪고 같이 아파줘서 고맙다고, 매일 그만두고 싶은 삶을 토닥여주는 네가 천사라고. 나는 또 한 명의 천사를 얻게 될까, 마음이 만 갈래로 갈기갈기 나눠지는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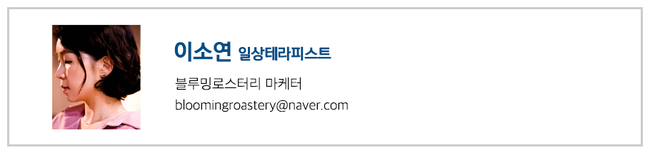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40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