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우익
강우익
 사진출처: pexels.com
사진출처: pexels.com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우익 ]
"우리는 외향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2012년 TED 콘퍼런스에서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책 「Quiet」의 저자, 수잔 케인이 한 말이다. ‘자기표현’과 ‘활발함’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내향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향성을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여기곤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외향성에 대한 갈망이 짙게 나타난다. 수많은 내향인들이 한번쯤 해봤을 질문을 다시 꺼내본다. 과연 내향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인가.
내향성을 바꿀 수 있나
내향성과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뜻하는 성격 특성으로,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 내향성(introversion), 타인과 외부세계로 향하면 외향성(extraversion) 성격이라 칭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내향형의 사람은 외향형의 사람에 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은 자극과 변화에 예민하며, 고요하고, 내면세계에 관심이 깊다.
내향성과 외향성, 이 두가지 특성은 융(Jung)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선천적인 기질적 성향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외향성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편도체 등)이 밝혀졌으며 현대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뇌 구조가 환경보다는 유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 칼 슈와츠는 2세 때 내향적 특성을 지닌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내향적인 행동특성과 신경반응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신경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까. 슈와츠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금속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순 있지만 유화를 그릴 수는 없다. 자신이 지닌 가능성과 고유한 특성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니지 않은 요소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
즉,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외향적 행동을 차용할 수는 있다. 내향성이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수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J.M Zelensk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행동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외향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예측과 자의식 과잉으로 외향적 행동이 강화되기 어려우며, 강화된다고 해도 큰 에너지 소모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회복 틈새(restorative niche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복 틈새는 지친 마음과 몸을 쉬게 하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성격의 과도한 변형 이후 짧게나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떤 유명 토크쇼의 사회자는 쇼가 끝나면 늘 화장실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이렇듯, 외향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향인들은 회복 틈새를 통해 소진감을 예방하고 외부세계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정말 내향성은 외향성보다 열등한가
인간관계가 곧 힘인 21세기를 살아가기에 외향성은 확실히 많은 이점이 있다. 실제로 외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외향적 성격과 행복도 간의 일관적이고 높은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조작적 정의를 ‘쾌락’에만 두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말한다. 셀리그만 교수는 행복심리학이라고도 불리우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행복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행복한 삶의 3가지 구성요소로 즐거움(쾌락), 몰입감, 의미감을 제시한다. 이중 ‘즐거움’은 외향성이 발휘하는 강점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몰입이나 의미 부여는 내향성의 대표적 강점이다. 셀리그만 교수는 이 세가지 요소들 모두가 충족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며, 세가지 요소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촉진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한다. 외향성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안녕감 측면이 아닌, 사회적 유능성 측면에서는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며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내향성을 다룬 책 「Quiet」의 저자, 수잔 케인의 생각은 다르다. 책에서 그녀는 엘레노어 루즈벨트, 로자 팍스, 간디 등 수많은 내향형 리더들을 예시로 들며 이들의 강점으로 ‘조용함’과 ‘겸손’, ‘절제’ 등을 뽑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상황을 지배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온화함과 겸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의견에 경청한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들이 내향적 리더로 하여금 외향적 리더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CEO들의 특성조사(2004)’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CEO 중 45%가 외향과 내향의 중심인 ‘양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내향적 성향과 외향적 성향은 각각 35.9%와 19.1%를 차지했다.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내향적 리더의 수가 훨씬 많다.
와튼스쿨의 아담 그랜트는 외향성 정도에 따른 세알즈맨들의 영업성과를 분석했는데, 이들을 3개월동안 관찰한 결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과 내향성이 높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거의 미미했으며 양향적 성향을 지닌 이들의 영업성과가 가장 높았다.
즉, 내향성과 외향성은 우열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충적 관계에 있다. 내향인들에겐 약간의 외향적 양식이 필요하고 외향인들 역시도 약간의 내향적 양식이 필요하다.
TED 강연에서 수잔 케인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점점 개인 간 칸막이가 걷혀지고 있다.”며 “현대 사회는 개방과 집단활동에 과도히 무게를 두고, 내향성과 고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맞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런 이들에게 고독은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능률을 올리는 환경이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쪽 성향의 이점에만 집중하는 사회적 편향과 그러한 편향이 가져오는 잘못된 우열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을 의미한다.
수용, 행복을 위한 첫걸음
부적응을 겪는 내향인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내의 한 연구가 그 답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부적응은 내향성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자기 강점에 대한 과소평가’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내향성에 대한 수용 여부가 적응 척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내향성 수용 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과 삶의 만족감, 자존감이 높고 우울과 사회불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본인의 가치와 외부의 가치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수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내향인들에게도 일부 자기개방은 필요해 보인다. 수잔 케인은 내향인들을 위한 3가지 지침으로 ‘지속적인 집단 작업을 광적으로 선호하지 말 것’, ‘자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것’과 함께 ‘가끔 자신의 내면을 타인과 공유할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관계지향적 행복관을 가진 내향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아무리 내향적일지라도 대인관계를 위한 자기개방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내향인들의 내면 공유는 그들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내향성을 인정하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강점과 가치관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타인들의 가치나 인간관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와 인간관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이다. 몇몇 타인들이 집단생활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일의 능률을 올린다고 해서 모두가 꼭 그러한 특성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는 나만의 길이 있음을 명심하자.
외향성을 지녔든 내향성을 지녔든, 자신의 성격이 불만일 수 있다. 타인의 성격특성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격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유없이 만들어진 성격은 없다. 어떤 성격이든, 형성될 당시 그것들은 모두 적응적이었다.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수용해주자. 행복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이윤경, 이훈진, 「내향성의 적응적 특성 탐색」, 2014, 한국심리학회
•신지은 외 4명,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관계 중심적 행복관의 중요성」, 2017,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박은미, 정태연, 「외향성인 사람과 내향인 사람 간 행복의 차이」, 201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John M Zelenski, “Personality and affective forecasting: trait introverts underpredict the hedonic benefits of acting extraverted”, 2013, J Pers Soc Psychol. 104(6):1092-108.
•Grant AM, “Rethinking the Extraverted Sales Ideal: The Ambivert Advantage.”, 2013, Psychological Science. 2013;24(6):1024-1030.
•수잔 케인, 2012, 「quiet」, 알에이치코리아
•권석만 저, 2018, 「긍정심리학」, 학지사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CEO들의 특성 조사(2004)”, 경제조사팀
•Susan Cain, "The power of introverts", TED Talk
•Martin Seligman, "The new era of positive psychology", TED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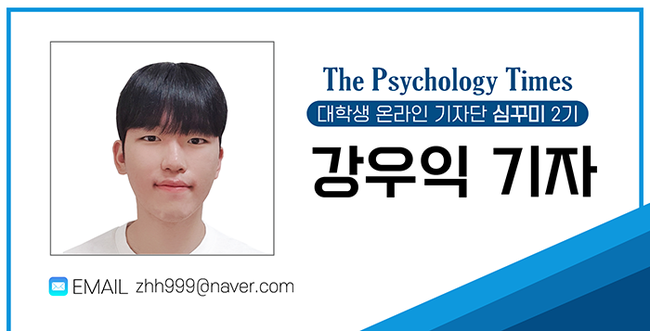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54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