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희
김주희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경찰은 정신질환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법집행기관이다(이영돈, 2019). 최근 정신질환자와 관련되는 경찰의 업무 수요와 그 비중, 그리고 치안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25%가 범죄 피해자였는데, 이들은 일반인보다 강력범죄 피해 확률이 4배, 범죄 피해 확률이 11배에 달했다. 정신질환자는 피해자 입장으로서도 경찰의 주목을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국가인권회가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수준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그 업무 특성상 정실질환자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응급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데(국가인권위원회, 2008), 이와 같은 응급상황의 발생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경찰의 지식과 편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영향
정경채의 「경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경험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2021)」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경험이 많을수록 경찰의 편견은 증가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도 동일한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공격적·부정적 경험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 경찰은 비협조적인 상대에 대한 규제나 통제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 혹은 소진을 경험(김관선, 2016)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경험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경험이 증가한다고 해서 경찰의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편견은 적어지고 태도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편견이 적어진 것은 맞으나 경찰의 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필자는 ‘지식’과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입증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경험이 경찰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지식과 편견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태도에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성이 담보된 경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 재구조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다. 따라서 보완대책과 더불어 올바른 정신질환자 관련 지식 습득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정책적 대안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찰 조직 내부에 관한 한 가지 제언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경험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으로 축적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업무경험보다는 개인적 판단이나 성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이숙희, 2001)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업무는 직관이나 개인적 경험이 아닌 조직 내 공통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관련 업무처리 이후에는 사안별 분석과 데이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찰의 업무처리 경험이 개인적 노하우가 아닌 조직의 공통적 노하우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 외부에 관한 제언에서는 우선 경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자치단체, 소방 등의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추어 공동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뒤 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과 더불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관련기관 간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찰의 업무경험이 올바른 지식의 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는 나이, 성별,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보편성을 담보해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공적인 안전망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경찰의 업무수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영미·탁종연, 2007).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정경채. "경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경험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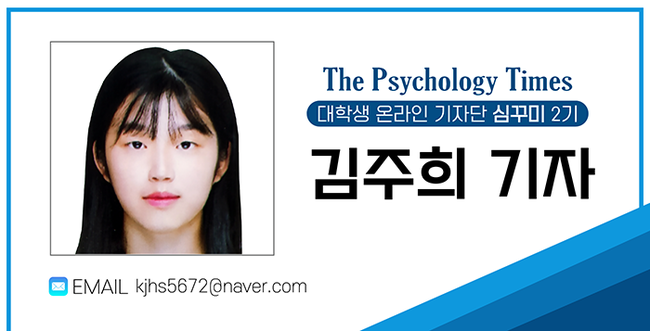
이영돈. (2019). 정신질환 범죄와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3(3), 123-147. Linda Teplin/Gary McClelland/Karen Abram/Dana Weiner, “Crime Victimization in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8), 2005 Aug, pp.911-921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542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