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문학은 충분히 애도할 수 없다. 검은 그림자는 찌꺼기처럼 마음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애도를 속히 완결 지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해석이 불가능해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모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문학의 일이다. 그러므로 영구히 다시 쓰고 읽어야 한다. 날마다 노동자와 일꾼과 농부처럼, 우리에게 다시 밤이 찾아올 때까지.
- 김연수, <시절일기> 중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 김연수, <시절일기> 중 시인 잇사의 문장
얼마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 다음 생이라는 건 없거든. 지금 사는 게 전부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잘 살아야 해..!
나 : 여기가 지옥이에요. 다 겪고 이겨내야 하는 고난들로 가득 찬. 숙제를 받아 들고 온 학교 같은 곳이요.
할머니 : 여기가 왜 지옥이야? 그런 건 이단이야 이단!! 네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아마도 지옥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지옥이란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 소리지르며 영원히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겠거니. 평생 집안에만 계시다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만났으니 다양한 시각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셨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난을 쥐어준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처럼, 반드시 겪고 이겨내고 하나쯤은 배우고 지나가야 하는 고난들. 사람마다 얼마나 깊고 독한 절망을 겪어야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강한 사람일수록 깊은 절망을 겪고, 이겨낸만큼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한다. 삶을 살아가는 많은 순간에 시지프스 신화를 떠올린다. 영원히 언덕 위로 바위를 굴려올리고 바위가 떨어지면 다시 굴려올리는 시지프스처럼, 우리는 평생 먹고 배설하고 잠들었다 일어나고 고난에 처하고 이겨내는 상황을 반복한다.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삶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조리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설명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삶의 통찰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안에서 불평없이 꿋꿋하게 바위를 밀어올리며 시지프스는 신들에게 대항한다. 세상 가장 무기력해지는 벌을 내린 신에게 보란듯이 삶의 역경을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쉼없이 움직인다. 언젠가 신의 마음이 바뀌고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으며.
역경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종교, 심리학, 글쓰기는 같은 역할을 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상황과 나 자신을 직시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한걸음 떨어져 이해하고 받아들여 결국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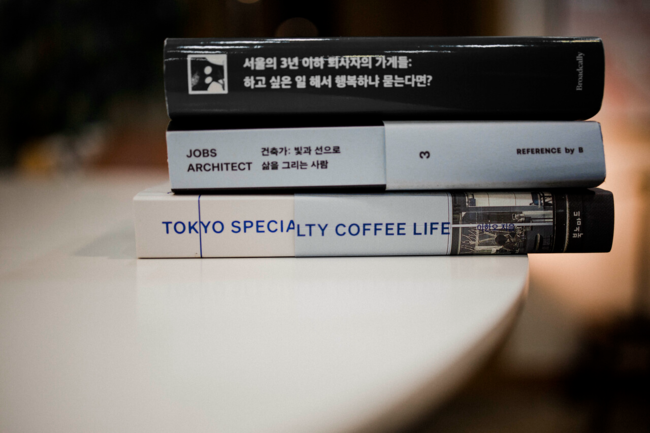
김연수 작가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글의 역할을 부여한다. 부조리한 삶의 고통을 쥐고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은 많다. 그 중 김연수 작가는 그의 책에서 시인 잇사를 소개한다.계모에게 학대받다 15살에 고용살이를 떠나며 고아로 자랐고, 쉰두살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이 넷을 잃고 끝내 아내까지 잃은 시인 잇사. 그 지옥같은 삶에서 오히려 천진스런 시를 써내려갔다. 그 지옥같은 평생을, 그는 문학의 힘으로, 문장의 힘으로 버텨낸다.
"세상의 불행에 역접하는 힘"
시인 잇사에 대한 김연수 작가의 표현이다.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표출하고, 이해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 세상의 불행을 나의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작가 은유는 글쓰기 강의를 하는 작가다. 그의 책 ‘글쓰기의 최전선’에서는 쓰는 것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기 이해를 전문가에게 의탁하기보다 스스로 성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중 가장 손쉬운 하나가 내 생각에는 글쓰기다. ...... 자기 안에 솟구치는 그것에 대해 알아채는 감각, 자기 욕망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감성적 역량, 세상을 읽어나가는 지식과 시선 등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뭐라도 있는 양 살지만 삶의 실체는 보잘것없고 시시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상세히 쓰다보면 솔직할 수 있다. 상처는 덮어두기가 아니라 드러내기를 통해 회복된다.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아픔을 가져온 삶의 사건을 자기 위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말하기의 계기가 필요하다. 글쓰기는 상처를 드러내는 가장 저렴하고 접근하기 좋은 방편이다.
은유, <글쓰기의 최전선> 중에서
결국 모든 행위는 우리가 겪어온 일들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 방식이 나에게는 글쓰기로 다가왔다. 사실 글쓰기만이 나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운동도, 꼼지락대는 작품 만들기도, 사업도 육아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장 나를 내려놓고 들여다보기 가장 좋은 방식은 역시 글쓰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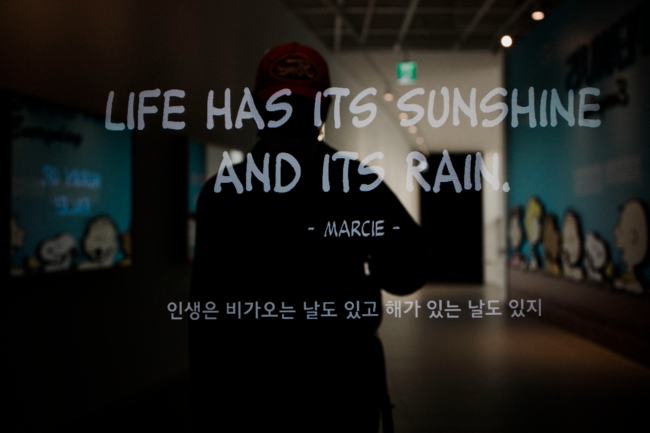
그래서 나는 쓴다. 쓰는 일만이 나를 구원한다. 내일을 버티기 위해 어제의 글을 쓴다. 삶에서 슬쩍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웅다웅 사는 삶에 지쳐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공부를 했으면 실전에서 써먹어야 하듯, 인생의 숙제인 고난을 겪었다면 내 방식대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번 고생할 때 덜 힘겨울테니까. 더 큰 고생거리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의 유려한 문장을 대하면 질투가 나고 나 자신이 초라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하기사 하루에 열댓시간씩 글만 쓰는 작가들을 어찌 이기겠는가. 글을 위한 글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글의 목적을 세우고자 마음을 가다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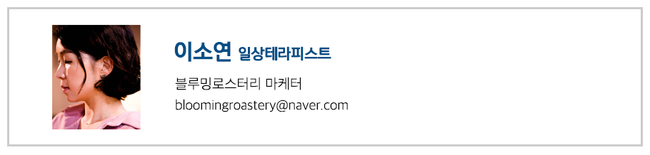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64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