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서
서민서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서민서 ]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 처음에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앞서갔다. 그러나 토끼는 방심하여 게으름을 피웠고, 거북이에게 역전을 당해서 지게 된다.’
이솝우화에 실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성격 요소 중 성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이 교훈은 사실인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는다. 과연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모든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력한 사람이 전부 성공하지는 않으며, 맹목적인 노력이 항상 옳은 일도 아니다. 거북이가 가진 미덕은 반쪽에 불과하며, 나머지 반쪽의 미덕은 경주에서 진 토끼가 가지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상징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서 먼저 앞서나간 동물은 토끼였다. 토끼가 처음에 앞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발이 빨랐기 때문이다. ‘발이 빠르다’라는 토끼의 특징은 상징적으로 ‘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해내는 효율성’과 ‘의도를 가지고 더 짧은 길을 찾아가는 영리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끼는 효율, 영리함, 현실주의와 같은 가치를 상징한다. 토끼는 눈치 빠른 협상가이자 의사소통의 달인이다.
그러나 경주의 승자는 거북이였다. 거북이는 ‘자신의 길에서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과 ‘회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힘을 쏟아붓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주에 집중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 거북이는 책임, 헌신, 이상주의와 같은 가치를 상징한다. 거북이는 신뢰를 주는 연인이자 가능성을 지닌 영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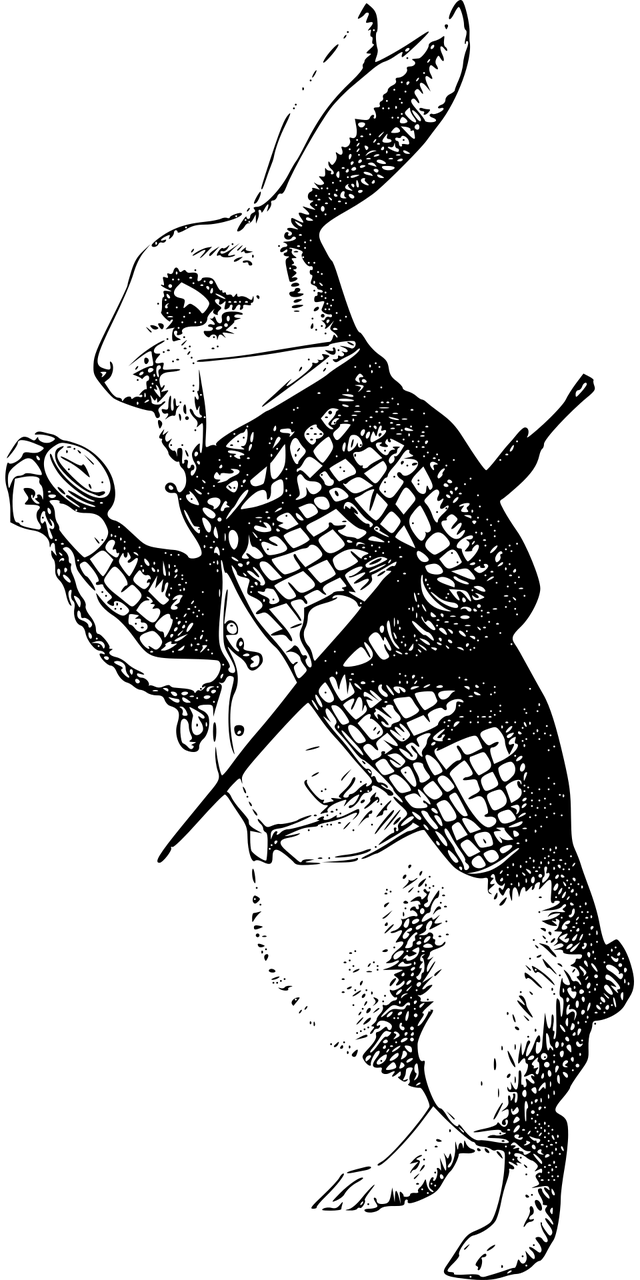 시계를 보는 토끼
시계를 보는 토끼
‘토끼’와 ‘거북이’를 다룬 두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의 상징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두 상징은 심리학자 칼 융이 언급한 개념인 ‘원형(Archetype)’과 연결된다. ‘원형’이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과 이미지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예가 한국의 고전소설 <토생전>이다. <토끼와 거북이>와 <토생전>은 다른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공통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상징이 등장한다. (<토생전>에는 거북이 대신 자라가 등장하지만 상징하는 바는 같다)
다만 <토끼와 거북이>와 <토생전>은 같은 상징이 등장하지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흥미롭다. <토끼와 거북이>는 거북이의 성실함을 강조한 이야기라면, <토생전>은 토끼의 영리함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토생전>에서 자라는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는 용왕의 비도덕적 명령을 비판 없이 수행하고,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토생전>의 교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이고 부패한 체제에서 거북이처럼 무조건 헌신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독이 되며, 토끼처럼 영리하게 행동하여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득이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토생전>은 토끼가 가진 ‘나머지 반쪽의 미덕’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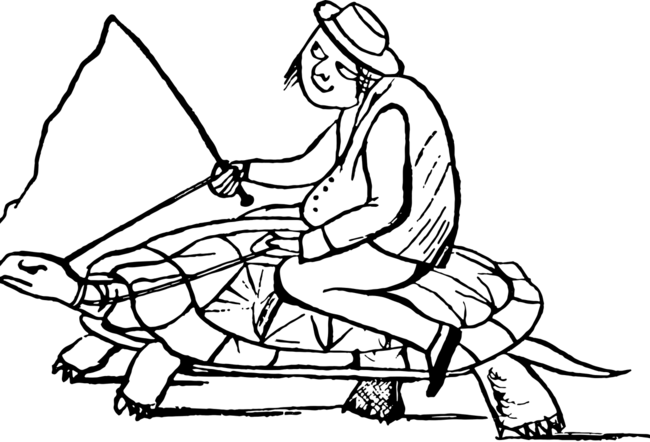 맹목적인 노력의 위험성
맹목적인 노력의 위험성
‘토끼’와 '거북이'의 심리학
결국 ‘토끼’와 ‘거북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느 한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병적인 상태에 빠졌으며, 다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토끼처럼 사는 사람의 삶은 공허해진다. 생산적인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거북이의 미덕을 강조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북이처럼 사는 사람의 삶은 경직된다. 주체적인 의도와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토끼의 미덕을 강조한 <별주부전> 이야기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쯤 되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과연 나는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충분히 정직한 사람이라면 높은 확률로 '아니요'라는 답을 얻었을 것이다. 그만큼 두 가지 미덕을 균형 있게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한 가지 미덕에 치우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산다. 그 이유는 거북이의 미덕에 비해 토끼의 미덕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토끼같이 영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용한다. 그 결과 원한의 감정이 내면에 쌓이면서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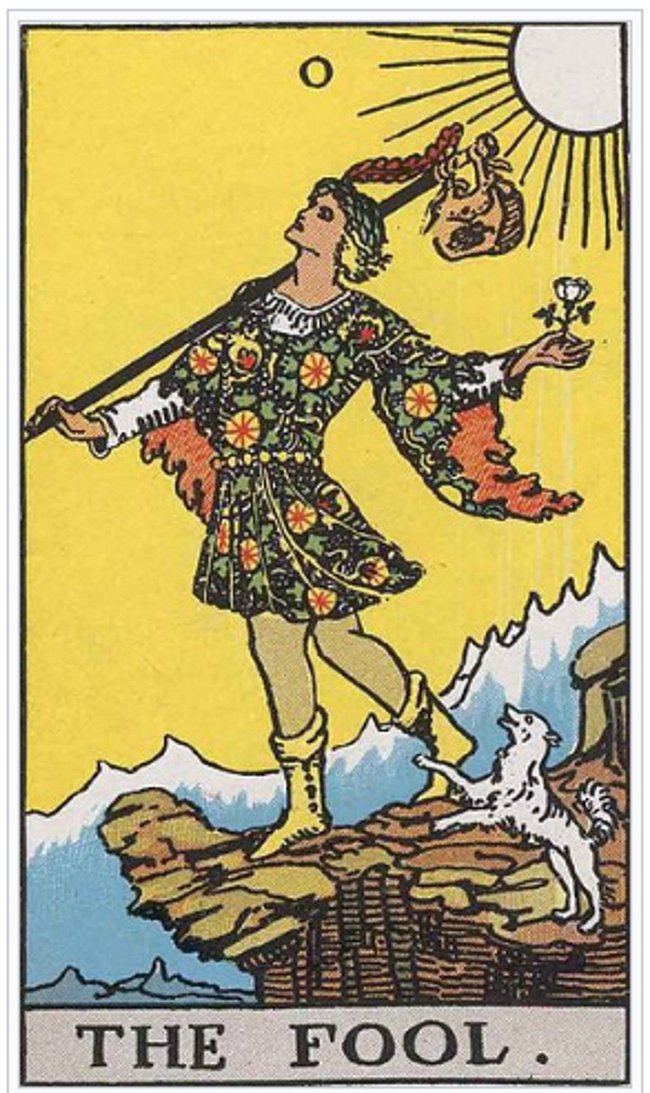 타로카드 중 바보 카드
타로카드 중 바보 카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며 산다. 이 경우는 토끼의 미덕에 비해 거북이의 미덕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좋아하지만, 책임을 논하기는 싫어한다. 그 결과 불안정하고 근시안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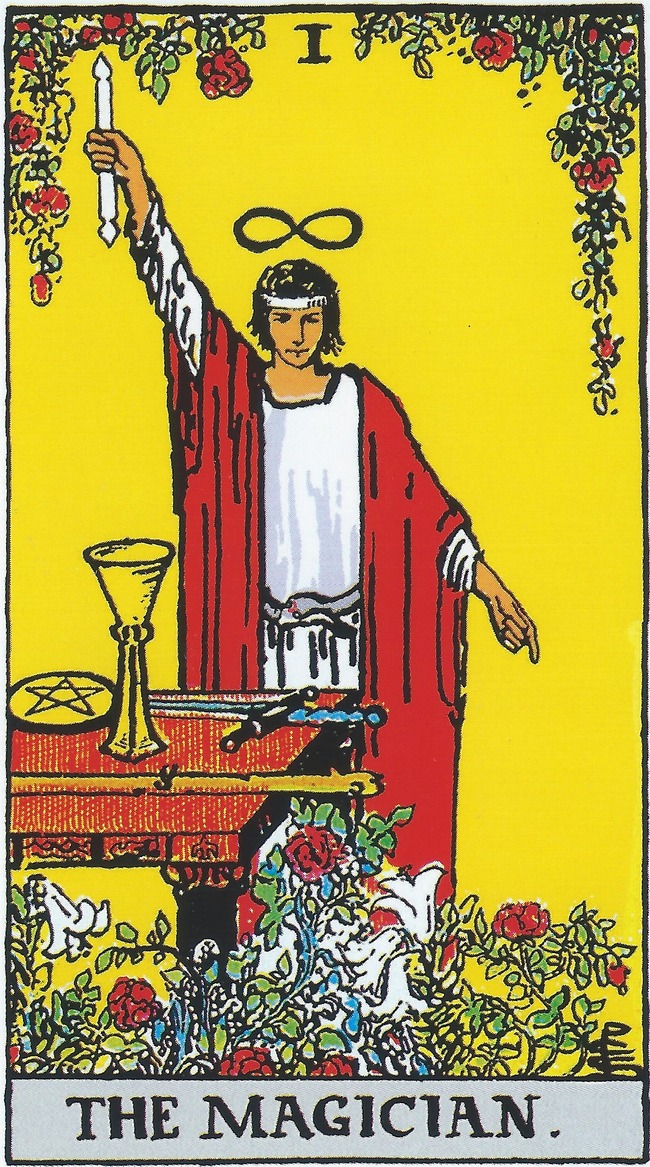 타로카드 중 마법사 카드
타로카드 중 마법사 카드
삶에는 두 가지 미덕이 모두 필요하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성실함과 일관성을 배워야 하고, 거북이는 토끼에게 영리함과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 '토끼의 미덕'과 '거북이의 미덕'은 도교의 유명한 태극문양의 음양처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미덕만을 쫓는 일은 자신의 인격적 단점을 극대화하게 된다. 칼 융의 저서 <레드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영리한 바보가 되는 일이 궁극의 의미로 이어진다.'
토끼의 영리함과 거북이의 순박함의 조화가 곧 삶의 의미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두 가지 미덕을 모두 챙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미덕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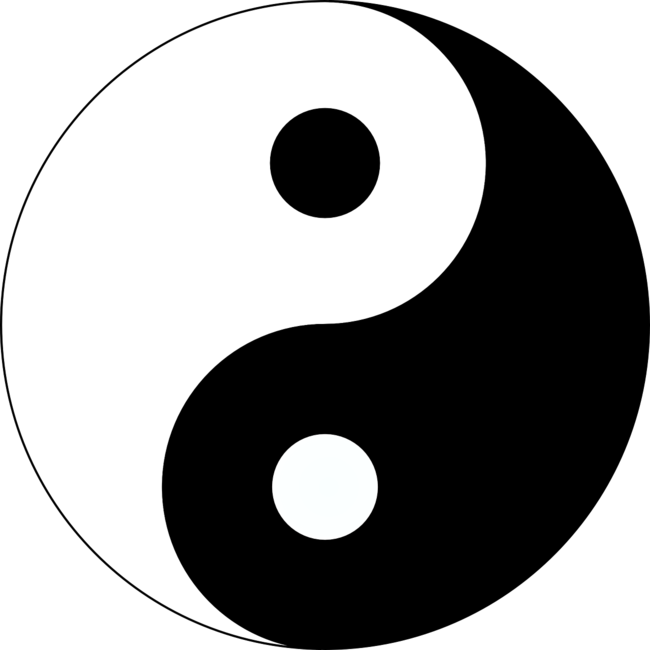 도교의 태극문양
도교의 태극문양
[참고문헌]
-Higgins DM, Peterson JB, Pihl RO, Lee AGM. “Prefrontal cognitive ability, intelligence, Big Five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advanced academic and workplace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298~319
-칼 구스타프 융.(2020).RED BOOK.부글북스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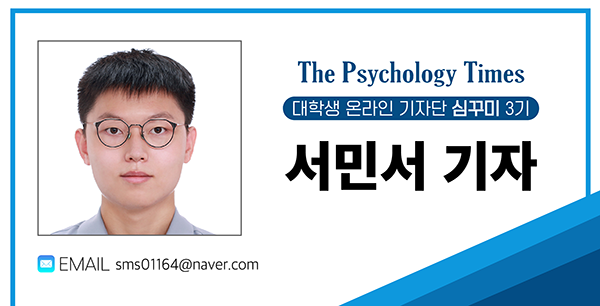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994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994

sms011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