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다연
양다연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양다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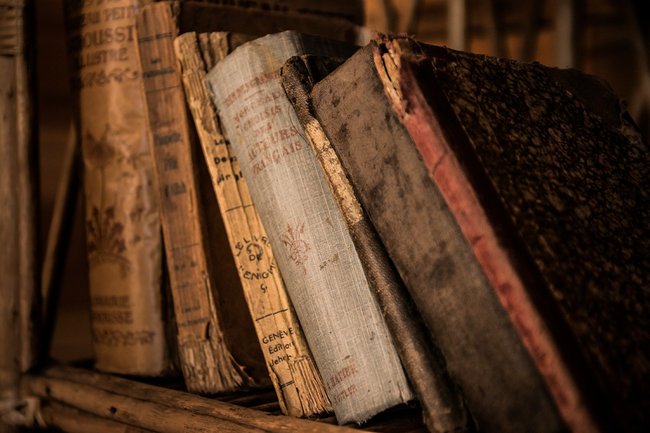 오래된 책(출처: Pixabay)
오래된 책(출처: Pixabay)
예전부터 전해지는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의 언어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깊은 교훈을 품고 있어 수 세기 동안 인류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게다가 구구절절한 말 대신 한 줄의 속담을 사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속담은 대화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선조들은 주로 일상 생활에서 그들이 느끼고 배운 바를 속담으로 표현했다. 특히 농경 생활을 한 선조들은 날씨에 민감했기에 주로 날씨를 예측하는 속담들을 많이 사용했다.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등의 속담들은 모두 선조들이 동식물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담고 있다. 과거에는 그저 주변을 관찰하고 많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했던 것뿐이었겠지만, 날씨의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오늘날에도 선조들의 속담은 대부분 틀린 것이 없다. 사람에 관한 속담도 마찬가지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등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람에 관한 속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내면에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조들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 속담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오늘날 그러한 현상 이면의 심리학적 요인이 밝혀지기도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 등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있는 속담인데, 사실상 속담들을 관통하는 의미는 하나이다. 울고 보채는 아이가 엄마를 귀찮게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떡을 한 번 더, 젖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얼핏 듣기에는 우는 아이가 욕심쟁이처럼 보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반박할 수 없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는 아이가 아닐까? 일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근거들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반박되며, 심지어는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곤 하며,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한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배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활발하게 주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독도는 ‘당연히 반박 불가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일본의 억지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고, 대응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기에 굳이 일본에 대응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도 어느정도는 울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에게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선전해야한다. 일본보다 더 크게 울어서 일본의 울음이 들리지 않게 해야하는 때도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오늘날에는 흔한 다홍치마는 조선시대에 오직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이었다. 왕족이 아닌 평민 여자는 일생에서 결혼식 단 하루만 다홍치마를 입을 수 있었다. 그만큼 선조들에게 있어 다홍치마는 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기에 다른 치마와 다홍치마가 같은 가격이라면 다홍치마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속담의 심리학적 원리는 경제학에서도 사용되는 ‘소비자 심리’라는 것이다. 같은 값이라면 다홍치마를 사겠다는 속담은 사람들이 다른 색 치마보다 다홍치마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치마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다른 치마보다 다홍치마를 사려는 소비 행태를 보일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다홍치마처럼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물건의 시장을 다른 시장과 차별화하고, 동일 제품군 내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만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더 많이, 더 빨리 물건을 소비하게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업의 가격 결정을 ‘가격차별화’라고 부르는데,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의 가격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과거의 다홍치마는 오늘날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한정 상품이나 다름이 없으니, 같은 값이라면 다홍치마를 사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는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꽤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랑비도 모이면 태산이 되어 우리의 옷을 적시기 마련이다. 선조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모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는 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중독되는 과정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과정과 같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부터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까지 다양한 종류의 중독은 우리의 삶을 망친다. 문제가 되는 행동이 해로울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 자신이 행위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가랑비가 옷을 적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비를 맞으며 서 있다가 온 몸을 비로 적시게 되는 꼴이다. 하지만 비에 젖은 옷은 말리면 되고, 중독은 벗어나면 된다. 그리고 젖은 옷은 음지보다 양지에서 더 빨리 마르는 것처럼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에 중독자가 있다면 그들을 범죄자로 인식해 낙인을 찍지 말고 환자로 인식하는 방법은 그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자를 중독자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해 형사 처벌을 하는데, 정신병원 등 치료기관에서 환자로서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와 교도소 등 처벌 시설에서 지내는 마약 중독자를 설문해보면 전자의 경우가 더 강한 극복 의지, 자립 의지를 보인다. 언제나 비에 맞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출처 표기>
곽진오. (2019).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에 대한 고찰 –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0(120) 205-223.
권혁민, 김영호 외 3인. (2019).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인식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의 인식 변화. 3(2) 189-217
임상일. (2011). 주요 고사성어, 사자성어에 대한 경제학 해석 1. 사회과학논문집. 30(1) 245-272.
네이버 지식백과. 속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7456&cid=47303&categoryId=4730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7469&cid=47303&categoryId=4730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7454&cid=47303&categoryId=47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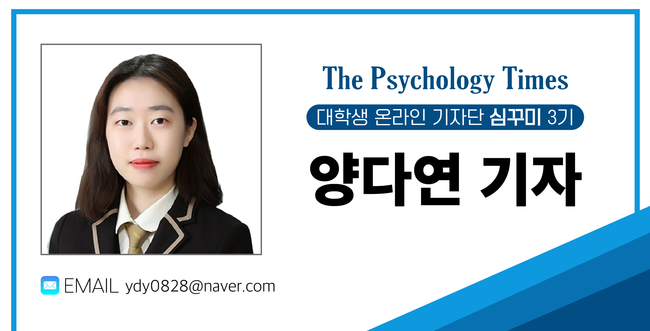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055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