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민
이선민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선민 ]

1987년,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18개월 어린 여자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워낙 깊고 암석으로 둘러싸인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구조대원이 모여 장장 56시간의 구조작전이 펼쳐졌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그 당시 700,000$라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구조 시간 동안 미국인 모두는 그녀의 대모, 대부였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맥클레어.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시카를 돕기 위해 선뜻 기부까지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희생자에게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희생자에게 너무 적은 주의를 기울이는 편향을 뜻한다. 연구자들은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에 대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바로 비율이다. Jenni와 Loewenstein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도울 수 있는 절대적인 숫자보다 도울 수 있는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희생자가 100명일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0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 매우 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가 한 명일 때 우리가 한 명을 돕는다면 100%의 비율로 모두를 도운 것이다. 이러한 비율상의 이유로 100명 중 1명일 때보다 애초에 희생자가 1명일 때 더 도울 의지를 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정서이다. small과 Loewenstein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정서는 식별 가능한 한 명에 대해서, 식별 불가능한 다수에게보다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난 정서는 우리의 판단에 기여하여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기부 행동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을 하려는 정의로운 동기일 수 있지만, 동정심에 입각한 정서적 동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정서 반응은 누군가를 도울 의지를 낼 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도움의 손길이 다수에게 닿으려면
그렇다면 이 식별 가능한 희생자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앞선 사례인 제시카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제시카는 당시 너무 어렸고, 그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주목받고 도움받아 마땅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한 아이에게 모여진 700,000$라는 액수는 원화로 8억 3천만 원에 육박하며 30년 넘게 지난 일임을 고려하면 더 큰 금액이다.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많지만, 모두가 기부를 통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한 아이에게로 집중되는 과도하게 많은 금액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편향을 배움으로써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정서나 비율에 입각한, 때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닌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효과를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기부 홍보 페이지를 살펴보면 한 아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본 적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부단체의 마케터가 된다면, 이 효과를 결과적으로는 더욱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하연 외 2명, 「기부 설득에서 수혜자 특성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효과」, 201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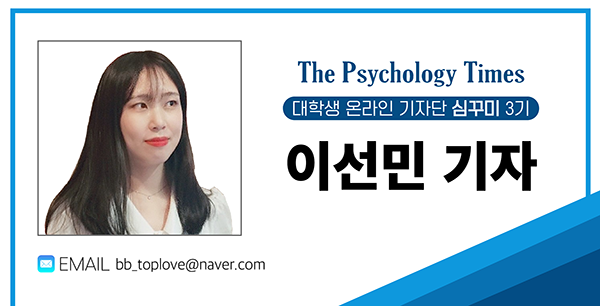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16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