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여정
임여정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임여정 ]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는 직역하면 “카페라테는 말이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어른들의 훈수에 대한 청년층의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 과거의 자신의 영광에 매몰되어 현재 MZ 세대에게 자신의 성취를 통해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해 주는 어른들에게 사용된다.
안타까운 점은 이분들의 조언이 현재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청춘의 상황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베이비붐 세대인 당시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 집을 살 수 있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현세대는 이미 주식 개미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4050 연령층에서 20대 시절 어린 날의 추억을 회고하는 것은 단순 과거에 대한 열망은 아니다. 이런 현상은 “회고 절정” (Reminiscence bump)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고 절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게 하였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햄프셔 대학교의 크리스티나 스타이너 심리학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사람들이 15세에서 30세 사이인 초기 성인기의 경험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고 한다. 급속한 뇌의 신경 발달 과정이 진행된다는 10대에서 20대 무렵 누린 문화는 다른 기억보다 더 강렬하게 남아있고, 이때의 경험들은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점은 노년층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했을 때 대개 15에서 30대의 가장 많이 회고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영화 “써니”, “건축학개론”에 이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까지 모두 전 연령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복고풍 드라마들의 주인공 연령층이 초기 성인기였던 이유도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복고가 경기 불황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과거의 좋았던 것을 떠올리는 행위는 나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안감을 과거의 안락하고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 보호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오래된 것에 대한 향수는 짙어진다.
한편 2021년 현재, 흔히 말하는 “라떼~”시절의 산물이 다시 유행했다. 방탄 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복고 콘셉트, 부모님의 대학 시절에 유행했던 통 넓은 바지와 곱창 머리 끈, 다양한 기업들의 복고 마케팅 열풍.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2021년, 지나간 날을 재조명하는 복고 열풍이 불었다.
복고 열풍은 해당 과거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 공통분모를 확장하며 세대 통합과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 넓은 바지나 트로트처럼 시대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복고 이미지는 중장년층들에게 과거의 사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40·50대들이 어린 시절에 봤던 익숙한 콘텐츠들이 다시 유행하며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자녀 세대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이 없었다면 정체성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 경험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대이다. 과거를 회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현재 당면한 일을 해결하는데 자신감을 준다는 점에서 복고 열풍은 좋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단순 회피 현상은 아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왜곡되고 편집된다. 정서적 퇴색 편향 (fading affect bias)에 따르면 과거의 부정적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말처럼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보다 더 빠르게 희미해져 간다. 실제로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뀌는 것이 더 진화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과거는 임의로 편집된 기억의 산물이기에 어른들의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자기 자랑은 과거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러한 현상을 학계에서는 “낙관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가 과거 부정적 기억에서 비롯된 고통을 줄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를 발휘하는 것이다.
종종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공유했던 친구를 만날 때면 우리도 라떼를 찾는다. 새로 나온 노래도 좋지만, 초등학교와 중학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선곡하며 피로감을 풀기도 하고, 대학생인 나도 “요즈음 아이들은 전화를 받을 때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는 것을 갤럭시 폴더 폰 때문에 알았다며?”라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문장은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 회상의 힘은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나아갈 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꼭 길러야 할 일종의 체력이다.
자기 삶의 충실하고 동기 부여를 얻기 위해 “라떼”는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한곳에 뭉쳐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긍정적인 성취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주고, 실패한 경험은 동기 부여로 작용한다. 다만 타인에게 자신의 라떼 행보를 따라오기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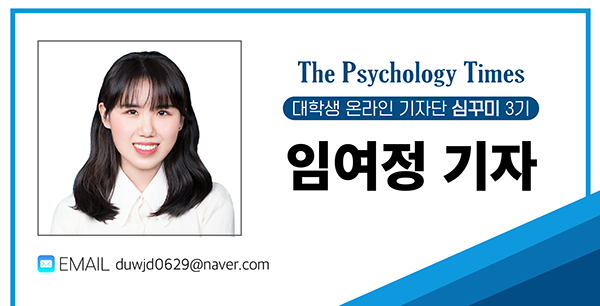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0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