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지연
우지연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우지연 ]

당신의 답변은?
“이번에 준비했던 공모전 또 떨어졌어.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어.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만약 당신의 지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1) “근데 솔직히 그거 내가 봐도 떨어질 것 같긴 하더라.”
2) “쯧쯧… 내가 뭔 말을 하겠니. 안타깝네.”
3) “공모전 하나 떨어진 거로 뭐 그렇게 심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4) “에이. 내가 보기엔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5) “네가 보기엔 공모전을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6) “다음에 공모전 준비할 땐 이렇게 해봐.”
7) “야. 너도 공모전 떨어졌냐? 나도 떨어졌어. 심지어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준비한 거 알지?”
8)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혹시 당신의 대답이 위의 8가지와 유사하다면, 그 말의 의도가 상대를 위하는 선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공감적 듣기’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바른 공감’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공감, 이렇게!
“나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들어보겠다.”
박재연 저자의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에선 공감적 듣기를 위해 위와 같은 의도를 먼저 가져야 하며, 다음 4가지 순서에 따라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화자의 말 듣기
2) 화자의 감정 듣기
3) 화자의 핵심 욕구 듣기
4) 계획 묻기
첫번째, 화자의 말 듣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혹은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좋다.
두번째, 화자의 감정 듣기 단계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말 속에서 상대의 감정을 추측해보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신의 추측이 틀린다 해도 그러한 시도는 상대로 하여금 당신이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상대가 본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에 기여한다.
세번째, 화자의 핵심욕구 듣기 단계에서 당신은 사실 상대방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고 질문함으로써, 상대의 핵심욕구를 명료히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소망했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다시 말해, 욕구는 짜증, 분노, 서운함 등의 다양한 감정적 부산물이 발생하게 만든 본질이자 근원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거부당했다’라고 판단 후, 극심한 서운함을 느낀 개인은 사실 소속감과 친밀감이라는 핵심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라 볼 수 있다.

상대가 ‘왜’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것인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고, 질문해주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감정이 촉발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고, 궁극적으론 본인에 대해 좀 더 이해하도록 돕는다.
마지막, 계획 묻기 단계에서 당신은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계획이 정말 상대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인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공감적 듣기를 해야 하는 걸까?
혹자는 위와 같은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감은 꼭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
그 감정이 읽히고 수용될 때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판단,평가,충고’ 등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내리는 판단, 평가, 충고는 모두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 살아온 세상에 근거해 형성된 것이다. 나의 세상에선 절대적인 진리인 사실이, 상대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의 관점은 잠시 거두고, 상대의 감정이, 상대의 근본적인 바람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는 ‘공감적 듣기’ 통해 우린 상대가 본인의 감정을 명료히 하고, 좀 더 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와 내가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참고 문헌]
1) 박재연,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한빛라이프, 2020, 136-144, 173-198.
2) 강진령, 『상담 연습』, 학지사, 2016, 107-116.
3) 이미지 출처 : Pixa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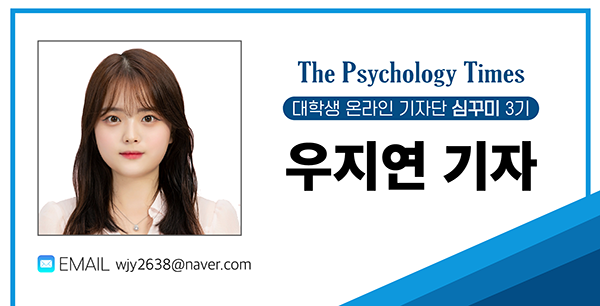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7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