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다연
양다연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양다연 ]
 대표적인 보석 광물인 다이아몬드(출처: pixabay)
대표적인 보석 광물인 다이아몬드(출처: pixabay)
'명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대부분이 비싸고 좋으며 한 번쯤은 갖고 싶다고 생각한 물건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반 정도 옳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명품들의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명품의 진정한 사전적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며, 상품적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은 고급품‘이다. 그리고 오늘날 명품의 정의는 변질되어 왔다. 지금부터 명품의 가치가 변질된 배경, 한국 사회에서의 명품 소비 및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명품의 '가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반대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 심리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다. 하지만 베블런 효과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즉, 재화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그 재화를 더욱 원한다는 것이다. 이 원인은 중세 시대 귀족 문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 전쟁에서 승자는 최고 계층이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뉘었다.
지배계급은 일을 하지 않고 피지배계급이 생산한 것들을 통해 살아갔는데 귀족들은 자신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계층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했다. 값비싸지만 쓸모없는 상품을 사거나, 실생활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비했다.
문제는 이러한 귀족들의 소비행태를 중간 계층이 따라하기 시작하며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후 기존에는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적 소비를 일반 시민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 귀족과 같은 옷, 같은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자존심과 경쟁 욕구를 충족하고 결국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유없이 비싸며 겉보기에 호화로운 것들’만을 추구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K-명품
‘3초백’, ‘맥 럭셔리’등의 단어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3초백’은 길을 걷다 보면 3초마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루이비통 가방에 붙여진 별명이며 ‘맥 럭셔리’는 맥도널드와 럭셔리를 섞은 말로 명품을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기준 “명품을 갖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명제에 21%의 한국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11년, 45%의 한국인이 명제에 대하여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의 명품 업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의 매출 변동 추이는 2000년이후 10년 동안 무려 10배를 넘어섰으며, ‘루이비통(LOUIS VUITTON)’에서는 한국을 세계 4대 명품 시장 중 하나로 뽑았을 정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명품 업계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에는 인간의 2가지 욕구가 뿌리 잡고 있다.
1. 일치의 욕구
그 중 하나는 일치의 욕구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 ‘또래압력’ 현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은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해 역사적으로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이는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마치 휴가철 다른 집들이 여행을 떠나면 우리 가정 또한 여행을 떠나야 할 거 같고,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해서 결국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자신들이 상류층의 준거집단에 속한다고 여기게 하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치를 하도록 만든다.
2. 과시의 욕구
베블런은 부자들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주위 동료나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색과 모양의 티셔츠 한 장의 가격 차이는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흰 옷 위에 ‘GUCCI’ 다섯 글자가 박혀있는 티셔츠는 그것이 없을 때의 티셔츠 가격보다 70배 정도가 비싸다.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감수하고 소비를 하는 것은 거의 비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브랜드명이 프린트 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단지’로 인해 몇 십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시욕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소비를 보이는 것이다.
"합당함"
그렇다면 명품은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고유 타악기 중 하나인 북. 북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정성은 감히 어림잡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상이다.
소, 말, 돼지와 같은 동물들의 오랜 시간 건조시킨 후 바느질을 통해 몇 백 개의 실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죽을 다시 한 번 꿰매준다. 이때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죽을 말려준다. 그 후 통나무를 통해 북의 크기를 정하고 그 통을 깎아 외면을 고르게 해준다. 그리고 이미 꿰맨 가죽을 양쪽에 달아준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북은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북의 가격은 20만원 대를 웃돌며 더 품질이 좋고, 섬세하게 만들어질수록 가격대가 높아진다. 명품은 꼭 ‘비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들여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만한 합당한 가격으로 소모되는 재화가 바로 진정한 명품이다.
우리는 이러한 명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단지 사치나 자랑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야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합당함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명품은 오답일지도 모른다.
출처
성낙선 (2017). 베블런의 진화경제학과 다원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11- 243
최항섭 (2003). 명품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5(1) 225-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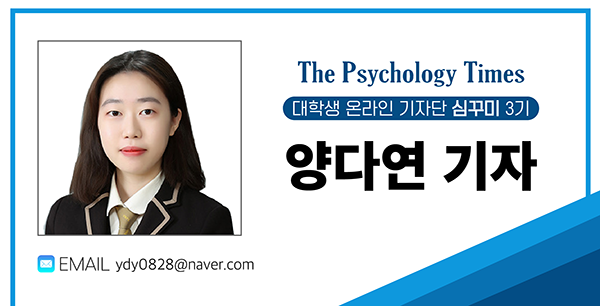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8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