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지연
우지연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우지연 ]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적인 과제를 ‘포기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까 걱정을 거듭하며 ‘대책 A, B, C를 미리 마련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지 못할까 ‘아예 시작을 미뤘다.’
작은따옴표 안의 행동들은 불안도가 높아질 때 흔히 사용하게 되는 ‘안전 전략(Safety Strategy)’이다. 안전 전략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하게 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안전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반복했던 우리의 습관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한 채 갈증에 바닷물을 들이키듯 피상적인 효과만을 가진다. 즉,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이다.
“그 믿음, 사실일까?”
반복적으로 ‘안전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대책 A, B, C까지 마련하면 미래의 문제 상황들을 통제 가능할 것이다.”
“일의 시작을 미루며 고민과 준비를 거듭하다 보면, 완벽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높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1)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2) 완벽주의 3) 과도한 책임감의 세가지 마인드셋(혹은 그중 하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사실일까? 우리가 실패로부터, 예측/통제의 불가능으로부터, 완벽함을 무너뜨리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실 우린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할까 걱정을 거듭하던 당신에게 더 위로되는 말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1. “너는 늘 잘했으니까 실수 안 할 거야.”
2. “실수해도 괜찮아.”
불안했던 나를 안심시키는 말은 언제나 2번이었다. 1번의 전제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반박하지 않지만, 2번의 전제는 그 강박을 깨고자 하는 격려이다. ‘왜 괜찮은지’에 대해 나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나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상대라면, 2번의 말은 더 큰 효력을 가졌다.
실수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했던 그 시도들은 사실 근본적인 불안감을 줄여주지 못한다.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 전제가 애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실수, 실패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아무리 더 많은 걱정과 대비책 마련이 이루어진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까?
"우리에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극복하게 될 것이다."
‘만약…’을 수십 번 거듭하며 그려본 ‘앞으로 갈 길’은 언제나 막막하다. 이때 나는 ‘그동안 온 길’에 대해 떠올린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나는 항상 두려웠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바빴지만 그 상상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맞닦뜨렸던 문제들은 모종의 상처 배인 깨달음을 남긴 채 이내 흐릿해졌다.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도 과거의 나에겐 막막했던 ‘미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많은 불안감은 ‘집착’에서 기인한다. 특히 외부의 칭찬과 기대에 힘입어 강화되었을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를 작은 틀 안에 밀어 넣고, 그 틀에 맞지 않는 다른 부분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 단편적인 존재가 아니며, 상황 및 내부적인 조건에 따라 언제든 의외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입체적인 존재이다.
“나는 대체로 성실한 사람이지만, 한없이 게을러질 때도 있다.”
“나는 대체로 선한 사람이지만, 종종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나는 대체로 좋은 성적을 받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떠한 단어도, 어떠한 특성도, 어떠한 경험도 나를 온전히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까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꼬리표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강렬한 기쁨 또는 슬픔을 주는 꼬리표라고 한들, 그것은 그저 ‘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나’이며, 어떠한 꼬리표도 나의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지키고 싶었던 나의 ‘자아상’, 포기할 수 없었던 ‘꼬리표’를 잃게 될까 두려웠던 모든 이들에게 위의 말을 선물하며 본 기사를 끝맺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제니퍼 섀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신솔잎 옮김, 빌리버튼, 2021
2) 로라 판 더누트 립스키, 『사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문희경 옮김, 더퀘스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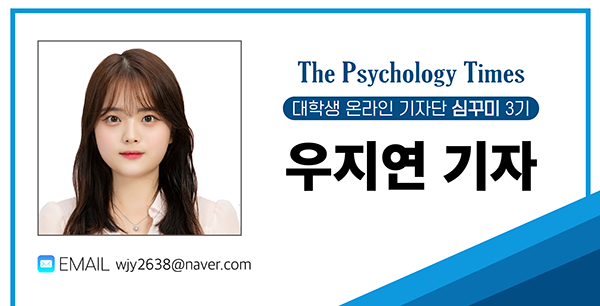
본 기사 소재 선정에 영감을 준 제 오랜 친구와, 그간 제 기사들을 주의 깊게 읽고 격려해 준 가족,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314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