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림
김예림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예림 ]
 2019년 퓰리처상 수상작. 로이터 통신 소속 김경훈 기자가 촬영한 "장벽에 막히다"(Up Against The Wall). / 오마이뉴스
2019년 퓰리처상 수상작. 로이터 통신 소속 김경훈 기자가 촬영한 "장벽에 막히다"(Up Against The Wall). / 오마이뉴스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인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버린다.”
예전부터 궁금했다. 상처의 순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기부단체에서는 대중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을 장려하기 위해 퓰리처상 사진전을 진행한다.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도움 행동을 끌어내려고 할 때, 대부분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며 공감을 통한 변화를 기대한다.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대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타인의 삶을 너무 손쉽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고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까.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
사실 사회의 변화와 도움 행동을 위해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생각보다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엄연히 타인의 고통은 정서적인 동요를 유발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타인에 대한 도움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는 문화적 가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한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장려되는 봉사라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무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타자 개개의 어려움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의무론적인 관점은 공리주의 관점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최대의 이득을 위해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의무론적인 관점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론적인 관점은 고통의 시각적 사진과 같이 빠르고 직관적인 정서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에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특히 의무론적인 사람들에게 도움 행동을 더 잘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사회적인 도움을 유발하기 위해 반드시 강렬한 고통 제시를 통해 정서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공감뿐만 아니라 합리성 또한 중요함이 밝혀졌다. Loewenstein과 Small 또한 도움을 제공하는 두 가지 경로로, 정서적인 동정(sympathy)과 이성적인 숙고를 제안했다. 도움 행동의 원인에 있어 반드시 정서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행동의 결정 요인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동정을 나타내고 이성적인 합리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움의 현장에서는 동정보다는 합리성을 통해 사람들은 도움을 행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 제시를 통해 정서적 동요를 바탕으로 사회적 바람직함을 촉진하려는 것은, 과도해지면 오히려 도움 행동을 바람직하게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균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한편, 오히려 이성이 도움 행동을 저하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도움 행동을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분야에서는 대부분 정서적 동요를 주요 수단으로 홍보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ogen과 Susanna Dilliplane의 연구에서 합리성은 도움 의사를 약화하지 않았으며 동정심을 감소시키지도 않음을 보여주었다. 되려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해결 가능성이 높은 조건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해결 가능성이 낮은 조건의 기부 의사나 기부 금액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에 무분별하게 타인의 고통을 남용하는 것을 자제할 방안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통을 남용하는 사회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을 제시하는 정서적 방식 외 다른 방안도 존재함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Susan Sontag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많은 타인의 고통 사진들이 더 잔혹하고 자극적으로 되는 현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너무 많은 매체에서 쉽고 자주 접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부 영상을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으며,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퓰리처 사진을 보아도 그 감동은 사회변화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 때가 있지 않은가.
즉,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쉽게 접하는 만큼 더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경계해야 한다. 한 삶의 무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공개적으로 공개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자. 타인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되려 수단으로 전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타인의 상처는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그 고통을 밝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채기이고, 비공개적이라고 해서 중요도가 높은 깊은 병인 것이 아니다. 타인을 고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무게를 생각해보고 대상을 인격적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지선, 최인철. (2002).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75-89.
·신홍임. (2015).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의사결정의 개인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85-707.
·Kogen, L., & Dilliplane, S. (2019). How media portrayals of suffering influence willingness to help: The role of solvability frame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31(2), 92-102.
·"타인의 고통은 연민이 아닌 연대의 대상이다" [브라보마이라이프].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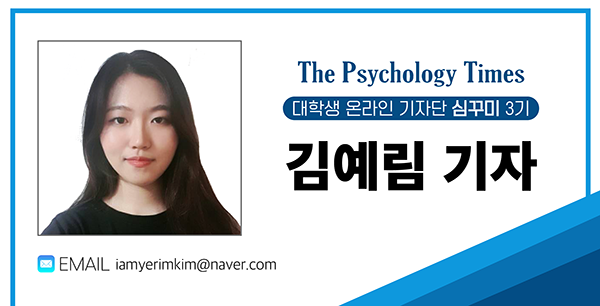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31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