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재원
한재원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재원 ]

넷플릭스 <지옥>의 현실 버전
넷플릭스의 <지옥>을 본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고, 선고된 시간이 되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현상 자체보다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행을 선고받는 이유가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심지어 정의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믿음대로, 집단의 믿음대로, 그리고 정의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지옥>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텐데, 필자의 경우 온라인 마녀사냥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연예인, 유튜버 등에 대한 폭로 및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중에서는 분명 큰 죄를 지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나쁜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논란이 진실이었거나 매우 심각한 사유이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허위 폭로로 인해, 누군가는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비판을 받는다.
온라인 마녀사냥은 진위 판단이나 실제 소송 및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작한다. 주로 누군가가 시작한 비난이나 폭로, 논란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는 근거로 가담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듯 내용을 점점 부풀려간다. 이때부터 논란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우리는 왜 충분한 근거나 사법적 재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한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일까? 약자인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해서는 안 돼서, 법에 따른 처벌이나 재판과정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해당 연예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나 호감이 파괴되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의 기반은 결국에는 논란이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이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배신감이나 분노가 먼저 느껴진다. 그리고 이것은 본능적인 심리 현상이다.
나쁘다는 소문만 들어도 일단 멀리하게 되는 이유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면이 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는 겉으로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일단 경계하고 멀리하곤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나쁜 행동의 징조가 보일 때, 미리 나쁜 사람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계하는 것이 안일하게 괜찮으리라 판단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일단 경계하고 보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적거나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안 좋은 평가를 들었다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편향을 가지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진화 심리학자 마티 헤이즐턴과 데이비드 버스가 창안한 ’오류 관리 이론(error management theory)‘이다.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두 선택지가 주는 절대적인 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진화 과정은 가장 불이익이 적은 선택지에 인지적으로 편향되도록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극단적인 의견으로
주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댈수록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단 극화 현상 (group polarization)‘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집단 극화는 집단 내에서 토론할 때 집단의 구성원이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이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Moscovici & Zavalloni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미국인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물어보고, 이 주제에 대해 집단 구성원들과 토의해보라고 했다. 토의가 끝나자 혼자 있을 때는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이 토론 이후에는 더욱 극단적인 의견을 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에 살짝 호감이 있던 사람은 그를 매우 지지한다고 말하게 되었고, 미국인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여긴 사람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온라인 세상은 집단 극화가 일어나기에 최적인 곳이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끼리 토론할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에 서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소문이나 논란이 퍼질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접하면 접할수록 더욱 극단적인 의견을 갖게 된다.
절대적인 선과 악?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내가 지옥행을 선고받았다면, 자신 있게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은 물론 거짓말도 안 해보고, 불의를 방관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과 싸워본 적도 없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보거나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다. 따라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말 명백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군가를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상황과 자신의 동기가 결정한다.
하스토프와 캔트릴의 고전 연구에서는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미식축구 경기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상대 팀의 반칙 횟수를 두 배 이상 더 많이 보았다고 보고했고, 서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보다 상대 팀이 더 거칠고 비열하게 경기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선과 악이 혼합되어있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정도나 자신이 가진 동기에 따라 판단한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악행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는 피해자의 폭로 글을 접해 그 사람에게 이입했다면, 가해자의 단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온라인 마녀사냥은 빠른 공론화와 피해자에 대한 귀 기울임이라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폐해 역시 심각하다. 이러한 폐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에 더해 인터넷의 빠른 정보전파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과도기의 부작용을 막는 것은 아직은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각자 인터넷을 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일단 사법 체계를 믿고 소송이나 재판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마녀사냥은 대중이 사법 체계와 처벌의 강도를 불신한다는 또다른 지표이기도 하므로, 사회 시스템 역시 법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또는 현재 겪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일지를 공감할 수 있다면, 일단 비난해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자 소쉬르는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등 이분법적인 사고에 역사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욱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온라인 마녀사냥이 본능적인 심리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인에게는 이를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1] 이남석. (2016). 인지편향사전. 옥당
[2] Hastorf, A. H., & Cantril, H. (1954). They saw a game; a case stud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1), 129–134.
[3] Grison, Sarah and Gazzaniga, Michael. (2019). "Psychology in Your Life, 3rd Edition" Psychology Facu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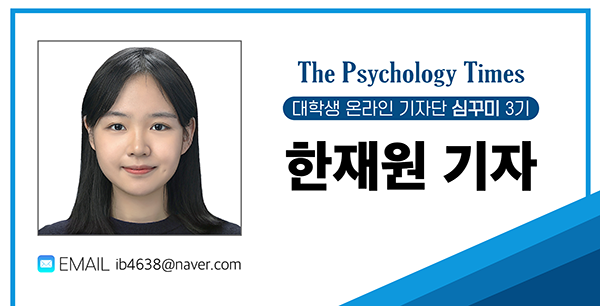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57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