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지
박은지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박은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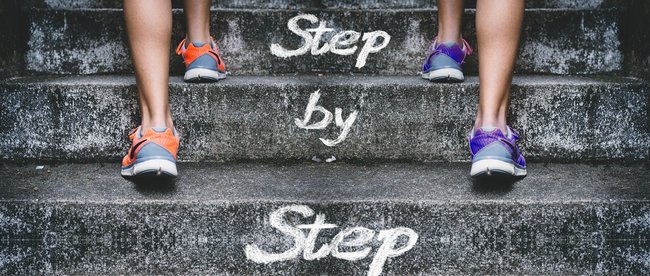 사진출처: pixabay.com
사진출처: pixabay.com
사람들은 새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워진 나, 많은 사람이 변화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오래가지 않는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2021년에 세웠던 계획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들 중 30.9%는 새해 계획을 한 달도 지키지 못했다. 어쩌면 2022년의 2주가 지난 지금, 이미 목표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의미이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 ‘나 몰라 효과’와 ‘마태 효과’
나는 왜 실패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획의 작은 한 부분에서 실패하면 전체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나 몰라 효과(what-the-hell effect)’라고 한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운 후 초기에 실패를 경험하면 ‘에라 모르겠다.’하고 작심삼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춘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행 결과를 보이며,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반면, 실패 경험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해 무기력해진다. 이는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성취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마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심리학적 지침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 계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를 하위 목표로 나누고, 육하원칙으로 정교화하며, 측정할 수 있도록 변환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한 달에 2kg씩 감량’이라는 세부적이고 측정 가능한 하위목표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나는 체중감량을 위해 이번 달에 월, 수, 금 3일 동안 오후 8~9시까지 집 근처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것이다.’가 된다. 이 같은 목표의 정교화는 방법과 관련된 상황적 단서가(시간, 요일, 장소 등) 목표 행동을 기억에서 쉽게 떠올리게 만들어 행동으로 나타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목표의 현실성도 중요하다.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는 실패할 확률을 높여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자신이 목표를 실천할 가능성을 0~100점까지 환산해보자. 만일 70점 이상이 아니라면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장애물 예측이다. 사람들은 실천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주의가 집중되어 방해요소엔 상대적으로 주의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도 외부 장애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과정 시뮬레이션’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일상적인 자신의 행동목록에 실천 행동을 결합해서 실천 행동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 또한 실제 행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행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획에 대한 기록, 타인에게 계획 말하기 등도 목표 수행에 좋은 영향을 준다.
완벽이 아닌 완성으로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은 성취의 이득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적합한 방법 또한 터득한다. 하지만 성취 경험이 별로 없는 ‘프로실패러’는 성취의 이득을 체감한 적이 별로 없기에 실천 과정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어떤 방법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작은 성취에도 보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제는 성공하고 내일은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의 자신을 칭찬하고, 오늘의 실패 경험은 분석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무엇이 나를 방해했는지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자신을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참고자료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오경석. (2001). 자기 효능감 프로그램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정은경, 「코칭심리의 이론과 실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코칭심리)」, 학지사, 2020
정상희, "직장인 10명 중 3명, "새해 계획 한달도 못 지켜", 파이낸셜뉴스, 2021.12.31,
https://www.fnnews.com/news/20211231135842558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791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2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