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미
김경미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경미 ]
어느 날 자려고 누워있는데 딸아이가 엄마 옆으로 와 자리를 잡는다. 자기 전 어둠 속에서 엄마랑 대화하는 시간을 은근히 즐기는 6학년 큰 딸이다. 침대 곁으로 와 엄마 옆에 눕더니 입을 연다. “엄마,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엄마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엄마랑은 많이 다른 느낌으로 엄마를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면 나도 궁금증이 발동한다.
그래서 딸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물었다. “친구 같은 엄마.”라고 딸이 말했다. 딸아이의 말은 너무 행복한 말이었다. 학창 시절 앙케트 질문에 ‘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라는 항목에 항상 적어 놓았던 답이 ‘친구 같은 엄마’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마냥 친구 같은 엄마는 되지 못한다. 엄한 엄마일 때가 많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관대하기만 한 엄마도 아니며 아이들에게 결핍도 약이라는 생각에 뭐든 호락호락해주는 엄마도 아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는 아이들, 책임감 있고 주도적인 아이들로 크기를 원해서 마냥 받아주고 도와주는 엄마도 아니다.
딸아이가 친구 같은 엄마로 인식하는 것은 왜 일까? 가끔 딸보다 더 망가져 막춤을 추는 엄마, 딸과 같이 훈남 캐릭터에 홀딱 빠져 흥분하며 얘기하는 엄마, 못 말리는 공주병이라고 딸들에게 핀잔을 받는 엄마 등등이 떠올랐다. 그러다 내가 얻은 답은 엄마가 자신을 존중해 주고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항상 나를 믿어주는 엄마라고 믿고 있기에 자신은 엄마랑 동격인 샘인 것이다. 엄마가 자신을 존중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하니, 엄마를 자신도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이 밤도 딸아이는 침대에 나이 차이 나는 친구를 눕혀 놓고 학교 얘기며 친구 얘기며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시작한다.
‘함성은 음악 너머의 음악’이라는 말이 있다. 노래하는 무대에 호응하는 관중이 없다면 그 무대는 빛을 잃을 것이다. 가수의 노래에 열광하는 함성이 있을 때 결국 무대는 완성된다.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는 것 같다. 아이들의 소리에 메아리가 되어 주고 아이들의 음악에 울림통이 되어주는 엄마가 있어 아이들의 모든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0년의 세월, 엄마와 딸이라는 자리 등 많은 것에 격차가 존재하지만 아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 주고 아이의 말에 장단을 맞추다 보면 딸에게는 둘도 없는 존재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벗은 참 의미가 있다. 벗이 있어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된다. 말 그대로 동행하는 벗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의 걸음에 동행하는 벗이 되고 싶다.

헬리콥터 맘이 되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느라 삶이 벅찬 엄마들이 있다. 내가 다둥이를 낳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따라다닐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첫 딸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집에서 버스로 세정거장을 가야 했던 학교를 일주일의 적응기가 끝나고 혼자 오고 갔다. 엄마가 운전도 못하는 데다가 밑에 어린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딸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거나 ‘벌벌’ 하지 않았다. 딸 또한 나의 믿음대로 어려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등하교를 혼자 잘해 주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다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배워 간다. 다둥이 육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살뜰히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은 외동을 키울 때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다. 항상 엄마의 손은 분주해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 조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치로움과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주지 못하는 것을 다둥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듬어 가고, 서로 배워가고 채워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인생에 있어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형제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형제를 선물해 준 것이 최고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또한 사교육을 하며 키울 생각이 별로 없었기에 아이 교육비가 무서워 애를 못 낳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엄마 힘으로만 키우는 것이 육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둥이를 낳을 수 있었다. 엄마의 산도를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때로는 엄마가 다 채우려고 하는 양팔은 아이를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 있고 좁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의 실력을 대변해 주듯 종종거리지 말자. 아이의 열등함을 엄마의 무능으로 연결하여 아이에게 우등만을 요구하지도 말자. 엄마가 뭘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환해 엄마가 믿음으로 바라봐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실제로 엄마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셋째를 가지기 전 내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엄마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 또한 부족함 없이 줘야 한 다는 생각이 때로는 엄마를 더욱 가혹하게 자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면 좋겠지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도 여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와의 사랑도 내 자녀와 함께 채워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아이들은 마냥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 보았겠지만 아이들은 엄마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이다. 엄마들이 어디를 가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이가 어느새 와서 안긴다. 아이를 안아주기엔 엄마 옷은 반쯤 젖어있고 팔뚝에도 고춧가루와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엄마 품에 안긴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정말 '자녀들이야 말로 아무 조건 없이,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사랑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큰 태가 나지 않는다. 아무 오차도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고, 사람들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 바로 자녀들이다. 자녀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가 된다. 엄마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 존재만으로 자신의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엄마를 바라보며 사랑을 쏟는 아이의 전적인 사랑이 엄마를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존재로 만든다. 엄마들은 그 사랑을 받으며 강인한 엄마로 세워져 간다.

여러 가지 생각을 적어 놓은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5년 전 기록이었다. “엄마가 늘 너희의 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가 늘 엄마의 편이더라. 늘 사랑해주고 감사하는 내 소중한 딸들아. 엄마도 많이 사랑해. 소중해. 감사해.” 때로는 불안정한 사랑 같고 부족한 엄마인 내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아이가 함께 채워갈 것이다.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도록,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이들이다.
간섭은 아이를 달아나게 하고, 믿음은 다가오게 한다고 한다. 아이를 찐하게 믿어주며 엄마 곁으로 다가오게 만들자. 곁에 다가온 아이의 사랑을 먹으며 육아의 합작품을 만들어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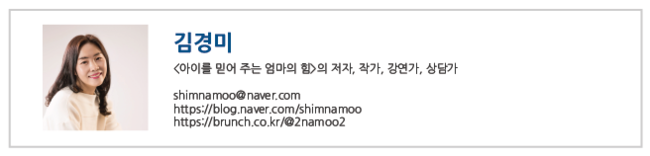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04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