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소연 ]

꿈 없던 아이
같이 목욕을 하다, 첫째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그럼 우리 딸은 꿈이 뭔데?"
"나는 화가!!"
"음... 엄마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은 없었어. 엄마 꿈은 행복하게 사는 거였지"
나는 참 꿈이 없는 아이였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귀찮았던 것 같다. 상상해봐야 좋을 것 같지 않은 미래라, 굳이 마음을 부풀려가며 꿈꾸고 싶지 않았겠지. 그것보단 당장 오늘 조금 더 행복하고 싶었다. 추운 겨울 뜨끈한 물에 샤워하고 맨 몸으로 이불속에서 뒹굴듯, 따뜻하게 품어줄 집과 사람이 필요했다. 늘 사막 한가운데 바람을 맞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행복을 꿈꾸었다.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야 했다.
"세상에 너만 그렇게 평생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절대로 없어"
실소하던 엄마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진짜 그렇다면 혼자 일하면서 사는 삶이 나았다. 친구들은 많으니까, 위안이 필요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되었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격하게 겪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실없는 짓도 많이 해봤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혼자 일하려면 대학도 나와야 하고, 직업도 선택해야 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 생각해봤다. 행복에 대한 답은 마음일 것 같았다. 무조건 심리학과를 가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임상에 있지는 않지만 평생 심리학에 매달려 산다.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해졌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어린 시절 꿈꾸던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랑을 주는 마음'이 되었다. 주는 만큼 받는다. 주고, 또 받는 사랑이 우리 공간에 깃들어있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면 생글생글 웃어주고, 부비대는 얼굴에 까르륵거린다. 많이 아팠지만 온전히 사랑받으며 자란 첫째는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한다. 짜증이 났다가도 동생 얼굴을 보면 '귀여워!'를 연발한다. 동생 얼굴을 주물럭거리고 안아준답시고 깔고 누워도 동생도 좋아하긴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깃든 행복은 나에게도 전염된다. 남편은 아빠인지 남매인지 그 사이에 끼어 함께 뒹군다. 장난이 심해 결국 하나를 울리고 말지만.
많이 행복해졌구나, 깨닫는다.
사막에 바람을 맞고 서 있어도 우리는 함께 부둥켜안을 테니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에 사랑이 깃드는 것이니까. 사막도 따뜻한 공간이 된다. 언젠가 둥지를 떠나 각자 어른의 삶을 살게 되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은 사랑일 테다.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기도했다. 나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나가 일을 하려면 모진 일도 겪겠지만 우리가 만든 사랑의 공간이 탄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행복의 날개를 훨훨 펼치길
일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늘 물어본다. 새로 개발 중인 디저트의 맛은 어떤지,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과 색상은 어떤지. 시장조사도 함께 다니고, 엄마 아빠가 왜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상품을 관찰하는지 설명해준다. 가방 하나, 인형 하나를 사주더라도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연결 지어준다.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의견을 존중하고 목표를 설정해준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온 지난한 과정은 내 아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전초전이었기를 바란다. 첫째 아이가 아팠던 과정이 튼튼한 둘째를 위한 전초전이었듯이. 아홉수 올해가 다 지나간다. 내 나이는 앞자리가 바뀌겠지만 삶은 더 나아질 것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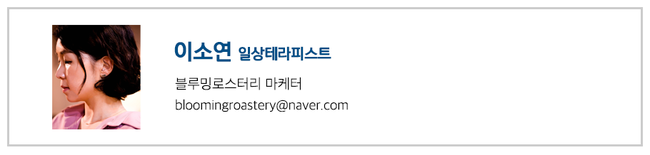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11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