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안남
선안남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선안남 ]
영국의 늦가을엔 아이들 학교가 파하는 3시에서 4시 사이면 어둠이 밀려왔고 나는 한기를 잘 느꼈다. 도롯가에서 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어린아이 셋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몸의 피로와 마음의 긴장이 풀릴 새가 없었다.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기까지의 여정이 너무 힘겨워서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내가 먼저 기절하듯 먼저 잠들곤 했었다. 또 그러다가 새벽에 불현듯 일어나 아기들이 안전하게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자곤 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엔 누군가가 정원에 침입해서 창고의 문을 열어두고 간 흔적을 본 뒤로는 안전이 더 걱정됐다. 마음만 먹으면 침입할 수 있는 곳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비상시에 아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가를 마음으로 여러 번 시연하다가 생각하다 잠들기도 했다.
자주 막막했고 불현듯 무서워졌다.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떨려서 괜히 입이 딸깍거리고 한기가 느껴지던 시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가 무서워서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달라는 아이, 물 마시고 자고 싶다는 아이가 어서 빨리 잠자리에 들기를 재촉하고 기다리며, 그 어둠의 시간을 겨우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아이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온 사방이 캄캄했다. 아이들의 숨결과 목소리를 따라 물을 달라고 한 둘째의 두 손에 물 한 컵을 쥐어주는데 칠흑 같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시야가 희뿌연 어둠, 여전히 어둡지만 실루엣은 감지할 수 있는 어둠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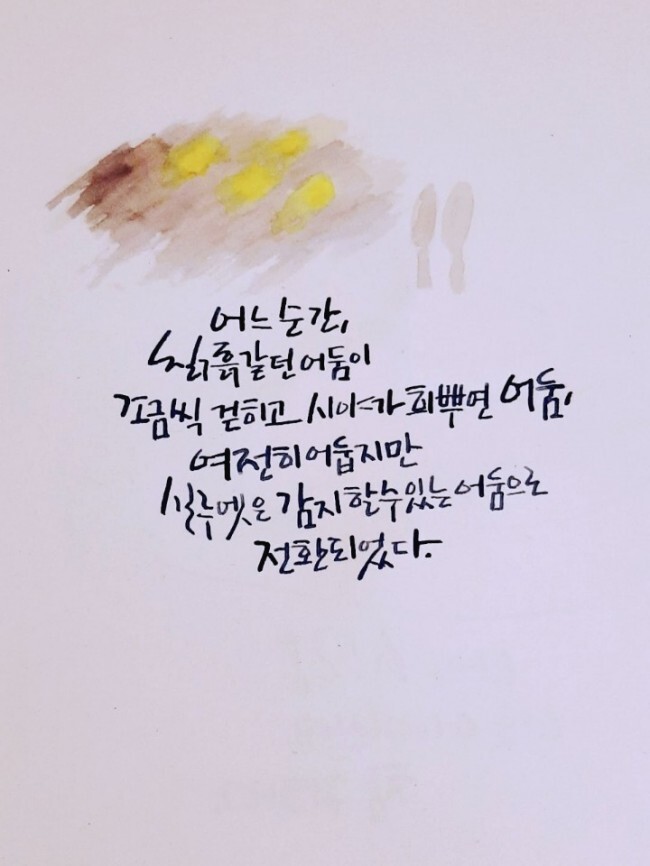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의 어둠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어두운 날이 계속되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손으로 더듬어보기조차 무서운 날이 어둠이 내 눈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 어둠조차 가만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실루엣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내 눈은, 내 마음은, 어떤 어둠이라도 다시 그 어둠에 맞춰 그 어둠이 주는 한계 속에서 어둠을 지나갈만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아침이 언제든 다시 올 것이며 아침이 오면 또 전날의 어둠이 몰고 온 불안과 걱정을 흩어진 자리에 새로운 마음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그날 그렇게 알았다.
전에도 알았지만 그때만큼 더 절실히 실감한 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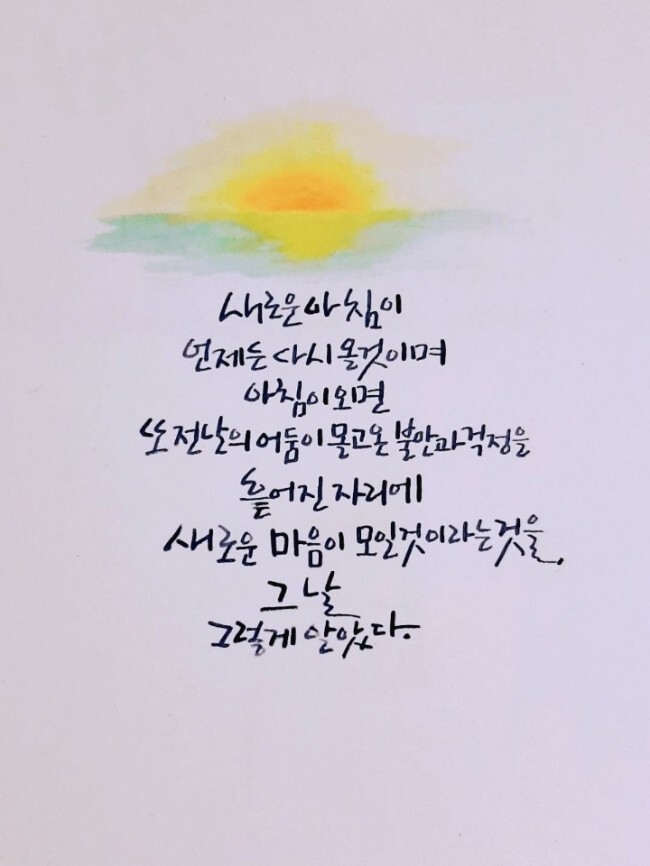
아이들 사이에 내 몸을 밀어 넣고 아이들의 보송보송한 따스함을 느끼며 어둠조차 잘 들여다보면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간직하며 잠을 청했다. 그렇게 나를 믿고 세상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
그러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싶기도 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이미 선택한 것이라면 역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어둠이 더 뿌연 어둠이 될 때까지
뿌연 어둠이 희미한 밝음으로 전환될 때까지
마음을 모으며 심호흡을 하며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 그것 말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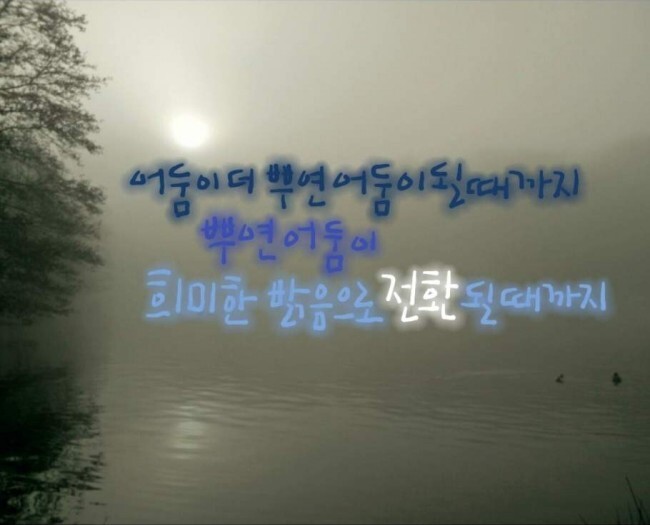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4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