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안남
선안남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선안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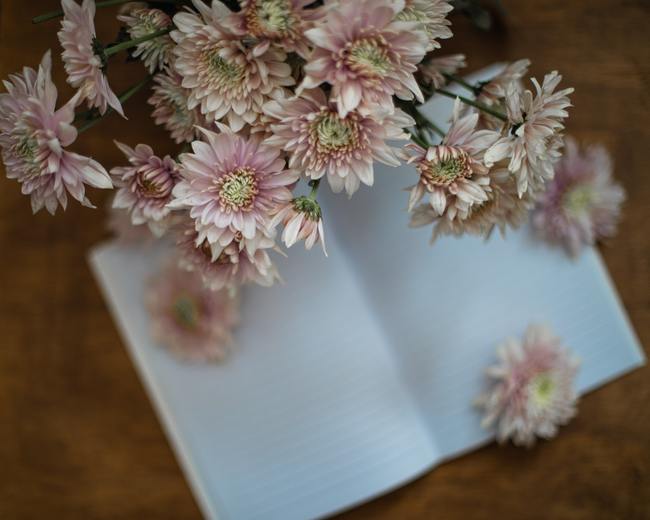
1.
처음 상담자 수련을 받을 시기, 첫 내담자를 만나고 첫 회기, 그 뒤에 이어지는 그다음 회기를 무사히 마치고 두 번째 내담자를 만나며 회기를 쌓아가면서, 이런저런 불안에 시달렸다.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온갖 것에 깜짝깜짝 놀라며 긴장하는 것처럼 긴장감이 계속되었다.
'처음이라 그래'라고 위안하기에는
이 시기가 꽤 오래갔다.
2.
처음 작가로 데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작가님'이라 부를 때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불안과 분열의 파장이 있었다.
'내가? 정말 작가인가? 글만 쓰면 작가인가? 책을 내면 작가인가?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으면 작가인가?'
문제는 이 역시 '처음이라 그래'로 덮을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15권을 출간했음에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의혹에 시달릴 때가 있다.
3.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에는 양상이 조금은 달랐다. 엄마가 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내가 엄마임을 증명하는 꼬물꼬물 한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으므로 내가 엄마라는 사실에 대한 분열 감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 '수행'에 있어서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따닥따닥 부딪치게 되는 면이 있었다. 엄마의 자리는 뜨거운 자리였고 나는 자주 아귀가 꼭 맞지 않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바쁘게 어디론가 향해야 하는 것처럼 종종거렸다.
4.
이 모든 마음을 '가면 증후군 imposter syndrome' 아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다.
가면 증후군은 어쩌면 나는 가짜인데 진짜 인척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져오는 마음의 불협화음이자, 진짜에 도달하지 못하는 듯한 자격미달의 느낌이다.
세상의 모든 초심자들이 가지기 쉬운 마음이기도 하다
특히 내적 기준이 높은 사람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냉정하고 혹독한 목소리들이 이런 마음의 불안과 분열을 불러오는데, 상담자이자 작가이자 엄마이기도 한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척'인 듯한 느낌과 오래 함께 해온 것이다.
'가면 증후군'이라고 간단하게 분류하기는 했지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일이라 쉽게 이름붙이 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용어의 테두리 내에 넣지 못하는 다른 마음들 역시 많다.
5.
그럼에도,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에서 나는 두 가지 희망을 보게 되는데
(희망을 적어보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희망
둘째, 증상의 전복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희망
이름이 있다는 것,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이 마음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
우리 마음에 떠도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인 지점을 시작점으로 활용을 고민해보는 행위는 그래서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심리 치료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무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6.
초심 상담자가 유연하고 노련하다면 이상한 일이다. 초심 상담자뿐 아니라 어떤 전문적 발달 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담자라도 '자기 의혹'과 '자기 분열 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모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라면 어쩌면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 의혹을 느끼기에 고민하고, 자기 분열을 통해 연결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의혹과 자기 분열의 구멍은 자기 안에만 갇히지 않을 가능성의 통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바라볼 통로로 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노련하고 단단한 전문가보다 흔들리며 혼란을 뚫고 나아가는 상담자가 더 나은 상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한다.
타자의 마음에 가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타자의 마음을 온전히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모든 '척'의 시기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 불안은 타자의 마음에 닿기 위한 안간힘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확한 공감' 만큼이나 정확한 공감을 하기 위해 애쓰는 진심에 '이미 그걸로 되었다'라는 말을 돌려주곤 한다. 서투른 공감의 시도, '척'의 시간을 한 걸음씩 쌓아 가다 보면, 분열 감, 불안과 의혹의 무게는 점점 더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
경험만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은 꾸준함이니까.
7.
수시로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느끼는 분열에도 희망과 소망이 피어난다.
엄마인 내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엄마인 나'와 '엄마가 아닌 나' 사이에서 수시로 분열되는 일이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며 덜컹 거리는 일상이었다.
자주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 간극을 이을 방법을 찾았다.
이제 나는
'엄마인 나'를 '엄마가 아닌 나'에 활용하며,
'엄마가 아닌 나'를 '엄마인 나'에 적용한다.
이 둘이 꼭 따로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덜컹거리며 '가긴 가게 될 것'을 더 믿는다.
또 그러다가,
엄마로 버티기 너무 힘들 때는
엄마인 척하면서 버티기로 한다.
엄마인 척 해도 엄마는 엄마고
엄마인 척하다 보면
결국 더 나다운 엄마, 엄마다운 나가 되므로
8.
작가로서는 이 모든 불안을 전복적으로 활용한다. 자격미달의 불안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그래도) 매일 쓴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쓴다.
'작가'는 명사이지만 결국에는 동사라는 생각을 한다.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부담도 적어지고 자유로워진다.
쓰는 행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쓰면서 부담과 불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면
'척'의 시간은 매일 지나가는 '행위'가 된다.
초고를 고치고 또 고친다.
고치고 몇 년이 지나고도
또 글이 생각나면 또 고친다.
피드백을 받고 나면 또 한 번 더 읽어본다.
출간을 하고 난 후라도 내용을 또 고친다.
그렇게 고쳐가며 진짜에 더 가까워간다.
초고와 최종 편집본 사이, 그중 진짜는 최종 편집본에 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매일 쓰는 기회를 나에게 준다.
계속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나 임을 실감할 기회를
매일 나에게 줄 수 있다.
9.
결국, 상담자로서도 작가로서도 엄마로서도 지나온
이 모든 마음의 분열과 불안과 부담감을 활용하기 위해 동원해온 모든 마음 장치들은 다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Fake it until you make it
Make it until you become it'
그런 척하다 보면 그럭저럭 잘하게 될 걸.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너 자신이 될 걸.
'척'의 시간이란 꿈꾸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서툴고 어설픈 시간 동안,
외적 기준은 물론 내적 기준에도 압도되지 않고,
이를 전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 순간 고민하다.
내가 나 자신과 불화하지 않고
내가 나와 더 친해지기를,
내가 비로소 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꾸며
매일 행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5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