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이지현
[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pixabay
@pixabay
참 재미난 논쟁이 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일까? 사랑은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떨림을 느끼는 것일까? 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의 견해 또한 갈리지만, 분명 사랑에 있어 호르몬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관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감정들이 어떠한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심장을 뛰게 하는 호르몬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친숙하게 느낄 것 같다. 이 호르몬들은 크게 보면 ‘신경전달물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흥분과 억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집중력, 신경과민, 불면, 떨림, 두려움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사랑에 빠지는 초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페닐에틸아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사랑의 열정의 들뜬 상태가 된다. 이들은 흥분과 기쁨을 주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금지약물을 복용할 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이 호르몬들은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콩깍지’를 씌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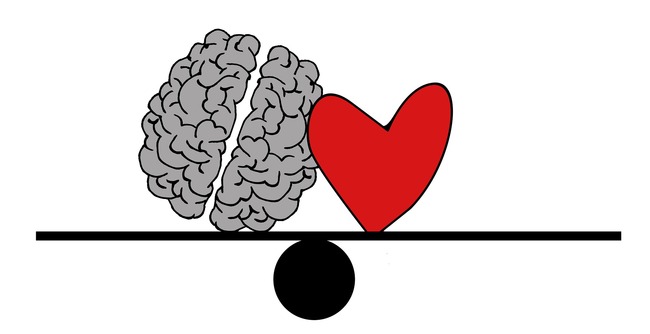 @pixabay
@pixabay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과 더불어 세로토닌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초기 도파민 분비가 클 때는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사랑이 지속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는 흥분보다는 평온암과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의 재미난 견해는 ‘호르몬이 외도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된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과 특히 바소프레신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을 사랑이 시작된 이후 애착 단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사회적 신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 상대에 대한 신경회로를 형성해 안정적 사랑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전 미국 국립 정신건강연구소장 토마스 인셀 박사는 초원 들쥐와 산악 들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일부일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원 들쥐는 교미들 계속하는 산악 들쥐에 비해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악 쥐들에게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주입하였더니, 그들도 일부일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은 ‘일부일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unsplash
@unsplash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냐고 묻는다면 물론 여기에는 ‘네’와 ‘아니오’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수없이 존재하기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의 평생 동반자를 원하며 찾으려고 한다. ‘평생’이라는 단어를 진짜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게 가능한 이들 또한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연인 관계의 최종 목표를 ‘우정 같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호르몬만으로 인간 사랑의 행위를 설명하기는 부족하겠지만, 평생 뜨거운 사랑이 어렵다는 건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기에 이들의 연구와 주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과 동반되는 화학물질들이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또는 그저 부산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행동들이 이러한 호르몬들의 작용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감성적으로만 대하던 사랑이 이러한 화학적 반응의 결과라는 것이 결코 사랑의 가치를 줄어들게 하지는 않는다. 과학적 사실은 그저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환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앎과 주체적인 선택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원종우 과학 전문 집필자는 말한다. 머리가 먼저인지, 가슴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에 대해 과학적 견해를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 않은가?
<참고>
원종우, 이소희.(2018).과학이 설명하는 사랑의 유효기간.월간 샘터,(),54-56.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는 무엇이 다른가”, 「한겨레신문」, 2016년 11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0040.html
유 퀴즈 온 더 블럭. (2022) 142회,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 편.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622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622

iz@yonsei.ac.kr
최근에 뇌과학자 분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생리적 현상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참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의 관계들과, 믿음 의지로 이어지는 인간의 관계를 보면 참 신기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정말 무수한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