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김주원
[The Psychology Times=김주원 ]

혹자가 ‘죽고 싶다 근데 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이해가 되는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면 그에 말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이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여 설명했는데, 하나는 죽음충동이며 하나는 삶의 충동이다. 죽음충동은 자신을 공격하여 종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힘을 의미하며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파괴의 본능은 곧 죽음충동을 의미한다. 삶의 충동은 생존을 향한 모든 본능을 가리킨다. 인간의 본성인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며 동시에 서로 충돌한다. 삶의 충동이 죽음 충동보다 우세할 때는 정신적인 행위를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죽음 충동이 삶의 충동보다 우세할 때 칩거를 하거나 슬럼프를 겪게 된다. 이것이 지속될 때 인간은 종국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 따라서 생명의 출현은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향한 노력이다. 삶 자체란 이 두 가지 노력 사이의 투쟁과 타협이다. 삶의 목적과 의도는 이중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목적은 삶의 연속일 수도, 죽음일 수도 있다. “ (Das Ich und das Es. GW 13. 269)
프로이트는 저서 『자아와 이드』 를 통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한다. 삶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추구하는 이중성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다. 삶이 힘들 때는 힘든 것만 보이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듯이 삶의 충동이 우세할 때는 삶의 충동으로 가득한 삶을, 죽음 충동이 우세할 때는 죽음 충동이 삶의 전부로 보인다. 죽음충동이 우세한 삶은 인간에게 해롭다. 그러나 죽음충동은 인간 본연의 본성이기에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로 방출시킬 수는 있는데,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가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발전하려면, 각 세포에 내재하는 죽음의 충동을 중성화하고, 파괴적 충동을 특정한 기관의 매개를 통하여 외부세계로 전향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이 기관은 근육일 것이다. 죽음 본능은,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부 세계와 여타의 생명체를 향하여 파괴 충동으로 분출된다.” (Das Ich und das Es. GW 13. 269)
프로이트는 근육의 사용을 통해서 죽음충동, 파괴성 방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운동을 통한 파괴성 방출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죽음충동을 방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침잠하는 시간들을 겪어보며 깨달았다. 죽음충동이 나를 집어삼키는 시기에는 끝도 없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영원 속에 서있는 것처럼 순간순간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혹은 어둠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음이고,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은 삶이라고. 그러니 한 번 버텨보자고! 프로이트가 주장했듯이 “삶 자체란 이 두 가지 노력 사이의 투쟁과 타협”이기에.
지난기사
참고문헌
Freud,S.(1923), ”the Ego and the Id”, standard edition of. 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 London:Vintage Books.
이수진. (2020).정신분석 미술치료.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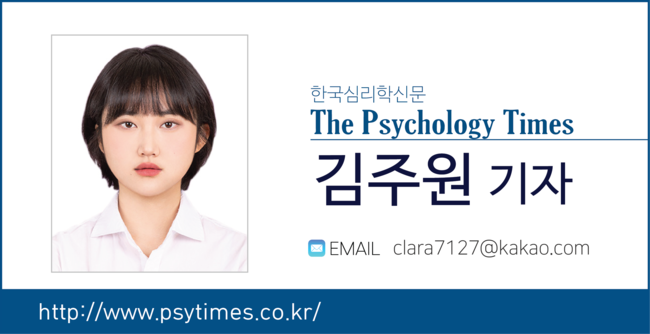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925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