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The Psychology Times=이소연 ]
소설 속에서 나는 타자의 시간과 감정에 잠식된다. 문장과 머릿속 이미지의 결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공간은 현실을 찢고 들어와 또 다른 현실처럼 자리 잡고 있다. 비현실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 존재하기를 고집부린다. 이미 삶은 그 자체로 상상에 불과하므로.
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살아낸다. 이렇게라도 존재에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라도 물질 속에서 환락을 탐하고 변화를 느껴내기 위해.
소설을 쓴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아래에 고개를 묻고 있었을까 싶다. 그리고 이 물질세계를 만들어 낸 이들 또한 같은 창작의 고통을 느꼈으리라. 희망과 몰락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 선과 악이 만나야만 하는 세상. 악이 날뛰어야만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나는 종종 본다. 희망도, 미래도, 변화도, 쾌락도, 감각도, 시간조차도 무엇도 없는 세상. 우리는 그곳에서 왔다. 이곳에 악이 덮치고 고통이 일렁여도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보다는 나으니까. 적어도 더 나은 상황을 설계할 수는 있으니까. 피로 엮인 공동체로 애정과 책임감을 겪고, 그들과 함께 노력이라도 해 볼 수 있으니까.

아기가 숨을 쉰다. 아기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엄마가 있다. 엄마 안에서 아기는 평온을 찾는다. 엄마가 없는 불안의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다시 만난 엄마 안에서, 아기는 전보다 더 강한 안도감을 느낀다. 감정은 변곡점의 높낮이가 클수록 증폭된다. 그렇게 물질세계의 창조자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냈다. 잠시, 상대적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불안을 느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상대성은 감정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장'을 통해 얻는 성취에도 깃들어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좀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더 많이 알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음을 향한 변화는 죽음이라는 끝으로 달려간다. 신은, 삶에 죽음이라는 한계를 두어 찰나의 시간들을 밀도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해진다. 시작점에 서 있는 인간들이 삶의 기회를 헛되이 저버리지 않도록 보내는 메시지다.
뻔히 보이는 메시지조차 깨닫기를,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병들어 늙음은 요양원에 집합체로 가두어둔다. 생명은 호흡기에 매달아 연장한다. 호흡기는 돈을 매달고, 병원은 그 돈을 집어삼킨다. 죽음을 연장할수록 젊음은 좀 더 쉽게 소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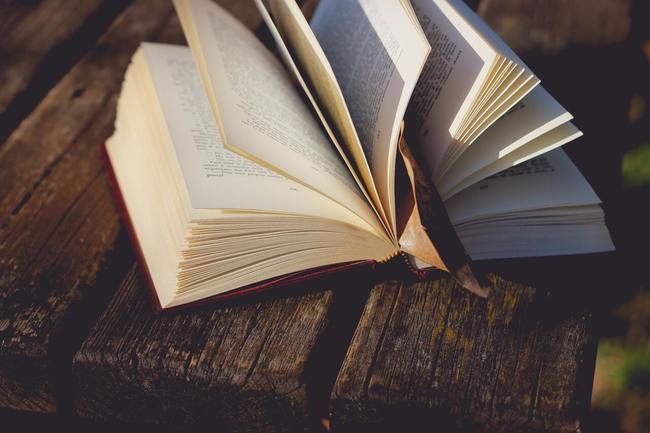
소설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나락을 간접 경험한다. 어두운 세계를 그려 현실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춘다.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나는 소설을 읽는다. 더 씩씩하게 현실로 돌아오고 싶을 때 소설을 읽는다. 소설의 어두움에 몰입되어 있다 고개 들어 마주친 현실은 반짝인다.
한 때, 아니 오랫동안 사는 내내, 죽음이 나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언제 죽어야 혼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다. (잘) 죽는 것이 목표인 인생이었다. 사십 대의 눈으로 둘째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알아버렸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이 순간들을 위해 결국 나는 다시 돌아오고 말 것임을. 고요한 멈춤의 상태에서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임을.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결국 실험실의 많은 변수들 중 일부에 불과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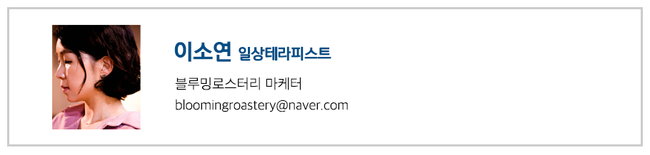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077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