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치
신치
[The Psychology Times=신치 ]
2012년 가을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바타는 무뎌진 ‘느낌’을 되살려 스스로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준 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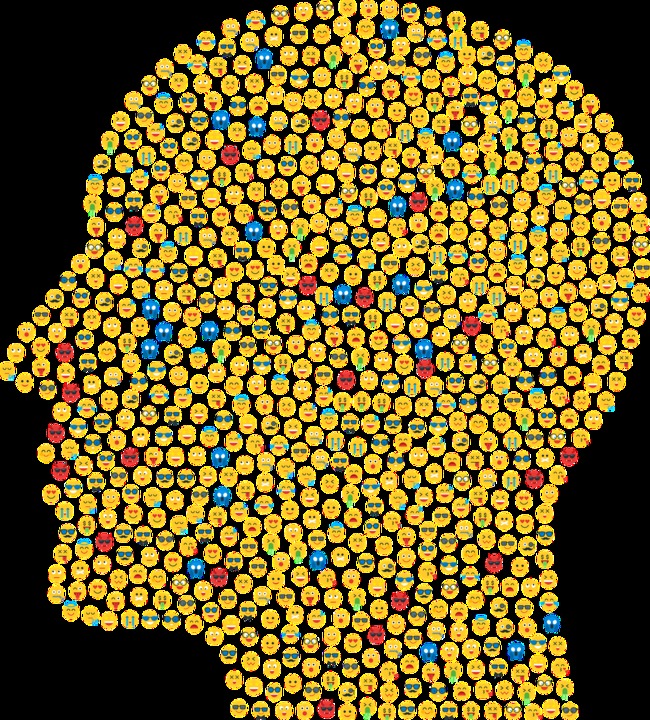
아바타에 참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 있었던 분노와 화의 감정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이후에 담배 피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하루 한 개비까지 끊을 수는 없었다.
2012년 겨울
그다음에 알게 된 명상은 원네스였다. 원네스는 오프라인 모임도 있었지만, 온라인 상에서 주로 진행했다. 영상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응시한다는 표현이 맞으려나. 온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명상 모임에 참여했다. 명상 덕분에 실험하는 아이디어 컴퍼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부산에서 하는 원네스 큰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법을 아주 열심히 따라 했다.

호흡은 거친 형태의 마음이다. 마음은 죽기 전까지 육체 안에서 호흡을 유지하며, 죽음과 동시에 호흡을 가지고 가버린다. 따라서 호흡 조절 훈련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 라마나 마하리쉬 <나는 누구인가> 중
원네스를 하면서도 역시 마지막 담배 한 개비는 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무언가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원네스 명상에서도 채워주지 못했다.
2013년 3월 어느 아침
독립한 나만의 공간에서 ‘데이빗 린치’ 감독의 데이빗 린치의 <빨간 방>을 읽었다.
행복이 자기 내부에, 만족이 자기 내부에, 빛이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요기고 브라만과 하나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신적인 의식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 바가바드기타
첫 명상이란 제목의 챕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명상에 대해 들었을 때 난 전혀 관심이 없었다. 호기심조차 없었다. 명상이란 그저 시간 낭비처럼 보였다. 그런데 나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부에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명상에 관심을 두게 됐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치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내부’가 어디인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고 당장 "초월 명상법"을 찾았다.
눈을 감고 나의 몸은 우주에 눈 앞 벽에 작은 검은색 점을 만들어 지구점이라 이름 붙인다. 매일 아침 10-20분씩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들도 모조리. 떠올린 기억들을 곱씹어본 후에 멀리 지구점으로 버린다. 그렇게 하나씩 현재의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나간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괴로운 기억을 떠올려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기억 하나를 지우고 나면 왠지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다. 몇 주간 거의 매일 하다가 이번 주는 오늘 처음으로 명상을 했다. 명상을 끝내고 드는 생각. '기억이란 놈. 지워도 지워도 끝없이 나오는구나.' 초월 명상법도 내가 찾던 무언가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데이빗 린치가 얘기한 '내부'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다. 그걸 찾으려면 왠지 계속 명상을 해야 할 것 같았다.
2013년 여름 그리고 2014년 봄
2013년 여름에 친구를 따라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스님의 법회에 참석하였다. 그때 스님이 지도해 주시는대로 50분간 명상을 했었다.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그 50분의 시간 동안 나는 평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요함’을 맛보았다. 명상 시간은 마치 짠 바다가 전부인 곳에서 여러 달을 헤매다 만난 한 모금의 맑은 물과 같았다.

2013년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 있던 나는 제주도에서 3달의 휴식기를 보내고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제주의 자연 속에서 가졌던 편안함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 복잡한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늘 손님이 오는지 계속 출입문을 향해 신경을 써야 했고 한시도 고요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금이나마 한가한 시간에는 늘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 작업을 해야 했다. 당시 내 상태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산란함'이었다. 그 산란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제주도로 가기 전에 친구의 소개로 갔던 명상이 생각났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원장님이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장님이 지도해 주시는대로 명상을 했는데 30분 만은 언제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함뿐이었다. 늘 산란함 속에 있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스님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이 30분의 명상 시간이 내게는 생명수와도 같았다. 명상을 하고 나면,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었고,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4년 봄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된 명상요가 지도자 수업 시간. 요가 동작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명상요가 이론이었지만, 첫 수업을 듣고 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찾아온 '나'를, 데이빗 린치가 얘기했던 ‘자기 내부’를 이 곳에서 찾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곳에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 눈에 띄는 변화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늘 구부정했던 어깨가 점차 펴지고 있는 것 그리고 2013년 여름 내 생에 처음으로 겪었던 불면증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점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111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