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다양한 호칭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관계의 그물망에 연결되어 가족 구성원으로 복잡하고 다면적 입장을 갖게 된다. 지영이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며느리이며, 26개월 된 딸 아영이 엄마이고, 지영이라고 불리는 딸이다. 남동생에게는 누나이고, 언니에게는 동생이다. 지영이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밥을 챙기고, 엉덩이와 무릎이 다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하루 종일 집안을 정돈하고 아이를 돌본다. 집안의 물건이 제자리에 그대로 유지되려면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 가사노동은 안 하면 확 티가 난다. 열심히 가사노동을 해도 집안은 그대로, 즉 현상 유지를 할 뿐이다. 노동력 대비 결과는 그럭저럭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의 삶이란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노동 기계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삶에서 자기 자신 혹은 한 개인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홍재희, <<비혼 1세대의 탄생>> 중에서
지영이의 하루는 가사노동과 육아로 지쳐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지영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취직을 하려고 한다. 지영이는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걸까.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지영이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 중 공분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 집에서 놀면서 뭘 하느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부들 자신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를 무의식 중에 내재화했다.
독박 육아로 우울증에 걸린 지영이가 친정엄마의 마음을 빌어서 남편에게 말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고 자주 좀 말하라고.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엄마니까, 아내니까, 여자가 가사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지영이가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 팀장은 중학생 아들을 두었다. 아들 양육은 할머니가 한다고 하자 남자 상사가 “엄마가 없으면 사춘기 때 어딘가 흠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힘들겠다고 빈정거린다. 요즘 여자에게 모성애를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인식하고 모성 강요 탈피를 시도하는 단계지만 아직 멀었다.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왜 여자가 집안일하고, 양육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나. 이러한 관습에 슈퍼 우먼이 되려고 했던 무수한 분투기가 있다. 지금도 슈퍼 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많다.
남자가 집안일을 챙기면 '도와준다'는 말을 한다. 같이 살아가는데 함께 해야지, 왜 도와주는 건가. 이런 뿌리 깊은 오해로 남편은 생색낸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구시대적 모토를 아직도 입에 올리는 남자도 있다.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유별나다고 말한다. 이 말속에는 다 그렇게 산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저렇게 지영이는 주눅이 들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지만 대부분 참고 견딘다.
지영이는 다행히 감정적 유대가 깊은 남편이 있다. 지영이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남편은 육아 휴직을 고려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친다. 시어머니는 남자 앞길 막는다고 말하고, 결국 지영이는 복직을 포기한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괜찮지만
때로는 벽을 돌면 또 다른 벽을 만나는 것 같다.
지영이가 한 말이다. 지영이는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이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우울감이나 화를 풀 방법을 몰랐다. 밖으로 나가려는 몸짓이 취직이었다. 워킹맘이 무게를 감당하려고 했지만 관습을 깰 수는 없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다. 더불어 자신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힘들이다. 지영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을 찾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자신을 인정하는 이야기. 박미라 작가가 쓴 ≪치유하는 글쓰기≫에서 넋두리 같은 글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들은 주류가 인정하는 글 이외의 글들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됐고 자존감을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책이 나왔을 때 반향은 엄청났다. 또 ‘다른 지영이’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회적 담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병을 알고 정신과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말한다. "여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제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치료는 성공적이에요."
여자라면, 엄마라면, 아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도 아니다. 우울과 화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지 모른다. 자신의 우울과 화를 인정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지영이에게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지영이가 의사와 마주 앉은 건,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보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영이는 취직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우울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모두 지영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통해 새의 눈물만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에 기뻐한다. 어떤 역할을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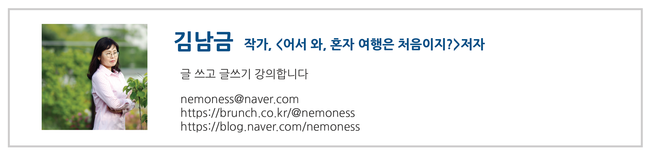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864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