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연애와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지만
비혼의 중년으로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환상은 거의 없다. 어딘가에 운명적 인연이 아직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안 한다. 연애는 매일 심쿵 하는 이벤트로 채워질 거라는 환상을 품기에 나는 너무 늙었다. 연애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인데 체력도 딸리고 의지도 부족하다. 결혼 생활은 성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살 배우자는 교감이 있으면 좋겠지만 교감을 나누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만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평소에 살갑지 않아도 힘들 때만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 배우자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 믿음이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며...힘들 때 배려하고 곁을 지켜줘야 할 배우자가 필요한 순간에 외면해서 소외감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으면 마음은 더 크게 다친다.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바로 <인생 후르츠>의 노부부의 모습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반려자'로 성실하게 살아간다. 삼 시 세 끼를 따뜻한 밥을 정성껏 차려서 맛있게 먹고, 마당을 두 사람만의 숲으로 가꾼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때로는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늙어가는 일이다. '오손도손'하다는 말은 이 노부부에게 정확한 표현이다. "머리가 파뿌리"가 되어 듬성한 부부는 5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50종의 꽃과 70종의 채소를 심고, 물을 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린다. 90세 츠바타 슈이치 할아버지와 87세 츠바하 히데코 할머니는 65년을 함께 살았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출가 시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과거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노인이 되어 오롯이 두 사람만 남았다.
만물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돌봄
할아버지가 하겠다는 일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할머니. 21세기 시선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순종적인 아내라고 삐딱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같은 반려자에 대한 배려를 굳이 비판적 시선으로 보고 싶지 않다. 부부 사이에 주도권 투쟁을 해서 누가 지배적 위치에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머니는 20세기 초반식 교육을 받고 따랐지만 그냥 순종만 했다면 <인생 후르츠>같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1세기 시선으로 답답할 수 있다. 21세기에 어떤 이는 평생동안 남편 밥을 차리고, 가사노동의 노예가 되길 거부하면서 '졸혼'을 하기도 한다. 할머니는 한 번쯤 졸혼을 꿈 꿀만도 한데 늘 미소를 지으며 밥을 짓는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일상의 힘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나아가 만물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할머니는 65년 동안 의견 충돌 없이 할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절친으로 살 수 있었다.
할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에 차리는과정이 여러 번 등장한다. 할머니는 토스트 한 쪽이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와 금방 한 밥을 매번 정성껏 차려낸다. 할머니는 감자를 안 먹는다. 할아버지의 최애 음식은 감자이다. 본인은 안 먹지만 반려자를 위해 감자 크로켓을 기꺼이 만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취향은 식성을 통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가진 기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할머니가 식사 준비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문하는 집을 가꾸는 소품들을 다 만들어 준다. 각자의 취향이 달라서 충돌하지 않고 다른 취향을 존중한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하면서 보완하는 지혜를, 노부부는 보여준다.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소박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눈물나게 아름다워보였다.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부의 가치관은 집안 구석구석에 배여있다. 땅을 건물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숲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각자의 집에 숲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이다. 새들이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옹달샘으로 쓰이는 수반을 만들어 놓는다. 새들은 지나가다 내려와 쉬면서 자연의 노래를 들려준다. 계절이 바뀌면 문 창호지를 새로 바른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면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린다. 열매는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노부부는 '주고받는' 자연의 섭리를 집을 가꾸는 일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행하고 있다.
세계관이 비슷한 부부의 낭만적 일상
상대가 준 만큼만 주겠다는 옹졸함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또 내 것이니까 최대 효율을 따지면서 능률에 집착하면 마음이 병든다. 할아버지의 유작일 수 있는 동네에 새로 생길 정신병원 설계는 두 사람의 인생관을 담아낸다. 경제 중심 사회에서 마음이 지친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땅 한쪽에만 병동을 짓고, 나머지 공간을 계절별 과실수를 심으라는 할아버지의 설계. 병원을 짓는 중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는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영원히 잠든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할머니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작별인사를 나눈다.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할아버지의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낸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할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고 건축 중인 병원에 찾아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건축 계획은 곧 할머니의 생활 방식에서 나온 시선과도 같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은 할머니와 병원 건축에 대해 상의를 하곤한다.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했지만 인생을 함께 헤치면서 살았던 시선은 완전히 하나였던 부부. 이들의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일은 별로 없이 평온하는 말이 어울린다. 하지만 이 평온이야말로 미친듯한 속도를 지닌 도시인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어서 부부로 사는 삶에 대한 환상을 품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일이 훨씬 가속될 것이다. 비대면, 비접촉을 기반으로 차가운 로봇 속에서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면서 차가움을 친구 삼을지, 노부부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서 느리지만 정서가 숨 쉴 수 있는 아날로그식 삶으로 돌아갈지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지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열린다.
차근차근,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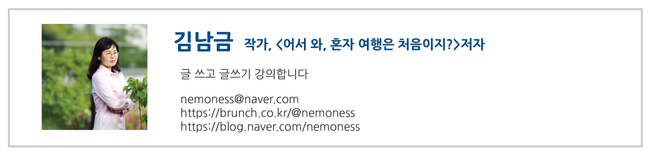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86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4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