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름
이해름
[The Psychology Times=이해름 ]
'학자금 대출 중이거나 대출 후 갚지 못한 성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이상이나 더 크다.' 애덤 리퍼트 콜로라도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에서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발표한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은 이달의 추천 책으로 들고 온 아래 도서에서 가장 마음 아픈 요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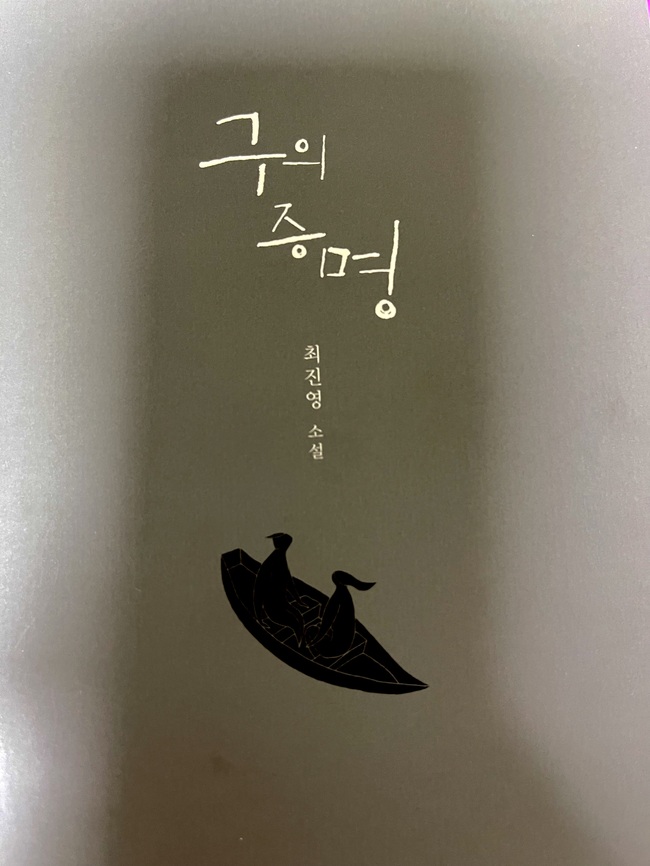
내던져진 채 성인이 된 주인공들, 가난한 삶, 그래서 더욱 궁핍해지는 마음들.
구와 담이 사는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진 것 같은”(93p) 길바닥이었다.
돈이 부족해서, 보호자가 없어서.
이 책에서는 구와 담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인간이 물건 취급 받는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소설에서만 강조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에서도 보호자 아래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은 빚더미 아래에서 겨우 살아간다.
작가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요즘 세상에 빚내서 학교에 다니고 집을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내가 보기엔 활활 타는 불덩이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다. 지금 생활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한 생각도 녹였다”고 밝혔다.
최진영 작가의 소설, 『구의 증명』 은 구의 죽음으로 시작해 구의 죽음으로 그를 증명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빚의 장치
구와 담의 사랑이 더욱 절절 해지는 이유일까?
최진영 작가는 우리의 현실을 소설 속에 적절히 이용했다. 출구가 없는 삶. ‘물려받은 세계’(149p), 그 안에서 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덕지덕지 질퍽한 소매로 얼굴을 닦아내면 결국 모든 곳이 질퍽거려지는 것처럼. 구는 그저 내던져진 착취의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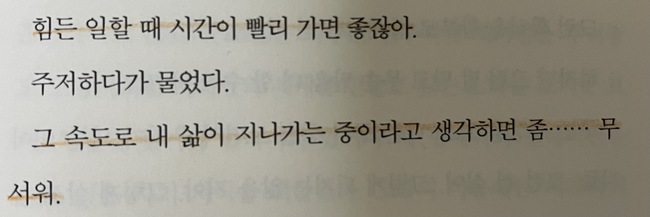 최진영, 『구의 증명』 67p, 은행나무, 2015구의 삶은 얼마나 빨랐던 것일까?
최진영, 『구의 증명』 67p, 은행나무, 2015구의 삶은 얼마나 빨랐던 것일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조차 참고 살았다. 그 질문이 불러오는 온갖 감정을 참고 살았다.’ (90p)
공장에서 만난 누나와 구의 이야기, 꿈도 없이 불어나는 빚만 갚기에도 급박한 아이의 삶을 보여준다.
"우린 헤어져야 더 잘 살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빚 더미 속에서 구가 담에게 던진 말이다. 그래서 구는 사랑하는 담에게 나가라고 했을까, 탈출구가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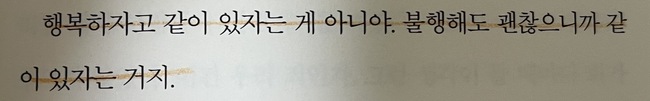 최진영, 『구의 증명』 151p, 은행나무, 2015
최진영, 『구의 증명』 151p, 은행나무, 2015
하지만 밀어내는 구에게 담은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의 전부였던 이모가 떠났고, 구와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이모를 보내줄 수 있었기에. 어린 담은 ‘이모를 얻은 것은 있는 행운을 다 쓴 것’(136P) 이라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삶이 담에게는 긁어모은 행운이었던 것이다.
-장례
담에게 그런 구인데, 그런 구가 죽었다. 사체업자에게 쫓기다가 길바닥에서 벌레처럼 죽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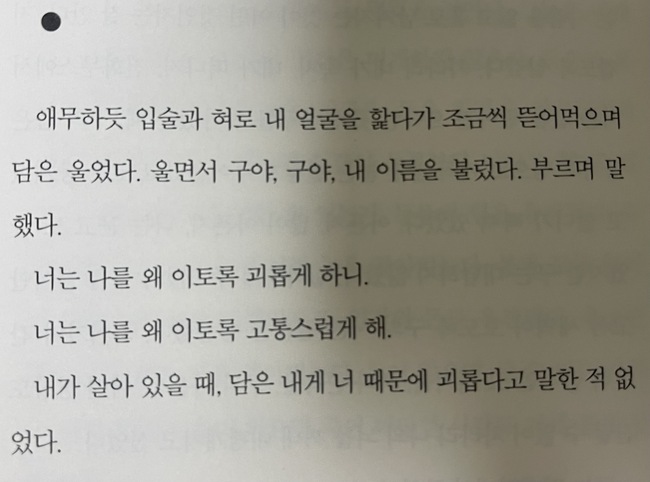 최진영, 『구의 증명』 166p, 은행나무, 2015
최진영, 『구의 증명』 166p, 은행나무, 2015
슬픔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우울증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실된 것과 자신을 동일화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틀에서 설명되는 구조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인 <쾌락 원칙을 넘어서> 에서는 슬픔이라는 작용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자아는 다시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보였다. 한편 우울의 세 가지 전제 조건 중 하나를 상실로 꼽았다. 상실한 대상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나르시시즘)으로 대상의 부재가 자아 상실로 전환되며 우울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분석틀로 보았을 때, 담이 구를 먹은 것은 사랑하는 그와 자신의 동일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분석대로라면 담은 우울증 증상의 길로 가야 하지만, 오히려 구의 상실은 담에게 생의 의지를 만들었다. 구를 먹은 담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게 사랑 아닌가요?
대게는 그렇게 뱉지만, 구와 담은 불행 마저도 함께하는 사랑을 택했다. 마지막까지 구를 먹어야만 했던 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 있다면, 학자금 대출로, 보호자의 부재로 출구 없는 삶을 허덕이는 존재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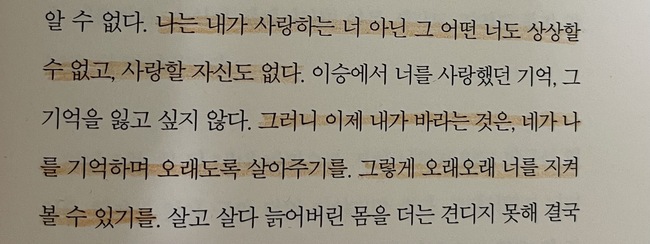 최진영, 『구의 증명』 173p, 은행나무, 2015
최진영, 『구의 증명』 173p, 은행나무, 2015
사람 먹는 이야기는 구를 먹을 수 밖에 없었던 담이와 그들의 가난한 삶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보호자의 부재, 학자금 대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그 속에서 틀어지고 살아났다가 꺼져버리는 사랑 이야기를 책 속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풀어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23년, 독자들이 이 달의 책을 통해, 구와 담을 통해 예민한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기사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575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5756

sunrise03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