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영
정세영
[The Psychology Times=정세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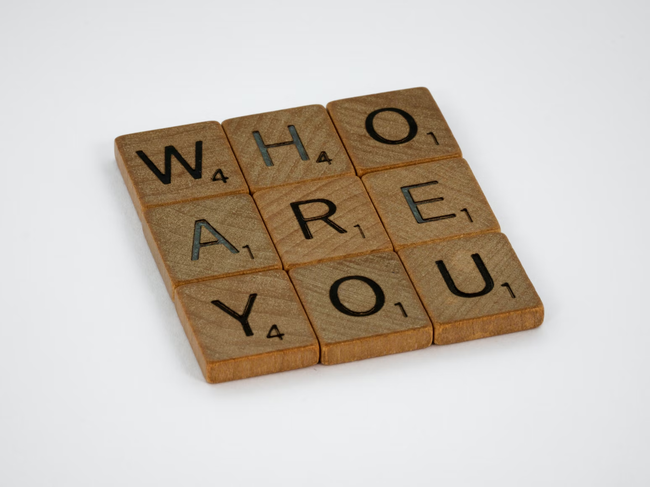
우리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격은 상황에 따라, 배정받은 역할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모양새를 살짝 바꾸기도 한다. 만약 인격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아예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 '모두 그곳에 있다'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모두 그곳에 있다’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 수연
'모두 그곳에 있다'의 주인공은 유수연과 유정연이라는 쌍둥이다. 수연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위축되어 살아가고, 그 반대로 정연은 당당하고 반항기 넘치는 삶을 산다.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자 수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고, 상담교사 강일영이 나타나 이를 막고 정연에게 수연을 대신해 복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정연은 수연 대신 학교에 나가 가해자를 응징하고, 수연이 당한 폭력을 그대로 되갚아준다.
극 중반까지 수연, 정연, 일영은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표현된다. 그러나 정연이 가해자들에게 수연이 아닌 자신에게 왜 그랬냐고 울부짖는 장면, 일영이 수연과 정연에게 너희는 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수연이 정연이라는 또 다른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임이 암시된다. 또한, 조사 과정 중 경찰이 강일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제공했던 일영의 존재마저 수연의 또 다른 자아인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수연과 같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들은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인격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자신감 없고 소심한 수연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인 정연의 협박과 폭력은 질병의 증상 중 하나로, 환자들이 인격이 바뀌면 원래의 인격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격이 바뀔 때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환자도 있으나 수연이 정연, 일영을 인식하고 복수를 꿈꿨던 것처럼 일부 인격은 다른 인격을 인지하고 상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인격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 환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환청을 듣거나 동시에 여러 목소리로 말을 하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 및 치료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 해당 장애는 대체로 아동기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에게 발생한다. 실제 환자들의 증상 발현 원인이 유년 시절 성폭행,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인 것처럼 어린 시절 겪은 심각한 충격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배드 앤 크레이지'의 모티브가 된 빌리 밀리건은 무려 2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빌리가 이러한 질병을 앓게 된 원인은 유년 시절 새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받은 큰 충격이 여러 개의 인격을 만드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수연처럼 단기간에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방어 기제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래 자아의 구조가 붕괴하며 다중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들은 타인과 계속해서 접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며 우울감과 같은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환 환자들은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약물, 상담, 전기 치료를 통해 질환과 함께 발현될 수 있는 우울증 및 조울증을 치료하고, 꾸준한 관찰을 통해 여러 개의 인격 중 하나가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 해당 질환이 계속해서 여러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는 만큼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완치되길 바란다.
지난기사
참고자료
권오상. (2019).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철학적 고찰 -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7, 160-17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5855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5855

sluvtoyou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