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자훈
김자훈
[The Psychology Times=김자훈 ]

많은 과업들을 수행하는 루틴이 일상이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쏜살같이 흐른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가며, 그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자신의 일상에 만족할 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소위 “중심” 을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필자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첫째가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나고,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감사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지금이 총각 때보다 2~3배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었고, 어쩌면 ‘나는 중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엄습할 때가 있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생물학적인 개체성의 유지, 즉 생존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쉬운 예로 풀어쓰자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시스템에 필자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속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의 발전에도 적응해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필자의 23년도 일상을 돌아보자면, 지난 1분기까지도 회사 업무들로 적잖게 바빴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개의치 않고 다양한 과업들을 묵묵히 소화했지만, 그 상황에서 회사와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 동시에 박사 졸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현실적으로는 졸업 논문 작업에 거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필자의 자책감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쁜 회사에서의 과업 수행, 즐겁고 감사한 가정생활, 그리고 박사 졸업이라는 3개의 목적 함수를 모두 저울질하다가 현실과 타협하였고, 더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내가 좀 더 스마트하고, 치밀했다면, 역량이 더 뛰어났다면 핸들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라는 ‘뭘 놓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물음이 내면에서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필자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거나, “자기 관찰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차근차근 처리하라”거나, “휴식과 자기 관리(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를 실천하라”라는 바람직하지만 교과서적인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틀린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전과 미션, 장·단기 목표를 깊은 성찰을 통해 부여잡고, 그 중심을 잡아나가는 전략은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러나 깊은 성찰을 통해 사유한 자신의 비전과 목표들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사실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취가 헛된 꿈에 불과했다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허무함에 이른바 “현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맞다고 여겼던 비전과 목표들이 지금에서야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혹은 역설적이게도 그 비전이나 미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깊은 공허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바쁘고 치열한 우리 일상의 틈을 때때로 파고드는 지독한 공허함,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안 드리고 싶다.
첫째, 유연한 자아개발, 유연한 마음 개발을 실천할 것.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986년 3월 26일 필자가 태어났을 때의 자아도 김자훈의 자아이고, 10살, 20살, 30살의 자아도 김자훈의 자아이다. 글을 쓰고 있는 만 37세의 자아도 나의 자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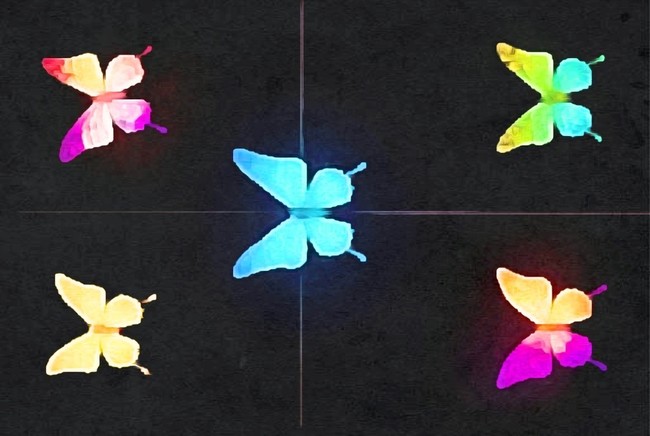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자아의식과 자아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었다.
삶에서는 예상치 못할 일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일들을 반응하고 대처하며 얼마든지 자아의식은 변할 수 있다.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고정된 자의식이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되, 고정된 자의식이 부러져 멘탈이 너덜너덜해지거나, 폐허가 되었을 때, 공허할 때, 그 허무함마저 용서하고 새로운 자의식으로 리모델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비를 실천할 것. 기본 전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늘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실수하기 마련이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만큼 타인의 잘못을 잊거나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부조리에 대한 분노심이 사라지고 자신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의미가 없으면 그 허무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라”

물론 필자 또한 능수능란한 듯이 고민하고 글을 써도, 늘 실천은 어렵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 깊이 용기와 지혜, 도움을 주십사 겸허하게 기도하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책 내용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모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가슴 뛰는 용기와 생의 의지와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함의 영원성을 간직하기를 진심을 담아 마음속 깊이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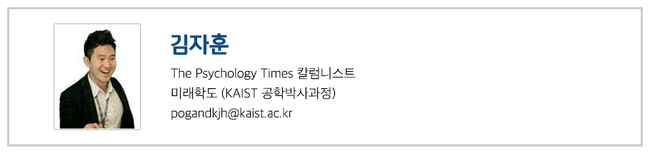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628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6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