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연
이해연
[The Psychology Times=이해연 ]
‘쓰는 기쁨’을 잔뜩 누렸던 것이 심꾸미 7기 활동으로 얻은 큰 수확이었다.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러나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기사의 형태로 쓰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느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이전보다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사 쓰기가 마냥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무엇을 쓸까’였다.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백할 때는 그나마 수월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당연히 있었고, 그럴 때는 무엇을 쓸지 정하지 못해 골몰하며 머리를 싸매야 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다. 일상을 살피는 일.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쳤던 것들에 ‘왜’를 던져보면 쓰고자 하는 바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썼던 기사들이 바로 ‘인생네컷으로 살펴보는 우리 인생’, ‘너도나도 쓰기 시작한 이것!?’, ‘아니 이 기사를 누가 읽음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와 같은 기사들이었다. 일상을 살피고 들여다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던 ‘나’와 ‘너’에 대해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우리는 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탐구했던 시간이었다. 그런 질문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깊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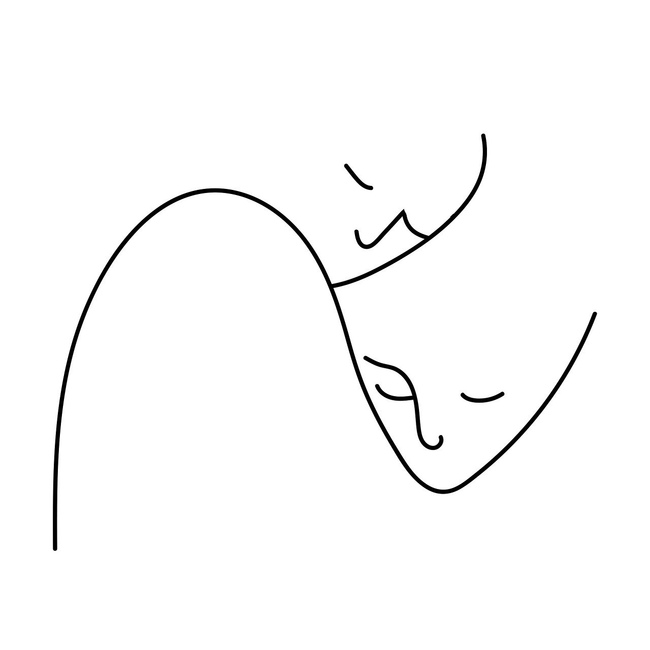
최근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일지 궁금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다시금 헤아려보고 있는 나 또한 말이다. 그간 기사에서 다루었던 어린이와 청소년,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MZ세대라고 명명한 사람들’ 등, 그들에게 던진 ‘왜’라는 질문 역시 내게 그들을 이해할 여지와 헤아릴 마음을 주었다. 아는 것은 힘이 된다. 심꾸미를 지원하며 자소서에서도 적었던 문장이다. 알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관점과 사유가 넓어지며 그것들이 나의 삶을, 나를 이루고 있는 타인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며 지속시킨다. 심꾸미 활동은 그것을 내게 다시금 확인시켜준, 일종의 확신을 선사해준 활동이었다. 어떤 날에는 광화문 글판에서 멋있는 문장을 발견했다.
‘올여름의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심꾸미 7기 활동이 끝나가는 올여름, 나는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조금은 알 거 같다. 그러니 올여름이 끝이 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영영 읽고 싶다.
지난기사
장순자 백반집 vs 윤율혜 백반집, 배가 고픈 당신의 선택은?!
아니 이 기사를 누가 읽음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694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6948

sunkite03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