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
이소연
[The Psychology Times=이소연 ]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 때문에 이 집구석에서 도망도 못 가!!"
상담심리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 입에서 나온 이 대사를 들었다. 어, 내가 어릴 때 매일 듣던 말인데.
세상에 저런 말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가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수업에서 전형적인 예시로 들만큼 흔한 예라는 사실이 경쾌하게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정서적 애착 유형에서 회피적 성향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 열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얼른 발을 뺀다. 늘 혼자만의 세상에서 발전적인 작업들을 하고자 애쓴다.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는다. 그래 봐야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학대일 뿐이니까.
지속적인 평가 절하와 거절을 당한 아이는 당연히 자기 가치가 낮아지고, 스스로 정한 낮은 자기 가치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칭찬을 받아도 거짓말 같고, 잘한 것이 있어도 부족해 보인다. 더더,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해내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린다.
 토닥토닥 괜찮아.
토닥토닥 괜찮아.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생각에 빠져 있던 중 교수님이 또 한 마디 던지셨다. 어, 이것도 매일 듣던 말이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들었다. 상담심리 수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문장을 들을수록 놀라웠다.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구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맞을 짓을 한 것’과 ‘때리는 행위’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맞아야 할 정도로 잘못을 했다 해도 그것이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지는 못한다고.
내 나이 마흔이 되어서까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 착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부하고 반추해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우울, 편집증, 분노조절장애, 불면, 가난, 히스테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 이해해주지 뭐, 하는 마음이 든다. (나 또한 정도는 덜하지만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다. 재미 삼아한 자가테스트에서 우울과 편집 성향이 나온 것을 보고 실소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때리는 것으로 감정을 해소하지는 않는다. 엄마가 내게 알려준 크나큰 교훈이랄까.)
내 엄마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신과 약물이라도 써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다. 그마저도 가난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리고 가난을 벗어난 지금, 엄마의 모든 정신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우스운 일이다. 돈만 좇지 말아야 하지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많다.
못 배워서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학력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못 배워서 그런 것인가, 하는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서울대-이대의 전형적인 (70년대)엘리트 커플이다. 학력이 무언가를 반영해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을 때 좀 더 빨리 이해하고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 같아서,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모든 것에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그럼 공부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고? 평생 공부해야 한다. 배우는 자세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엄마를 돌아올 수 있는 둥지 삼아, 아이들은 세상 탐험을 떠난다.
엄마를 돌아올 수 있는 둥지 삼아, 아이들은 세상 탐험을 떠난다.
오은영 박사가 유행시킨 애착 유형검사는
심리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애착 관련 검사가 애착 유형검사다. 요즘 성인 애착 유형검사가 유행이 되었다고 한다. 어릴 때 형성된 엄마,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도록 한다.
이 검사 결과로 사람들은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으로 나뉜다. 그럼 안정애착이 정상인가? 하는 질문에 일단은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애착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엄마의 사랑을 둥지 삼아, 위험에 닥치면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위험한 세상 탐험에 나선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의 눈으로 보자. 조던 스몰러는 [정상과 비정상의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학대당하는 상황이라면 관계에서 회피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태도라고 본다. 다가가면 학대당하고 거절당하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톱니바퀴를 벗어나는 일
회피적 관계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적응적인 관계 패턴이다.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관계 형성 방식이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반응 방식을 이해하고 바꾸는 것이다. 내게 영향을 미친 부모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불신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착취함으로써 방어하는 방식을 끊어내야만 한다. 그러한 관계의 톱니바퀴를 벗어나야만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의 첫 단추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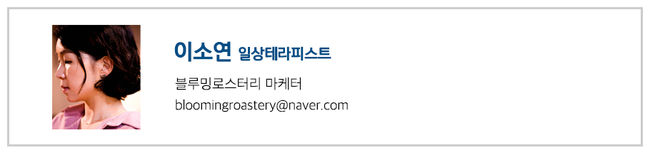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012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