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준
김이준
[The Psychology Times=김이준 ]

10년 전, 사람이 줄을 지어 바삐 지나가던 명동의 인파 속, 어린 자매가 있었다. 그저 쇼핑을 위한 나들이를 나온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자매에게는 남들에게서 쉬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던 휠체어였다.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매초 수없이 쏟아지는 호기심과 동정 섞인 시선은 무자비했고 그런 가시 돋친 세상을 감내하기엔 자매는 너무 어렸다. 집중되는 이목에 둘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고 언니는 ‘동정'이라는 이름의 스포트라이트에, 동생은 그 옆 그늘에 갇혀 옥죄여 오는 시간을 보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이야기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가? 휠체어에 오르게 된 언니의 삶인가, 아니면 언니 옆에 서 있던 동생의 시점인가? 대부분 전자의 사정을 궁금해할 것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언니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면 아쉽지만, 이 글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탄 언니 옆에 건강한 다리로 서 있던 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스포트라이트 옆 그늘에 위치한 비장애 형제의 심리와 고충을 담은 대중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그늘의 이야기: 비장애 형제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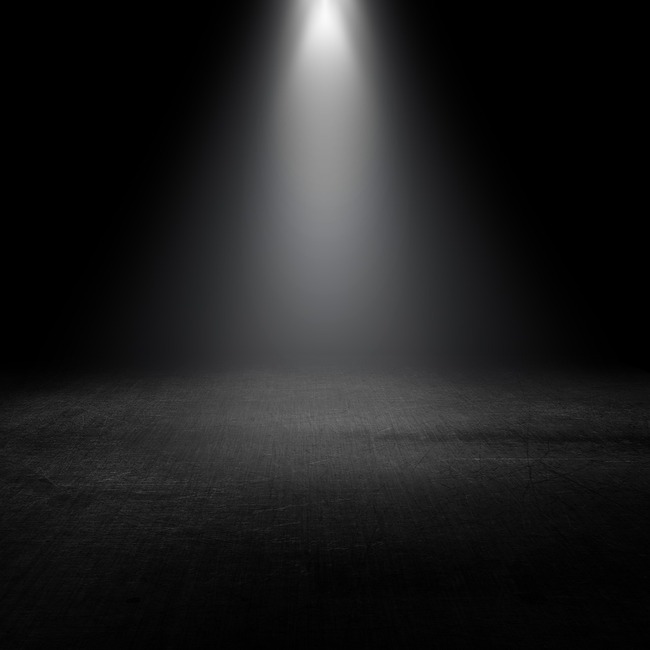
비장애 형제란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인’을 일컫는다. 누군가는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삶 혹은 책임져야 하는 삶이라고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 형제로 인해 마주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비장애 형제들은 심리 상태와 성격 형성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대게, 장애가 있는 형제에 대한 죄책감, 부모로 인한 소외감, 고립감, 과한 책임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남과 동시에 이해심과 인내심, 강한 독립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 또한 나타난다.
지적 장애 형제를 가진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비장애 형제들은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참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은 장애가 있는 형제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상황에 체념하며 자신을 맞추는 태도가 대인 관계에서도 투영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장애 형제와의 삶에서 터득한 돌봄 성향과 더불어 개인차에 대한 공감과 인내심이 발달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을 띈다고 발견되었다. 특히, 높은 돌봄 성향은 가족을 넘어 타인에게도 적용되어 비장애 형제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장애 형제 중 상당수가 상담학, 특수 교육, 사회사업학 등을 전공하고 남을 돕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게, 부모님으로부터 장애 형제의 돌봄 역할을 무언중에 부과받음으로써 부모님의 힘든 심정을 이해하면서 자신들로 인한 걱정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비장애 형제의 심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초반부에 소개되었던 자매의 이야기 속 동생에게 비장애 형제의 삶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성취보단 정서적인 포기를 먼저 배운 삶이었다고 했다. 어떤 말이 가장 싫었냐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래도 가족인데…’, ‘너까지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변인의 소리가 너무 싫었지만, 어느새 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가장 싫었다는 대답과 함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 그의 어릴 적, 언니의 수술 때문에 다른 집에 맡겨져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다. 5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에 커튼 뒤에 숨어 부모님과 통화가 연결된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더듬더듬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나는 괜찮아. 언니에게 더 신경 써줘도 돼. 나는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도 괜찮아.’
정말 괜찮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필자는, 아니 비장애 형제인 우리는 일찍 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고문 같은 시간 속에서 나라도 부모님의 기쁨 내지 위안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비장애 형제이지만 동시에 한사람
'나'라는 존재와 ‘비장애 형제’의 역할 사이에 괴리감을 호소하는 비장애 형제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2016년 비장애 형제를 돕는 모임 ‘나는’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소모임과 정기 모임을 운영하여 비장애 형제들의 어려움과 고민, 아픔을 쓰다듬는 단체이다. 그들이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1. 본연의 자아와 '비장애 형제'로서의 자아를 조화시키자.
2.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아라.
3.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장애 형제나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그들이 대중과 비장애 형제들에게 하는 호소는, 비장애 형제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혹은 ‘혼자서도 씩씩한 애어른’이 아닌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가올 내일엔 비장애 형제를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 그저 남들과 같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한 사람으로 대해줄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최복천, 김유리, 박현수, &임수경. (2014). 비장애형제자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978-89-6921-183-5 93330
조민경, 강영심, & 손성화. (2019). 발달장애를 지닌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비장애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4(2). https://doi.org/10.26592/ksie.2019.14.2.151
김다혜, &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5), 357–375.
전채은. (2021년 10월 26일). 장애 형제 곁에서 ‘착한 아이’로 살아야 하는… “비장애 형제들 마음의 상처 함께 치유.” 동아일보. 2023년 7월 10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1026/109907053/1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05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050

yijunkim@b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