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진
이유진
[The Psychology Times=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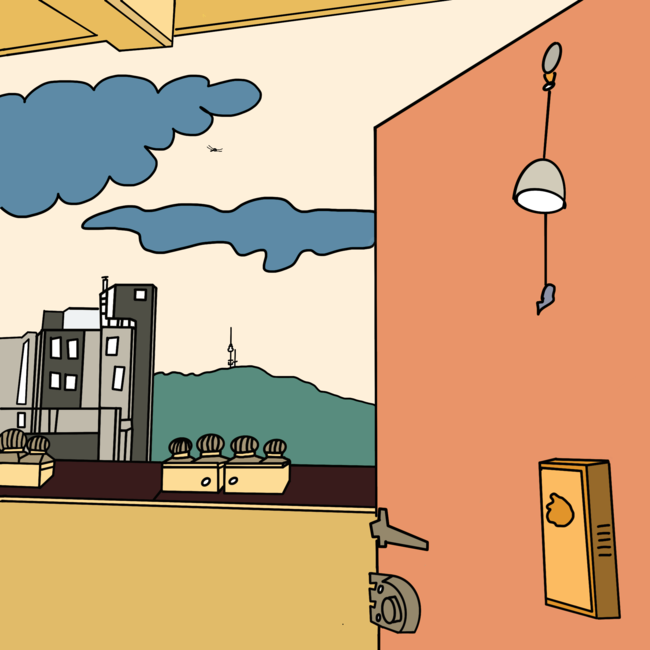
사진 출처 : 이유진 기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 주위에 이 줄임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확행’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행복하다’라는 말보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 단순 줄임말의 개념을 넘어 이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사회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소확행’은 왜 이토록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 행복 심리학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소확행을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 Diener에 따르면 행복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그중 정서적 요소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 이때 정서적 경험은 또 다시 빈도와 강도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의 전반적 행복은 정서의 강도보다 빈도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한다.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모든 경험은 행복의 ‘강도’보다는 ‘빈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먹고 싶었던 과자를 사들고 집에 가서 여유롭게 티비를 보며 먹을 때에 느끼는 행복감은 개인의 학업적 성취, 결혼 혹은 출산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보다 비교적 더 쉽게 자주 느낄 수 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행복감을 느끼는지가 어느 정도 강도의 행복감을 느끼는지보다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왜 작지만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찾아 나서는지, 왜 ‘소확행’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해답은 바로 이 ‘행복의 빈도’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더 자주,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라는 ‘소확행’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확행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했다. 하지만 ‘소확행’이 하나의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 심지어 SNS 트렌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컨대 SNS에서 종종 사람들이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야식을 즐기는 사진 함께 ‘소확행’ 이라는 단어만 써서 올리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는 ‘행복의 기억’과 연관이 있다.
심리학자 Diener 와 Thomas 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서의 강도보다는 빈도를 더 쉽게 회상한다고 한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행복한 기억을 행복감의 강도가 크다 혹은 낮다를 기준으로 회상하기보다 행복한 일이 자주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확행’ 이라는 줄임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본인에게 행복한 일이 ‘자주’ 일어났음을 더욱 더 선명하게 ‘기억’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자유롭게 사람들과 소소한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많은 사람을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 심리학적 접근”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인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행복 경험의 영역은 가족과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 경험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관계를 통해 자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국이 더욱 더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거리들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만의 ‘소확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나만의 작은 행복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참고 문헌
-Koo, J. S., & Kim, U. C.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Social Issues, 12(2), 77~100.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Thomas, D. & Diener, E. (1990). Memory accuracy in the recall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gy, 59, 291-297
-Schimmack, U. & Diener, E. (1997). Affect intensity: Separating intensity and frequency in repeatedly measur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 73, 1313-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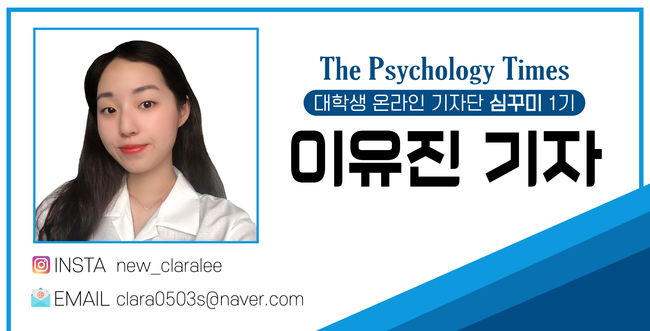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1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