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경
박원경
[The Psychology Times=박원경]

그림 영화 ‘원더’ 재개봉 포스터
지난 2월 11일 재개봉한 영화 ‘원더’는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제이콥 트렘블레이)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어기’는 남다른 외모 때문에 크리스마스보다 얼굴을 감출 수 있는 핼러윈을 더 좋아한다. 10살이 된 아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이사벨’(줄리아 로버츠)과 아빠 ‘네이트’(오웬 윌슨)는 어기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한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도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는 누나 ‘비아’(이자벨라 비도빅)도 세상을 향한 어기의 첫걸음을 응원해준다. 하지만 헬멧을 벗고 나선 낯선 세상은 어기에게 녹록지 않았다.
자존감이 뭐길래?
현대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말, ‘자존감’. ‘자아존중감’을 간단히 줄여 ‘자존감’이라 부른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라 말하고 있다.
자존감(Self Esteem)이란 단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만든 단어로,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정의한다. 하버드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자존감은 자신의 진정한 생각, 느낌, 가치 그리고 잠재력이 최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정된 심리 상태로 정의했다. 또, 덴마크 심리학자는 자존감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깊은 가치를 아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가 자존감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자마다 해석방식이 달라 자존감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는 자세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머지 우리는 정작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칭송받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대 받는 이상한 사회적 시선도 생겨났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어기’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큰 상처를 받는다.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도망치기도 하며, 반항도 한다. 자신과 다름,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비뚤어진다. 이를테면, 우리는 때로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자존감과는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취약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 숨기려 한다. 진정 ‘나’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멀리해야 한다.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는, 자존감이란 좋은 인간관계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기보다, 삶이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기판 또는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또 자존감이 낮다고 해도 의기소침해지는 것 외에 어떤 문제행동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소유자들은 자존감이 높으므로 삶이 괜찮은 게 아니라, 삶이 이미 어느 정도 괜찮으므로 자존감이 높다는 말이다.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려 애쓰고, 항상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버둥거린들 올바른 자존감은 형성되지 않는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주인공 어기는 비록 사회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어기의 삶을 무너트릴 수는 없었다. 영화 막바지, 어기는 세상 모든 이에게 말한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자기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과 자기 자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타인의 약점에도 관대해질 수 있다.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똑바로 인지하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자존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억지로 만들어낸 자존감은 올바른 자존감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관대해져야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본문 이미지 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Ew&pkid=68&os=3583760&query=%EC%98%81%ED%99%94%20%EC%9B%90%EB%8D%94%20%ED%8F%AC%ED%86%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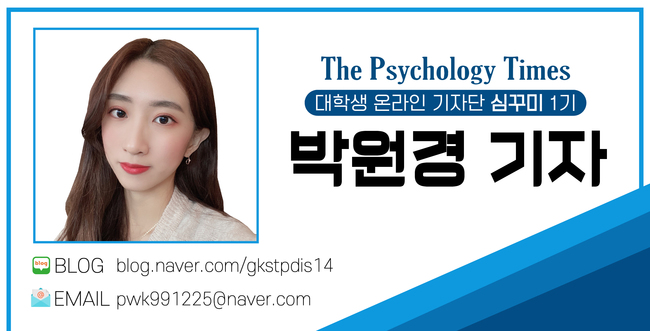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41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