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주어진 시간이 4박 6일인데 파리행을 결정한 것은 충동적이었다. 설날 연휴였고,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파리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일. 파리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만큼 절박했다. 사람이 절박하면 이성의 끈을 놓게 된다.
마음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때를 벗겨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친구와 캄보디아에 가기로 했다. 패키지여행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연휴라서 투어 요금이 평소보다 세 배나 비쌌다. 농담 삼아 “차라리 파리에 가는 게 낫겠어.”란 말을 주고받았다. 이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었다. 무모함이 추진력 좋은 모터가 되어 급발진했다. 순식간에 여행지는 캄보디아에서 파리로 바뀌었다. ‘여기만 아니면 어디라도 괜찮아’란 절박함은 로켓을 타고 달에도 갈 수 있을 정도였다. 도쿄에서 갈아탔던 터라 왕복 30시간의 긴 비행시간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절실함이 빚어낸 눈부신 인내심이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 추적거리는 비로 땅이 젖어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회색빛 하늘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비행기에 오를 때 어디를 가겠다는 나침반이 없었다. 우리는 한기가 돌아 썰렁한 파리 거리를 쏘다녔다. 튈르리 공원에는 비바람이 불어 주인 잃은 의자들이 제멋대로 나뒹굴었다. 맑은 날에는 발끝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흙바닥이 빗물을 잔뜩 머금어 곳곳에 생긴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물웅덩이를 피해 걷느라 갈지자로 활보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오히려 ‘파리는 우리의 것’이었다.
비바람을 막으려고 우비를 입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었다. 앞에서 부는 바람이 우산이 뒤집었지만, 내면에서 솟는 흥까지 뒤집을 수는 없었다. 허공에서 흩뿌리는 빗방울로 머리칼은 젖고 제멋대로 헝클어졌지만, 파리 거리에 우리가 실재한다는 증명을 하려고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비바람과 고군분투했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하루는 생마르탱 운하를 보러 갔다.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가서야 알았다. 여름의 푸르름과 활기가 없는 운하는 스산해서 기대와 달랐고,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추위를 이기려고 레퓌블리크 광장을 향해 열심히 걸었다. 점심시간이었다. 밥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지는, 여행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내 경우에는 맛집을 검색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것보다 대로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으로 들어가 현지인이 북적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길 좋아한다. 점심시간에 직장인이나 동네 사람이 북적이는 식당은 맛이 보장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인에게 맛있는 음식이 꼭 우리 입에도 맛있다는 보장은 아쉽게도 없지만 말이다. 모든 감각 중 미각이 가장 주관적이고 보수적인 감각인 탓이다.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를 만날 때도 있고, 같은 재료여도 처음 보는 조리법을 만나기도 한다. 모르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모험일 수 있다. 이 즉흥적 모험은 실패할 때도 많지만, 예상치 않은 음식을 발견할 때도 있다.
끼니때마다 식당을 찾으며 음식에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입이 짧은 친구와 나는 중대한 일을 해내느라 고심하곤 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가 되어 먹는 모험을 떠났지만, 둘 다 겁 많은 보수적인 모험가였다. 익숙한 맛을 추구하고 새로운 맛에 몸을 사렸다.
레퓌블리크 광장 근처 골목에 있는 붐비는 작은 식당 안을 넘겨다 보았다.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동네 맛집이 틀림없을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빈 테이블이 안 보였다. 조금 기다렸다가 한 테이블이 비어 자리를 잡았다. 기대가 조금씩 자랐다. 점심시간에 샐러드 같은 가벼운 전체, 메인, 커피나 음료 같은 디저트 3가지 코스로 ‘오늘의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 많다. 오늘의 메뉴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합리적 선택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 집 백반’쯤 된다.
칼국수나 비빔밥,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질린다. 하지만 백반은 질리지 않는다.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실제로 우리는 매일 먹는다. 국과 반찬은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할 때가 많다. 반찬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전적으로 주인 마음이듯이 오늘의 메뉴도 마찬가지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집 백반에 관심이 많다. 비록 입에 안 맞아서 못 먹을지라도 진짜 프랑스인들의 일상 음식은 어떤 것인지 구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테이블이 다 찼다는 말은 그 집 백반이 먹을만하다는 신호였다.
이 골목 식당 오늘의 메뉴는 어린 양고기찜 같은 음식과 연어 스테이크였다. 친구는 양고기 안 먹는다며 못 먹을 음식이라고 질색했다. 하지만 내 독해력에 확신이 없어서 양고기라고 확신하지 못한 채 일단 주문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어린 양고기 agneau가 맞았다. 양고기를 각종 야채와 섞어 말랑거릴 때까지 푹 졸였다고나 할까. 음식 문외한이라 조리법을 간파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닭볶음탕처럼 보였다. 당연하지만 소스는 고추장 기반이 아니다. 친구와 여행할 때 좋은 점은 궁금한 음식을 시켜서 한 입 빼앗아 먹는 것이다. 나는 보수적 입맛 탓에 익숙하고 지루한(!) 연어 스테이크를 시키고 친구 접시를 호시탐탐 넘봤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육식을 거의 안 하지만 친구 접시에서 몇 입 뺏어 먹었다. 냄새도 안 나고 식감도 남의 살 씹는 느낌 없이 입 안에서 바로 녹았다. 내가 시킨 연어 스테이크에 손도 대기 싫을 정도였다.
친구는 이 충동적인 짧은 여행을 떠올리며 식당에서 먹었던 점심이 가장 맛있었다고, 가끔 말한다. 나중에 내가 어린 양고기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나 원래 양고기 안 먹는데 그건 양고기 맛이 아니었어.”라고.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안 믿는 눈치이다.
프랑스에서 어린 양고기는 한국에서 치킨만큼 흔히 먹는 식재료이다. 우리가 먹은 어린 양고기찜은 조리법과 식감이 한국에서 알고 있는 양고기 맛이 아니었다. 음식은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재료와 조리법을 가지고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진다. 김치 재료와 담그는 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집마다 김치맛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 원래 알고 있는 맛이란 게 있기나 한 걸까? 원래 알고 있는 양고기 맛이란 게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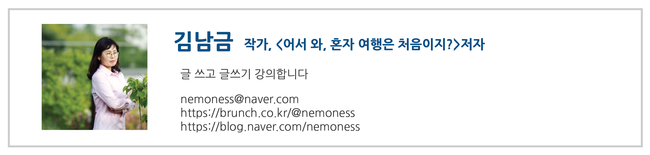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4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