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일본 후쿠오카 오고리시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은 단정하고 고요했다. 인적 없는 골목은 햇살 차지였다. 평범한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법석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뇨이린지(如意輪寺)라고 쓰인 입구에 ‘개구리 절’답게 개구리 조각상들이 방긋 웃으며 방문객을 맞았다. 금색과 은색의 묵직한 돌 조각상이 일렬로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입을 크게 벌린 개구리 표정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개구리를 모신 절이라니 웃음이 났다.
안으로 들어서니 작은 절에 3천 개나 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개구리 상이 있었다. 개구리 위에 올라타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신선들(?)도 있고, 입을 앙다문 개구리, 활짝 웃는 개구리, 익살스러운 개구리 등등. 주지 스님의 덕질로 개구리 상을 모아서 절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개구리 상 위나 아래에 놓인 동전들, 개구리 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에도 있는 기원이 곳곳을 채웠다. 종이에 소원을 적어 매단 소원 가지, 소원을 적은 개구리 패찰도 한쪽에 주렁주렁 걸려있었다. 작은 절은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북적였고, 무거워 보였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공간도 사람의 흔적이 강하게 배여있었다.
왜 개구리 절일까? 일본어로 개구리란 말은 ‘돌아오세요’와 발음이 비슷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부적처럼 사용되었다고 한다.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단순히 발음에서 찾은 사람들의 비이성적 논리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비이성적 사람들이 발휘한 상상력의 뿌리는 어디일까, 궁금했다.
 @개구리절
@개구리절
섬나라인 일본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수도 없이 겪어내야 한다. 자연재해는 과학의 발달로 밝혀낼 수 있다. 하지만 태풍과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그 규모를 예측한다고 해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정서적 쓰나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를 예측해도 그 앞에서 사람은 고작 수동적 방어만 할 수 있다. 거친 자연이 진정하길 기다리며 피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대재난이나 위험 앞에 서면 이성과 과학은 무기력에 빠진다. 다급하면 우리는 평소에 믿지도 않는 신을 찾으며 기도한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극한 상황과 마주하면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정하고 기도한다.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면 착하게 살겠다고, 대책 없이 기도를 남발한다.
일본의 역사적 배경은 무사 문화이다. 이 역시 일본만의 독특한 기원 문화 발달을 이끌지 않았을까?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진 시대에 성주는 항상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 현재 성의 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 어제까지 성주였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른 무사에게 성을 정복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성주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부하를 호령했다. 다른 사무라이 일당에게 성을 빼앗기면 성주는 명예를 지키느라 할복했던 시대에 내일이란 없었다. 성주가 누리는 권력과 기쁨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바짝 달라붙었다.
개구리 절에서 사람들이 품은 희망을 향한 절박함을 헤아려보았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주말드라마에서 중년 여자 주인공이 한 말이 떠올랐다.
“갱년기 여성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 말에 유레카를 외쳤다. 희망은 갱년기 여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성당, 교회, 절, 이슬람 사원 등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신을 섬기는 곳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행복을 빌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취직과 이직을 기원하고, 하는 일이 대박 나길 기원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기원한다. 희망을 어딘가에 심어두고 돌아서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희망을 희망하는 행위에는 초자연적 위안이 담겨있다.
동양의 기원 문화는 서양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서양 문화에서는 유일신이 지배한다. 심지어 국교가 있는 나라도 많다. 사원이나 성당에서는 유일신만 섬겨서 기원 문화도 비슷하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유일신이 아니다. 한국에서 어떤 신을 섬길지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이다. 부처와 각종 보살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성모 마리아를 섬기든, 서낭당에 정화수를 떠 놓고 빌든, 자유이다.
내가 가 본 나라 중에서 기원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원 장소는 한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신사가 있다.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신사는 일본식 사당이다. 오사카나 교토에서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신사를 보게 된다. 한 번은 오사카 시내를 걷다가 사무라이를 섬기는 신사를 만났다. 마당(?)에 40인의 무사상이 있는데 어느 한 무사도 같은 표정이 없었다. 무사의 표정은 상대에게 겁을 주어 제압하려는 호전성이 엿보였다. 또 절이나 신사 마당에서 소원 나무를 종종 볼 수 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접어 나무에 소원 종이를 매단다. 소원 종이를 주렁주렁 매단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의 영험함을 믿기로 단결한 마음이 읽힌다.
일본은 또한 주술의 나라이다.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주술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펜을 손에 들고, 눈을 감으면 펜이 저절로 움직이며 종이에 미래에 만날 배우자 이름을 써 준다고 했다. 쉬는 시간마다 이 반 저 반에 소문이 퍼지고, 한 번쯤 호기심에서 다 해 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지만, 학교에 갇힌 십 대 소녀들은 제비처럼 주술을 입에 물고 재잘댔다. 갱년기 여자만이 아니라 십 대 소녀들에게도 학교에서 벗어날 환상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희망을 희망하며 현실을 벗어나는 상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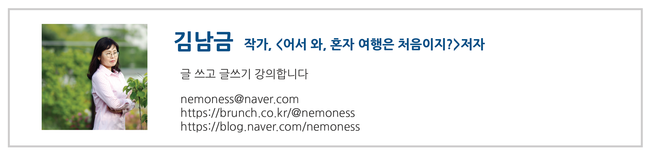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49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