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그라나다
@그라나다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다. 내가 플라멩코에 진심인 뿌리를 더듬었다. 깊이 내려갔더니 감정에 대한 기억이 튀어나왔다. 하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비야 골목을 혼자 걸으며 헤맸던 서른 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앞당겨서 생각했던 때이다.
자유를 꿈꾸었고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유가 버거웠던 대혼돈. 자유로운 선택이 내 어깨를 움켜쥐는 바람에 오히려 옴짝달싹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비야 골목에서 깨달았다.
그때 플라멩코를 처음 보았다. ‘깊은 노래’란 뜻을 지닌 칸타 혼다canta jonda의 전율 속에 그 순간의 혼돈을 박제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한 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맛인, 와인 베이스 칵테일인 샹그리아도 처음 맛보았다. 작은 무대에 켜진 조명 외에 주변은 어두웠다. 어둠을 벗 삼아 붉은 샹그리아 한 잔을 홀짝이고 있으니 가수 두 명과 무용수 두 명이 등장했다. 네 사람이 관객에게 인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무용수들은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며 마룻바닥에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사람의 몸이 악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면서 무용수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악기를 격렬하게 연주했다. 누구나 칠 수 있는 손뼉과 발구르기에는 가슴을 뒤흔드는 슬픔과 격정을 담을 수 있다고 상상도 못 했다.
나는 블랙홀처럼 낯설고 거대한 소용돌이에 온몸을 맡긴 채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몸과 마음이 뇌 신경에서 이탈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음은 더는 내 것이 아니었고, 구슬픔의 포로가 되어 손뼉 장단과 멜로디에 따라 흔들렸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 가수가 칸타 혼다를 독창했다. 스페인어 노랫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음악은 만국 공통어이다. 가수의 구슬픈 음색이 온몸에 있는 세포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누군가 내 영혼을 붙잡고 세차게 흔드는 것만 같았다. 몸 깊숙한 어딘가에서 찌릿한 무언가가 솟아서 혈관을 따라 머리까지 올라왔다. ‘전율’이란 말이 언어란 기호 외투를 벗고 살아 숨 쉬는 말로 내게 다가왔다.
그 후 매년 가을밤 집시 킹즈 앨범을 꺼내 듣곤 했고 ‘세비야의 전율’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플라멩코 공연 소식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공연을 보면서 열심히 세비야의 전율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기억 속에 각인된 세비야의 칸타 혼다와 비교했고, 번번이 구슬픔이 2% 부족하거나 격정이 함량 미달이었다. 된장찌개 맛집에 가서 엄마표 된장찌개랑 비교하고는 엄마 손맛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했다. 맛있게 먹었지만, 먹고 난 후에 ‘이 맛이 아닌데’하고 말하는.
플라멩코의 전율을 찾다가 스페인 영화 감독 카를로스 사우라의 영화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카르멘>, <피의 결혼식>, <매혹적인 사랑>으로 플라멩코 3부작 영화를 만들었다.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은 ‘이 세상의 모든 요소를 음악으로 완성한 것이 플라멩코’라고 믿었다. 그의 연출로 잔혹한 이야기조차 플라멩코의 아름다움에 묻힌다. <피의 결혼식>은 그라나다 출신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을 각색했다.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신부가 유부남과 눈이 맞아서 달아나자 신랑이 연적을 쫓아가서 죽이고, 자신도 연적의 칼에 맞아 죽는 이야기를 플라멩코로 표현했다. 슬픈 격정은 플라멩코를 통해 고유한 음악이 되었다.
호시탐탐 ‘플라멩코 여행’을 할 기회를 엿보았다. 몇 년 후에 그라나다에 도착한 날 밤에 부푼 가슴으로 플라멩코 공연장에 갔다. 노래는 추임새 역할을 했고, 메인은 춤이 되어 경쾌했다. 추임새를 넣는 남자 가수의 목소리에서 애타게 찾았던 우수나 애절함이 없었다. 대신에 걸쭉한 목소리에서는 술과 담배의 흔적이 들렸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직업적 의무가 들어있었다. 내가 아는 플라멩코가 아니었고, ‘세비야의 전율’은 더더욱 아니었다.
모든 기억은 왜곡이다. 돌이켜보면, 세비야 플라멩코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하는 셈이다. 경쾌한 면도 있었을 텐데 나는 혼다, 즉 우수를 불러오는 애잔한 깊은 소리만을 저장해 두었다. 그라나다 플라멩코가 터무니없이 형편없진 않았지만 내가 스페인을 다시 찾은 대의명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급기야는 세비야를 일정에서 뺀 것을 자책하기까지 했다. 다음에는 꼭 세비야에 가서 보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다음에 소란을 피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알려진 마드리드의 ‘Las Tablas’에 갔다. 플라멩코가 태어난 안달루시아 지방이 아니라 별 기대도 없었다. 실내는 모던한 카페 분위기였다. 벽에 프랑스 영화 포스터 액자가 몇 개 걸려 있고, 검은 테이블과 탁자들이 홀을 채웠다. 실내는 앞 테이블이 겨우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앞에 무대가 있는 것이 다른 카페와 다른 점이었다. 맥주를 홀짝이고 있으니 공연이 시작되었다. 남녀 무용수 두 사람이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노타이에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무용수와 긴 치마와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무용수.
 @마드리드
@마드리드
기대 없이 공연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춤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무용수가 움직일 때마다 땀방울이 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몸을 돌리면 이마와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어둠을 가르며 퍼졌다. 춤동작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은 무용수들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세비야의 전율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전율을 선사한 플라멩코였다. 관광객을 위한 극장식 쇼가 아니라 예술가의 춤이었다.
마드리드의 ‘새로운 전율’ 후에도 세비야의 전율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았다. 세비야의 전율이 있는 그 세비야에 다시 갔다. 플라멩코부터 예약한 후 공연을 보았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세비야의 전율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서른 살은 한 번뿐이라 돌아올 수 없기에. 이 사실을 오랫동안 부정하고 가버린 시간을 잡아보려고 했다.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박물관이 있었다. 무용수가 플라멩코를 출 때 몸의 움직임은 찰나이다.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몸의 선이 사라지지는 찰나를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상체를 제치며 곡선을 만들고 팔은 머리 위로 올린 조각상을 보며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서른을 떠나보냈다.
이제 기억 속 플라멩코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플라멩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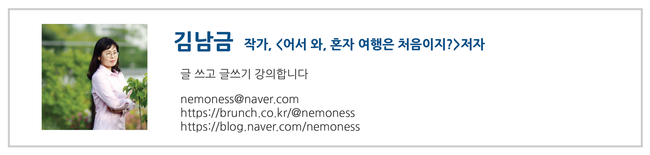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5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7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