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원
장재원
[The Psychology Times=장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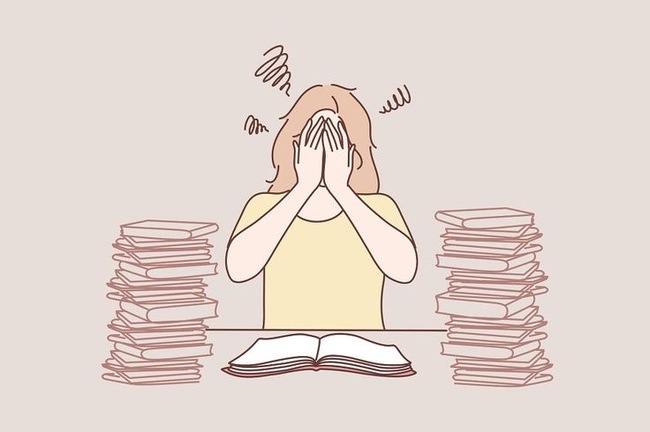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하나 묻는다. 만약 신이 눈 앞에 나타나 당신을 고등학교 3학년 때로 돌려보내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제안에 응할 것인가?
제안에 응할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때로 돌아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인가? 또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듯이 공부만 하고 합격/불합격 여부에 목매던 그 시절은 떠올리기도 싫은가?
필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성적표의 숫자 하나하나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만 같았던 당시의 상황에 다시 한 번 던져진다면, 제정신으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태'였으며, 그 불안의 여파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다.
이런 '불안'은 나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했을까? 내가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했다면, 원하는 바가 확실하게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정말 문제는 나한테 있을까? 아니다. 문제는 이 기괴한 사회 구조에 있다.
'자유'의 모순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의 희소 자원을 획득한다는 철학이다. 혈연,성별 등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요소를 통해 평가하기보다는 성적,학력 등 개인이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는 꽤나 공정해보인다. 자신이 만약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노력할 자유가 있으며,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무한히 열려 있다! 얼마나 바른 이치인가?
우리는 능력주의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깊이 신뢰하고있다. 일단 입시 제도에 능력주의가 반영되어 있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치열한 '자유 경쟁'을 한다. 우린 이 경쟁 과정에서 스스로를 무한히 착취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을 혐오하고, 후회하고, 성적에 따라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 성적에 의해 남들로부터 멸시당해도, 노력을 안 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다. 경쟁의 결과로, 낮은 성적을 기록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된다.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노력도 하지 않은 한심한 사람이라는 낙인도 함께 얻게 된다.
심지어, 능력주의는 혈연,성별 등의 요소가 가져오는 불평등과 떼어놓을 수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획득하는 것부터 어렵다. 누군가는 고액 과외를 받고 독서실에 다니며, 누군가는 작은 학원을 다니며 집에서 공부한다. 누군가는 학원에 다니지도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다. 물론 고액 과외를 받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 피나는 노력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성공해도 될 마땅한 이유가 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이유도 된다. "내가 코피 나도록 했던 노력을 너희는 안 했잖아?", 코피가 날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물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듯, 악한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논하며, 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노력하기 위해 더 많은 걸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공부하기 싫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 어린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능력주의가 반영된 제도 아래에서, 정당하게 다른 사람 또는 스스로를 멸시하는 법, 선망하는 법을 배우곤 한다. 그리고 언제 자신이 실패자가 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산다. 이 불안은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하는 대입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찍힐 실패자라는 낙인과 두려움이 학부모로 하여금 사교육열에 불타오르게 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적인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입시에 대한 기억이 끔찍하게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2010).불안증폭사회.위즈덤하우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00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008

wodnjs0486@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