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희
박지희
[The Psychology Times=박지희]
‘성형 강국’, ‘성형의 나라’, ‘성형 공화국’ 등 한국 사회는 ‘성형’의 수식을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버스, 지하철, 옥외 광고판을 통해 성형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강남 일대에는 성형외과가 즐비해 있다. 과거보다 성형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고, 장벽이 낮아지면서 성형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 되었다. “쌍꺼풀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에 근거한다. 명백한 ‘수술’임에도, 그저 간단한 시술 정도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의 앱을 통해 수많은 성형 수술 정보 및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바비톡은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모델로 해서 성형에 대한 경각심을 낮췄다.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의 성형 광고 및 수술 후기 영상은 성별, 연령대와 관계없이 파급력이 강하며, 이는 성형수술에 대한 장벽을 더욱 낮추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바비톡 유튜브 채널 캡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 2%, 여성 18%가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대 여성은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성형 목적 방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환자 38만 명 중 성형외과 14.4%, 피부과 13.7%로 미용 분야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7년에 비해 피부과 47.0%, 성형외과 37.1%로 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한국의 성형 기술 발달 및 성형 트렌드 조성이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성형’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일본 아이돌 ‘아라시’의 오노 사토시는 일본 방송 ‘아라시니시야가레’에서 “한국인은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두부를 주는 습관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한 사람인가?”라는 문제에 ‘성형’이라고 답했다.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과 ‘현재 한국의 성형 트렌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성형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가는 사회 분위기 속, 유튜버 ‘닥터벤데타’는 성형 의료 사고 및 유령 수술의 실태를 밝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성형수술의 이면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아직 성형을 쉽게 결심하는 사람이 많으며, 성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형을 쉽게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잘생겨지기 위해’라는 이유가 성형의 동기가 되지만, 사실은 내면의 복잡한 부분이 주된 동기로 작용한다. 첫 번째 동기는 ‘자아존중감’이다.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측면이며,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는 성형 의도에도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형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손은정, 2011). 성형 후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손은정, 2011).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성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동기는 ‘완벽주의’이다. 타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수록, 성형 의도는 높아진다(손은정, 2011). 세 번째 동기는 ‘신체비교’이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커져 성형 결심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손은정, 2011). 마지막 동기는 ‘신체적 지적 경험’이다. 타인에게 신체와 관련해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성형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손은정, 2011). 즉, 심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이 성형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출처 : Pixabay
여러 성형 동기의 공통점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이다. 이는 획일적 기준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공장과 다를 바 없다. 성형 공장이라 칭하기 이전에, 사회 자체가 공장이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성형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완벽’한 외모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나’를 가질 수는 없다. 완벽함의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체가 기준이고 개성이다. 각기 다른 꽃이 함께 피면 더 아름답듯이, 개별적 아름다움이 모인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시대가 말하는 미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다.”
-마마무 화사-
< 참고문헌 >
-손은정. (2011).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23-42.
-보건복지부[웹사이트]. (2021.02.25.). URL: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095&page=1
-한국갤럽조사연구소[웹사이트]. (2021.02.25). URL: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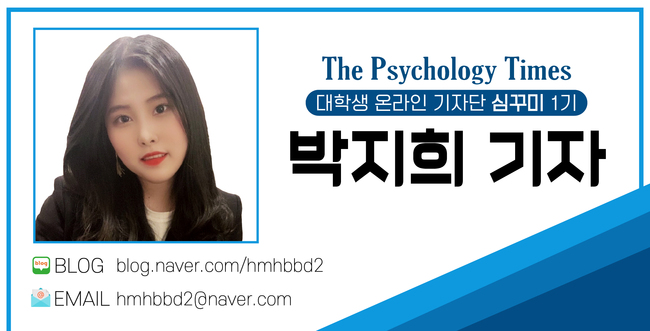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27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