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다연
고다연
[The Psychology Times=고다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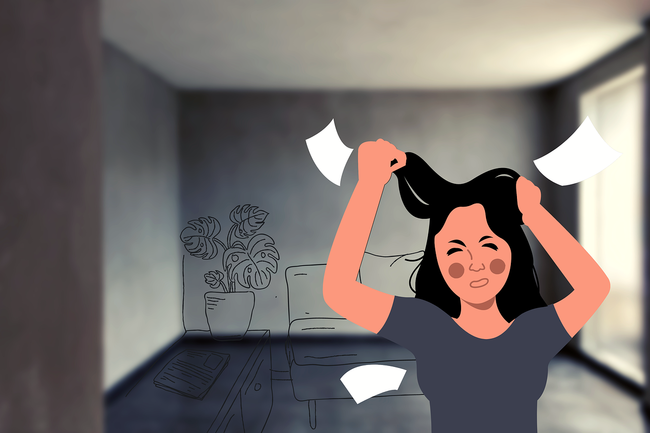
“신이시여,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오만하고 음탕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녀석을 선택해 놓고선 왜 나한텐 그걸 알아볼 능력밖에 안 주셨습니까?”
영화 ‘아마데우스’ 속 살리에리의 말이다. 영화 속 살리에리는 천재 음악가이자 친구였던 모차르트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모차르트를 독살한다. 이 영화의 흥행 이후 천재성을 가진 주변의 뛰어난 인물로 인해 시기와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살리에리의 이름을 따 ‘살리에리 증후군’으로 이름 붙여졌다.
질투? 시기?
이 증후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우선 ‘질투’와 ‘시기’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질투’와 ‘시기’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지만, 이 두 단어는 다르다. <살리에리를 위한 변명>이란 책에서 ‘질투’와 ‘시기’가 전혀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가치 있는 자원을 자신 이외의 누군가 갖고 있고 그것을 자신도 갖고 싶을 때, 그 상대에 대해 생겨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자신 이외의 누군가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자원을 그 사람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가치 있는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또한, 한 논문에서 전형적으로 시기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밝혔는데,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이 경쟁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는 행운으로 ▲자신이 바라는 대상이나 상태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경쟁자가 그 대상이나 상태를 잃기를 원하며 ▲그로부터 심적 괴로움을 겪는다(김한승, 2010).
감추고 싶은 감정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기에 바쁘고 남에게 질투 따윈 느끼지 않는 ‘쿨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위의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다 결국 모차르트를 죽여버린 살리에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살리에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존경심도 들지만, 열등감 등의 반감이 들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치열한 사회에서는 그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지만 기꺼이 인정하기 힘든 감정이 시기심이다(전소영, 2017). 하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단어로만 인식되고 있기에 대부분 이 감정을 맞닥뜨린 순간, 부정하려고 한다.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게 된다.
 YouTube SBS Catch '명대사로 다시보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8편
YouTube SBS Catch '명대사로 다시보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8편
2020년 종영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속 ‘박민국’ 교수라는 인물의 모습이 이와 같은 반응을 잘 보여준다. 박민국 교수와 김사부라는 인물과 함께 버스 사고를 당한다. 사고 이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버스 속에서 겁에 질린 채 탈출하던 박민국 교수는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응급환자들을 살리고 있는 김사부를 맞닥뜨리게 된다. ‘의사’로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추구했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자신에 비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던 김사부에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시기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후 박민국 교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사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김사부가 일하고 있는 돌담병원에 대해 “형편없다”고 말하고, 김사부가 환자를 돌보는 것을 보며 “무모하다”고 혹평하며 내면의 소리를 부정한 채 다른 타당한 이유로 김사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포장한다.
살리에리와 박민국 교수 두 인물 모두 미워하는 대상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라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살리에리와 박민국 교수의 다른 점은 살리에리는 결국 자신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박민국 교수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인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결말을 맺었다.
이는 누구나 사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타인과의 비교가 일상이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직장 내에서도 자신보다 일 처리가 뛰어난 동료를 보며 열등감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라이벌 선수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시기심을 없앨 순 없다. 그러니 살리에리 증후군을 겪으며 그 감정에만 매몰돼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꿔보자. 자기 내면을 당당히 마주하고 미워하던 대상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던 것을 잠시 중단해 보자.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진 가치를 받아들여 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 또한 훨씬 더 성숙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나카노 노부코. (2018). 살리에리를 위한 변명. 플루토.
[신간] 살리에리를 위한 변명. (2018).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16
김사부 괴롭히던 박민국, 그가 응원 받은 까닭. (2020).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1962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37114&cid=40942&categoryId=31531
김한승. (2010). 시기심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범한철학회논문집, 57, 317-338.
전소영. (2017). “나는 시기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기심의 정당성. 비교문화연구, 46. 43-61.
기사 다시보기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336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336

ekdus9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