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김민지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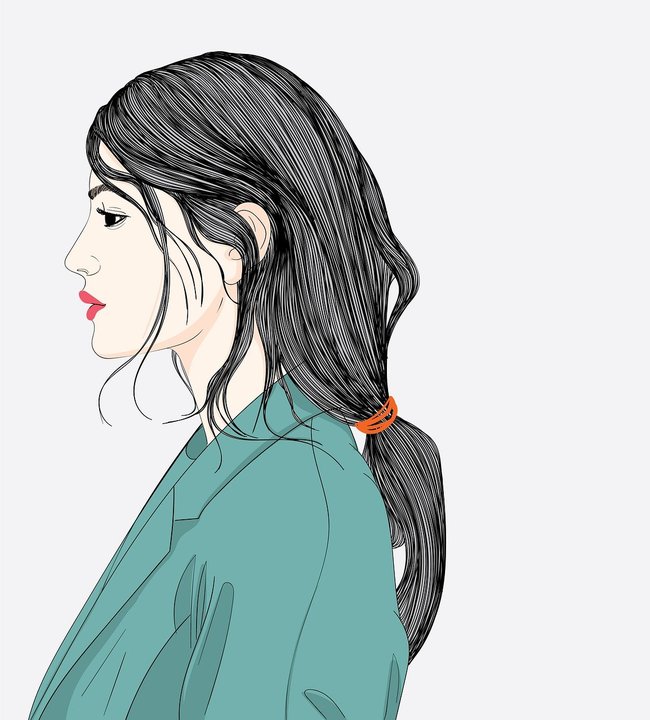 PIXABAY
PIXABAY
『 아름다운 공주님과, 능력 있는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반해 버렸고, 속절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으며, 또한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그들의 사랑에 뜻하지 않은 여러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주님과 왕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힘이 생각보다 더 대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공주님과 왕자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여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평생을 함께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행복했을까요? 』
서양과 한국 이혼 제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서양은 ‘파탄주의’를, 한국에서는 ‘유책주의’를 우선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탄주의란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시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쌍방의 책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유책주의란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이 가능하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에 명백한 책임이 있을 시에만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보다 중요시되어 가면서, 유책이 없어도 마음이 떠난 경우라면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의 결혼 생활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둘 중 어느 무엇 하나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는 부부가 결혼 생활에 있어 보다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게 해 주며, 그저 단순히 변심을 이유로 가정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간에 더 이상 사랑도, 신뢰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만을 유지하는 것은 그 또한 당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파탄주의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타인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쌓이는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순간마다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결혼과 이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더 줄어들게 되고, 세상은 이혼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원해서 하게 된 이혼이므로 그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과연 어떨지는 또 모를 일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이고, 예민한 어린 시절이니만큼 그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는 아이들에게 있어선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그렇다 보니 애초에 목적이 되었던 스스로의 행복 추구권이 오히려 내 자녀에게는 불행 추구권이 되고야 마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결국, 이혼이란 그 어떤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힘든 결정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 결혼에 앞서 신중해야 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거야”
-(권순일, 2016)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부부란 관계는, 상대의 모습을 통해 자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야만 부부란 존재는 비로소, 공평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남옥. (2018). 우리 참 많이도 닮았다. 북하우스
권순일(어반자카파). (2016). 널 사랑하지 않아
기사 다시보기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362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362

ming.x.d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