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진
이서진
[The Psychology Times=이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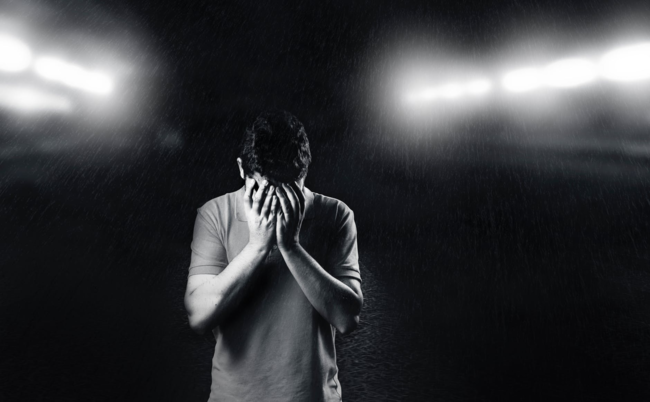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www.pexels.com/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스타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했다. 공황장애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연예인들의 공개적인 투병 고백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이다. 공황장애는 격렬하고도 극심한 불안장애로, 겉보기에 불안을 느낄만한 이유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엄습하는 공포가 공황발작(panic attack)으로 나타난다.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발작이 일어난 것이 트라우마 남아 광장공포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의 정신의학적 질병 정보 공개는 대중에게 정신적 질병에 대한 인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공황장애를 ‘연예인 병’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황장애는 문화, 성격 등 개인적 특성과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발병 가능한 심리학적 질병이다. 공황장애의 기초적인 메커니즘인 불안감에 대해 알아보고, 연예인의 공개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불안의 심리학과 공황장애
불안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자 삶의 일부분, 위협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강하거나 지속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보다 잘 알아채거나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두뇌의 위험 탐지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에 쉽게 직면하는 것이다. 지나친 불안감으로 불필요한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되면 더욱 강한 두려움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병적인 불안감의 지속적인 출현은 불안장애의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불안장애는 강력한 불안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 발작과 신체 증상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무슨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느낌, 지나친 심장의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 숨 막힘, 매스꺼움, 어지러움, 몸의 떨림과 식은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심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또한 주변이 자신과 분리된 느낌, 금방이라도 미칠 것 같은 느낌, 무언가가 나를 압박하는 느낌 등도 증상에 포함된다.
공황장애는 연예인 병이다? 공황장애를 둘러싼 오해와 현실
24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오은영 박사는 김구라의 공황장애에 대해 언급하며 유명인들의 공황장애 고백 덕분에 정신의학과의 문턱이 낮아지고 선입견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공황장애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동시에 연예인만 앓는 병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9만 3천 명이던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8년 16만 8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18만 2천여 명의 환자 수를 기록하여 5년 동안 70% 이상 증가하였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병으로, 진단명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 이후 대표적인 현대인의 마음의 병으로 자리를 잡은 존재이다.
한국인의 공황장애 신체적 증상 및 유발 요인
전국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황장애를 앓는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특징과 유발 요인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순환기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공황발작 발병 직전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였고, 전체 남성 환자의 22.5%는 첫 공황발작 직전에 음주의 예외적인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 스트레스 사건 역시 공황발작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연구 대상자의 약 3/4은 발작 직전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 남성의 경우 업무상 과로,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에 관한 스트레스 사건이 유의하게 높았다. 공황발작에는 수면, 스트레스, 음주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황장애의 증상과 원인, 환자 추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의 발병을 막을 수 없다. 또한 공황장애의 발병을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불안감과 억압감,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우리 사회 자체가 ‘심리 불안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공황,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마음의 병이다.
<참고문헌>
박진아, 박현순. (2019). 유명인의 공황장애 고백이 유명인에 대한 동일시, 위험지각, 건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6), 1363-1374.
이현주,김민숙,김세주,박선철,양종철,이경욱,이상혁,이승재,임세원,채정호,한상우,홍진표,and 서호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공황장애의 신체적 증상 및 유발 요인의 특징." 신경정신의학 58.4 (2019): 339-34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79&cid=41991&categoryId=41991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2242254422695954_1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2242254422695954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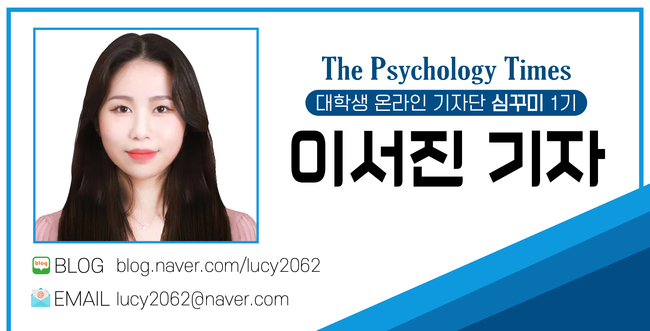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44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