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현
김진현
[한국심리학신문=김진현 ]

우울증. 익숙한 단어이다. 그렇기에 더 씁쓸한 이름이다. 그 이름의 생소함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데 있어 수많은 연구자들과 환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울증임을 알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너무 거대해져버렸다. 국민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00만 461명이다. 속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이지만, 그 고통은 감기보다 더하기에 이 수치는 감기만큼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왠지 치료를 꺼리게 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4.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이다.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원인을 밝힌 비율이 90.3%나 되었고, ‘치료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43.2%에 육박했다. 우울증 해결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시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들이 치료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정신물학회 이사장 이상열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울증은 만성적이고, 재발하며, 진행하는 질병”이다. 조기에 발견하여 오랜 기간 꾸준히 치료받아야 마땅한 엄연한 질병인 것이다.
우울증 치료 방안

그렇다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항우울제와 비약물적 치료가 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뇌의 화학적 균형, 특히 세로토닌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항우울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오래 복용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5~10개월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하고 그제서야 조금씩 감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있다.
비약물적 치료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는 행동치료, 인지치료 등이 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의 신체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에 반해 비약물적 치료는 우울증이 생기는 환경적, 사회적, 개인적 원인을 해결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미국내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와 비약물치료를 병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열 교수가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우울증은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약은 생물학적 원인만을 해결해준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 결과를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우울증 치료 전략의 문제점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약물치료에 치중해있다. 이상열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울증을 치료할 때 1차적으로 비약물적 정신 치료에 집중한다고 한다. 거기에 항우울제를 함께 병용하는 것을 주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미국심리학회의 우울증 치료 지침을 확인한 결과 경증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는 심리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좀 더 심한 우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요법과 항우울제의 병행 또는 둘 중 택 1을 하라고 권고한다.

이에 반해 이상열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항우울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지닌 목적 간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는 목표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환자들의 우울증이 감소한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이는 우울감을 생물학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의사의 목적 달성에 도움된다. 그러나 환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밝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우울감을 줄이는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의 근원을 찾는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왜 항우울제는 부상하게 됐는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에서 항우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 이유는 항우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의 저서 “Lost Connections” (“벌거벗은 정신력”)에서 요한 하리는 자신의 우울증 이야기를 들려준다. 항우울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시기와 우울증을 몸소 겪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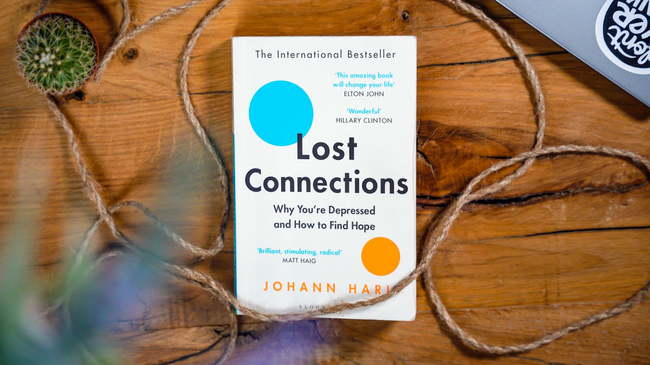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아,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를 깨달은 순간에 대해 얘기한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 자신은 역설적 행복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우울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인지를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작가 본인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런 인지는 현대의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환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약 몇 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면 DSM에 따라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는다. 자신의 과거나 환경, 불안감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항우울제는 만능이 아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며 과연 이런 우울증이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얼마 전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기간 우울감에 빠져있어도 항우울제를 받아 해결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무의미하다 느끼는 일을 수동적으로 반복하는 회사원에게도 항우울제를 제공하면 우울감이 사라질까?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된 상황들은 현실의 우울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울증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질환이다. 그 원인도 천차만별일 뿐더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전한 해결방법도 없다. 단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편으로 항우울제가 있으며,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정신치료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이 둘도 완전하지 않다.
나아가며
앞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지만, 어디서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비판일 뿐이다. 항우울제는 실제로 비교적 높은 성공률로 우울감을 해소하며, 날이 갈수록 그 효과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상열 교수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은 치료저항성 우울증으로, 약물로는 온전히 치료될 수 없다. 특히 이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높은 환자보다 자살율이 7배, 일반인보다는 20배 높기에 항우울제만으로는 결코 우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우울증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며 단순히 하나의 해결 방안을 찾고 그것에 의존하기보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우울이라는 익숙한 어둠을 다시금 생소한 단어로 만들고 그 뒤의 화창한 빛을 볼 수 있는 길이다.
참고문헌
서울신문. (2023, November 29).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중증도 30만명 넘어[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mental-health-report/2023/11/30/20231130004002
OECD 자살률 1위 한국, 항우울제 기피현상 해소 관건. 데일리팜. (2023, October 25).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5198
[약업신문]환자 3명중 1명에게 효과 없는 항우울제...국내 우울증 치료 개선 시급. 약업신문. (2022, October 6).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74023
항우울제 먹으면 바보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2016, January 18).
2세대 항우울제·비약물치료 어떻게 써야 하나. 메디칼업저버. (2016, October 31).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95
치료 저항성 우울증 잡으면 자살률 낮출 수 있다. 히트뉴스. (2022, October 4).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cross three age cohorts.
Hari, J. (2019). Lost Connections: Why You’re Depressed and How to Find Hope. Bloomsbury Publishing.
기사 다시보기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680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680

20jkim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