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희
전세희
삶에 스며든 인공지능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국 이후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국 출처 연합뉴스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국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때로는 편리하게만 느껴지는 과학 기술도 낯설고 불쾌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6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다. 대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전문가와 일반 대중은 이세돌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분위기였다. 이세돌 또한 대국 전 인터뷰에서 5:0 혹은 4: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파고가 1국부터 승리하면서 모든 예측이 뒤집혔고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세돌은 4국에서만 ’78번 수’를 두며 승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의 대국을 모두 알파고에 넘겨줘야 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사례이며 이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논의가 급속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시점이다. 그렇다면 세기의 대결이 끝난 9년 후 지금, 인공지능은 얼마나 달라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최근 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5’에서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리아가 있었다. 젊은 금발 여성의 모습을 한 아리아는 사람과 똑같이 표정을 짓고 고개도 돌릴 수 있었다.
불쾌한 골짜기 현상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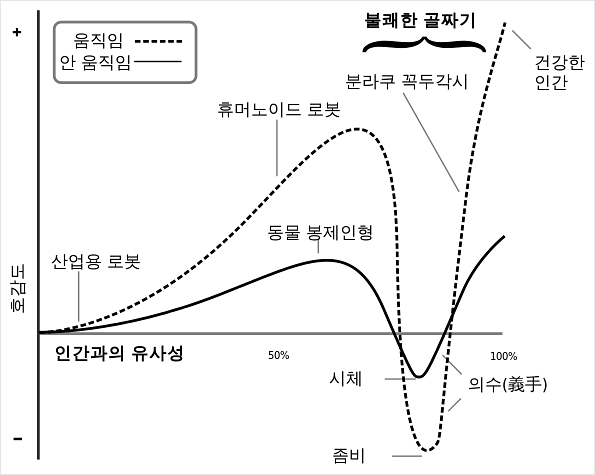 불쾌한 골짜기 그래프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스
불쾌한 골짜기 그래프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스
아리아가 악수하자며 손을 뻗으면 어딘지 모를 섬뜩함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을 바로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라고 한다. 불쾌한 골짜기란 1970년에 일본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로봇이나 가상의 존재가 인간을 닮아갈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갑자기 친숙함이 급감하고 불쾌감이 급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감정이 변화하는 구간이 마치 골짜기의 형태와 같아 다음과 같은 이름이 생겼다.
위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체성 위협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타인과 구별하고자 한다. 타인과 비슷한 동시에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유행하면 대세를 따르면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입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는 본능적인 이유가 숨어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한 로봇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이 눈앞에 나타나면 인간의 고유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거부한다. 인간 모두를 나와 같은 내집단으로, 인공지능을 외집단으로 인식하여 그 둘을 분명히 구분 짓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바둑 대국이 이세돌의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바둑의 특성 때문이다. 세기의 바둑 대국이 알파고의 승리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한계와 발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그 이용 자체가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1) Mori, M. (1970). The uncanny valley: the original essay by Masahiro Mori. Ieee Spectrum, 6(1), 6.
2) Złotowski, J., Yogeeswaran, K., & Bartneck, C. (2017). Can we control it? Autonomous robots threaten human identity, uniqueness, safety, and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100, 48-54.
3) Yogeeswaran, K., & Dasgupta, N. (2014). The devil is in the details: Abstract versus concrete construals of multiculturalism differentially impact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5), 772-789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9648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9648

sandych@duksung.ac.kr